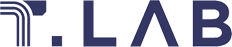[쿠키뉴스 문경=김희정 기자] 경북 문경시 하늘재(문경에서 충주로 넘어가는 길로 백두대간 중 가장 나지막한 곳) 아래 관음리에는 200여년 역사의 도예 가문이 있다.
1800년대 초 1대 김취정 선생이 터를 잡은 후 지금까지 명맥을 이어왔다.
이곳에서 마을 이름을 딴 ‘관음요(觀音窯)’를 지키고 있는 미산(彌山) 김선식 작가는 8대째 도예의 혼을 불태우고 있다.
중요무형문화재 김정옥씨가 그의 숙부이며 그의 아들 경식씨, 백부인 김천만씨의 아들 영식, 윤식씨도 도자기를 빚고 있다.
가문 전체에 도공의 피가 뜨겁게 흐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8대를 이어온 도예의 혼
그는 걸음마를 시작할 때부터 선친인 김복만 선생을 따라다니며 어깨너머로 작업하는 모습을 보고 자랐다. 본격적으로 가업을 잇기로 결심을 한 것은 군복무 때였다. 휴가를 나올 때마다 나이 든 부모님의 힘겨운 작업 모습을 보면서 도와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렇게 25년째 대를 이어오고 있다.
그는 “2002년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심정이었다”며 “힘들 때는 아버지가 문양을 그린 청화백자를 들여다보며 이겨냈다”고 말했다.
아버지이자 스승이었던 이를 여읜 후 뼈를 깎는 홀로서기가 시작된 것이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지만 대대로 이어온 가업을 그의 손에서 끊을 순 없었다.
그는 ‘나는 농사지을 땅뙈기 한 평 없지만 부지런히 도자기 농사를 짓는다. 세끼 밥만 먹을 수 있으면 욕심 부리지 말라’던 아버지의 말을 떠올리며 꿋꿋이 버텼다.

“아버지뿐만 아니라 그 시절 시골 산속에서 물레를 차며 도자기를 만들어 온 선조들의 삶이 그렇게 힘겨웠을 겁니다.”
“실제로도 도자기 만드는 일은 농사처럼 힘듭니다. 흙을 걸러내고, 재와 돌가루로 유약을 만들고, 산더미 같은 장작을 패고, 물레를 돌리죠. 가마에 불을 때는 작업은 또 어떻고요. 초벌구이 하고 나면 유약을 발라 재벌구이를 하지요. 때론 3번을 굽기도 합니다.”
이렇게나 어렵고 힘든 과정이지만 그는 아버지와 선조들이 쓰던 망댕이 가마와 옛 방식을 그대로 지키고 있다. 전통방식 그대로 소나무장작만 고집해서 가마에 불을 땐다는 것은 어지간한 정성이 아니고선 불가능한 일이다.
그는 고단한 삶을 이겨내고 전통을 이어온 선조들에 대한 예의이며 자존심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아버님과 선조들이 씨를 뿌려 놓았고, 자신은 그저 알알이 여문 씨앗을 바탕으로 감사하게 추수를 할뿐이라고 말한다.

◆ 전통과 현재의 공존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소나무를 못 베게 되면서 점점 소나무장작 사용도 힘들어지고 있다. 그는 전통을 지키는 것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전통을 지키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현실에 맞는 발전도 중요하지요. 몇 십 년 후면 일본처럼 소나무장작이 없어질 거고, 거기에 맞는 전통자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연구 끝에 그는 장작이 덜 들면서 불 효율은 높이는 장작 건조기를 개발해 냈다. 장작 가마의 문제점인 나무소비와 도자기 굽는 시간을 20%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건조기다.
그는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2005년 문화예술부분 ‘대한민국 신지식인상’(제05-86호)을 수상했으며 2006년에는 영남미술대전 종합대상을 받기도 했다. 앞서 46세인 2014년 경상북도 최고장인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다른 장인들에 비해 비교적 이른 나이다.
그는 생활도자기를 만드는 데도 힘쓰고 있다.
그는 “예전에는 재가 앉거나 일그러져도 전통도자기라고 좋아했지만 요즘은 깨끗한 자기를 선호한다”면서 “작품을 하는 작가로서 전통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대에 맞는 도자기를 만드는 것도 소홀할 수 없다”고 소신을 밝혔다.
이 때문인지 그의 작품들은 전통의 맥이 살아있되 현대적인 감각도 뛰어나다고 평가받는다.

◆ 관음댓잎도자기로 특허 획득
그의 꿈과 소신으로 가득한 ‘관음요’전시장으로 들어서면 친근하면서도 독특한 그의 작품들이 반긴다. 가장 눈길을 끄는 건 2005년 특허를 획득한 ‘관음댓잎자기’다.
도자기 요철 부분에 황토를 덧발라 대나무 잎 모양을 냈다. 깨끗하고 단단한 백자에 부드럽고 질박한 분청의 질감을 지닌 도자기이다.
그의 가문은 대대로 청화백자를 만들어왔지만 그는 선조들의 이룬 독보적인 작품에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를 해왔다.
‘관음댓잎도자기’ 외에도 ‘경명진사’특허도 출원했다. 선친으로부터 내려온 경명주사를 이용한 새로운 진사유약이다. 장석을 섞은 흙에 나무 재 등을 다시 섞은 유약을 발라서 만든 도자기는 오묘한 붉은 빛을 내뿜는다. 2002년 부친의 작고 후 8대 ‘관음요’로 홀로 서기를 시작한지 불과 3년 만에 이룬 성과다.
부적 재료와 약재로 쓰이는 경명주사는 작품 한 점에 원료비가 많이 들고 완성 작품수가 적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인체에 무해하고 집안에 나쁜 기운을 없애준다는 장점을 지녀 도자기 애호가들의 소장 욕구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최근에는 달항아리에 회화를 입히는 일에 몰두하고 있다.
그는 “아버지는 그림을 잘 그리셨다. 용이며 포도를 그린 다관은 멀리서 찾아올 정도로 이름났었다”며 “그 영향인지 달항아리에 그림을 그리는 게 좋다”고 말했다.
그에게 가마는 선조의 심장이고, 불은 선조의 혼이다. 흙은 그의 장난감이었고, 불은 그의 친구였으며, 농사꾼이 땅을 물려받듯 그는 자연스레 가마를 물려받았다.
200여년 8대를 이어온 가마는 식지 않았고 여전히 뜨겁다. 어스름한 새벽 홀로 앉아 빚은 그의 도자기가 선조들의 그것처럼 빛나고 살아있는 이유다.
shine@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