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자들을 위한 치료제 선택의 우선순위는 부작용이 얼마나 되는지 여부이다”
“환자들을 위한 치료제 선택의 우선순위는 부작용이 얼마나 되는지 여부이다”약가협상 과정에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폐암치료제 ‘올리타’와 ‘타그리소’가 건강보험 급여 적용되며 본격적인 시장경쟁에 나섰다.
특히 의료현장에서 어떠한 치료제를 선택할지 관심이 많은데 최근 타그리소 급여출시 기념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의료진은 ‘적은 부작용’을 효과보다 우선순위에 뒀다.
서울성모병원 종양내과 강진형 교수는 올리타와 타그리소의 약가협상 논란을 의식한 듯 “학자로서 논란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고 전제 한 뒤 “올리타와 타그리소를 현장에서 처방하는 의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만 말하면 임상시험을 경험해본 사람이 가장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
강 교수는 “효능과 부작용 중 중요한 것을 하나만 고르라고 하면 부작용 이슈라고 생각한다”며 “올리타는 손바닥이 벗겨지는 탈락 부작용을 경험한 환자가 많은데 이로 인해 환자들이 힘들어하는 모습도 많이 봤다. 스티븐존슨 신드롬 2케이스를 차치하더라도 환자에게 약을 처방하는 의사로서는 주기 편하고 환자들도 편한 약이 블록버스터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알림타의 경우만 봐도 어리가 안 빠지는 것이 큰 효과가 있었다. 현장에 있는 선생들이 선택이 그쪽으로(큰 효과보다 적은 부작용) 간다는 것이 내 개인적인 생각이다”라고 강조했다.
연세암병원 종양내과 김혜련 교수도 적은 부작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부작용은 환자치료에 많은 영향을 준다. 타그리소의 경우 1년간 약을 복용해야 하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며 말했다.
부작용 문제는 특히 환자들에게 민감하게 받아들여진다. 올리타의 경우 3상 임상시험 조건부 신속허가를 받았지만 임상시험 중에 사망사례가 발생하며 국산 항암제에 대한 기대감에서 ‘불안한 약’으로 인식이 바뀐 것이다.
무엇보다 부작용은 복약순응도, 즉 꾸준한 치료제 복용을 어렵게 만들어 치료 자체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물론 복약순응도에는 복용 편의성 등의 영향도 있지만 대체약이 있는 경우 부작용이 있다면 약을 바꾸는 경우가 많다.
결국 시장에서 올리타를 타그리소로 변경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부작용이 될 것이고, 타그리소는 내성이 생길 경우 올리타로 변경할 수밖에 없다.

한편 이번 타그리소와 올리타의 약가협상 과정을 두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13일 열린 암정복포럼에서는 ‘타그리소’와 관련된 논의가 있었는데 김흥태 암정복추진기획단 단장은 “타그리소는 680만원(환자부담 34만원), 올리타는 140만원(환자부담 7만원)으로 5배의 가격차이로 약가협상에 난항을 겪었다. 타그리소를 비급여로 사용했을 때 1560만원을 냈다. 이 가격이 (보험급여로) 680만원까지 떨어지면서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병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장은 “타그리소와 올리타의 표시가격은 5배 차이가 있지만 실제 가격은 그 정도까지 나지는 않는다. 공단·정부가 가격협상을 했고, 난항이라고 하지만 적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계약이 돼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올리타는 지난 정부에서 국산신약에 대해 가격을 올려주기 위한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이것을 포기한 것은 후속 국산신약도 올리타 수준으로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국민 입장에서 고맙다”며 “반면 우리가 부담스러운 것은 타그리소 사례 때문에 다른 약가협상이 느려질까 하는 부분이다”라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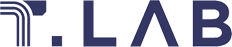












![전국 흐리고 ‘비소식’…미세먼지는 점차 해소 [날씨]](http://img.kukinews.com/data/kuk/image/2024/04/19/kuk202404190288.275x150.0.jpg)

































 포토
포토








![이젠 진짜 정치가 필요한 때 [데스크칼럼]](http://img.kukinews.com/data/kuk/image/2024/04/18/kuk202404180020.300x28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