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잇따른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 이후 정부의 입양 관리·감독이 강화되는 등 변화가 일고 있다.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 이후 정책변화와 과제 토론회’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대구·포천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와 제도개선위원회(위원회)에서 주관했다. 위원회는 지난 2016년 대구와 경기 포천에 각각 입양된 아동 2명이 양부모의 학대로 숨지자 제도 개선을 위해 발족한 단체다.
토론회를 주최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 이후 정부의 관리·감독이 진전된 점을 강조했다. 남 의원은 “대구 사건의 피해자인 ‘은비’가 속해 있던 입양기관에서는 예비 입양부모 교육을 하루 8시간 일회성 교육으로 진행했다”면서 “입양기관 교육 커리큘럼을 표준화하고 교육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등을 지원하도록 정책을 개선했다”고 말했다.
입양대상 아동이 위탁을 가는 등 보호방식이 변경될 시, 입양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 보고해야 된다는 점도 언급됐다. 과거 입양기관은 아동이 입양 전제 위탁을 가더라도 정부나 지자체에 알릴 의무가 없었다.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공조 또한 강화됐다. 지난 6월부터 경찰의 아동학대정보시스템 이용이 가능해졌다. 현재 112 신고 접수 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자동적으로 학대 사실이 통보되고 있다.
전반적인 법안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됐다. 현재 입양 허가는 법원에서 담당한다. 그러나 입양 신청부터 상담, 교육, 입양적격심사, 입양 전 위탁, 사후관리 등은 모두 정부나 공공기관이 아닌 입양기관에서 맡고 있다. 이로 인해 법원에서 아동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왔다. 은비의 경우, 입양을 전제로 양부모에게 위탁된 상황에서 입양부모의 학대로 뇌사상태에 빠졌다. 입양기관은 은비의 상황을 법원에 알리지 않았다. 법원은 은비가 뇌사상태에 빠진 지 일주일 뒤에 입양을 허가, 비판을 받았다.
소라미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이날 입양특례법 전부 개정안을 제안했다. 지자체와 보건복지부가 입양의 신청부터 상담, 교육, 사후 관리 등을 관리·감독하는 내용이 골자다. 소 변호사는 “‘아동 최우선원칙’을 중심으로 입양이 공적 기관과 무관하게 이뤄지는 것을 개선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입양인이 친가족을 찾을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입양정보공개의 청구권자를 친부모 및 형제자매로 확대하는 조항과 정보공개가 거부된 경우 불복할 수 있는 이의절차를 신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 변호사는 “지난 2015년 8월까지 접수된 입양정보공개청구 중 입양 정보가 공개된 경우는 14.7%에 불과하다”며 “애초에 소재지 파악이 불가능해 못 찾은 경우가 50.9%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는 “앞서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입양아동 본인의 출신을 알 권리가 보호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했다”며 “입양인과 그 가족이 입양기록에 접근하고 가족을 알 권리는 유엔아동권리협약과 헌법에 근거한 기본권”이라고 전했다.
다만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가의 관리·감독이 강화되는 방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았다. “정부 주도하의 입양이 이뤄지면 완벽을 담보할 수 있느냐” “공청회가 필요하다” “개정안은 정당하지 않다” “입양아동 사망사건 조사할 때 법안을 건드리겠다는 이야기는 없지 않았느냐”는 불만이 객석에서 나왔다.
남 의원은 “법안도 제도 개선 작업 중 하나”라며 “개인정보보호 등 여러 문제가 맞물려 있다. 향후 간담회를 열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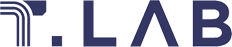


















![34% 불과한 국유림 멱살만…‘山주’ 유인책 마련 관건 [꿀 없는 꿀벌④]](http://img.kukinews.com/data/kuk/image/2024/04/23/kuk202404230398.275x150.0.jpg)





























 포토
포토







![AI 시대에는 ‘두뇌 체육관’이 뜬다 [데스크칼럼]](http://img.kukinews.com/data/kuk/image/2024/04/22/kuk202404220461.300x28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