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바이오주 회계 처리 논란,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해야](/data/kuk/image/20180206/art_1518038454.jpg)
국내 주식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업종은 단연 제약·바이오주(株)다.
자산총계 3조2891억원에 불과한 셀트리온이 181조4878억원 규모를 가진 현대차 시가총액을 제쳐버렸다. 자산가치가 60배 이상 큰 기업 보다 시가총액이 높다는 것이다. 이는 그만큼 바이오업종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다는 것을 반증한다.
물론 바이오업종이 항상 ‘꽃길’만 걸었던 것은 아니다.
2005년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열풍이 ‘희대의 과학사기극’으로 드러나자 바이오주의 가치는 급락했다. 이어 지난 2016년 한미약품 기술수출 계약 파기 및 늦장공시 논란이 빚어지자 또한번 바이오주는 하락세를 걸었다.
지난해 중반부터 국내 주식시장의 호황 및 바이오시밀러 대장주의 선전으로 바이오업종은 또다시 투자자들의 매력적인 상품으로 부상했다.
특히 면역항암제를 개발 중인 신라젠의 경우 수년간 적자 손실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고공행진했다.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신라젠은 약 691.50%까지 뛰었다.
바이오주가 롤러코스터처럼 등락을 반복하는 까닭은 재무적 펀더멘탈 보다는 미래가치를 동반한 사업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특성 탓인지 외국계 투자은행의 부정적 보고서에 따라 관련 종목의 주가는 덩달아 춤을 춘다.
지난달 19일 독일 투자은행 도이체방크가 셀트리온에 대한 부정적 보고서가 나오면서 논란은 다시 한번 증폭됐다. 도이체방크는 보고서에서 셀트리온의 목표가를 현재 주가(25만6000원) 대비 3분의 1 수준인 8만7200원을 제시했다.
도이체방크는 보고서에서 “셀트리온이 직접 지출한 연구개발(R&D) 비용은 전체 지출의 27%에 불과했다"며 "2016년 세계 동종 기업의 평균 비율은 81%에 이른다”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논란 이후 금융당국도 제약·바이오 업종의 회계처리 기준에 대해 집중 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
셀트리온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셀트리온은 “회계처리 기준 상 바이오시밀러는 신약과 달리 상대적으로 상업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품 성공 가능성이 확보된 시점부터는 연구개발비의 자산화가 가능하다”라고 반박했다.
김형기 대표도 모 언론과 인터뷰에서 “연구개발비 자산 처리는 회계법상 문제가 없다”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상장사(나스닥) 코허루스 바이오사이언스(Coherus BioSciences)의 경우 연기개발비를 자산이 아닌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다.
한미약품도 2016년 기술수출 파기 사태 이후 회계처리 방식을 손질했다. 최근에는 총 자산대비 연구개발비의 자산 처리 비율을 1% 미만으로 유지하고 있다.
실제 셀트리온은 재무제표상으로 흑자를 이어오고 있으나 연구개발비용(3분기 누적 기준 약 1540억7010만) 가운데 76.02%(1171억2570만원)를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무형자산으로 돌렸다. 만약 연구개발비를 자산이 아닌 비용으로 전환했다면 실질적인 실적은 적자 상태다.
셀트리온 측 주장대로 바이오시밀러의 실현 가능성을 고려했다면 굳이 이러한 방식의 회계 처리를 고집해야 할 이유도 없다. 오히려 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이는 셀트리온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국내 제약업계의 회계처리 방식 기준은 우후죽순이다.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폭탄을 안고 간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에 혼란을 줄 수 있다.
핵심적으로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제약업계의 일관되지 못한 회계방식, 금감원 등 금융당국의 늦장 대응이라고 판단한다. 아울러 가장 우호적인 리포트만 남발할 뿐 논란에는 침묵하고 있는 증권업계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최근 정부는 코스닥 활성화 방안에서 미래가치가 높은 기술주의 상장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점에서 제약바이오 산업 회계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모색해 봐야 할 것이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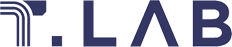













![자신감 보인 김기동 감독 “비 오는 날에 져본 적 없다” [K리그]](http://img.kukinews.com/data/kuk/image/2024/04/20/kuk202404200026.275x150.0.jpg)


![환경운동가 된 택시운전사의 현수막 이야기 [쿠키인터뷰]](http://img.kukinews.com/data/kuk/image/2024/04/19/kuk202404190130.275x150.0.jpg)





























 포토
포토







![환경운동가 된 택시운전사의 현수막 이야기 [쿠키인터뷰]](http://img.kukinews.com/data/kuk/image/2024/04/19/kuk202404190130.300x170.0.jpg)
![이젠 진짜 정치가 필요한 때 [데스크칼럼]](http://img.kukinews.com/data/kuk/image/2024/04/18/kuk202404180020.300x28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