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지·행동치료는 의료진와 임상심리사가 함께 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주장이 나왔다.
17일 성신여대 미아운정그린캠퍼스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인지행동치료 건강보험정책 개편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공청회에서는 임상심리학자들은 물론 의료진들 또한 인지·행동치료에 임상심리사들이 협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의료진들이 받은 인지·행동치료 수련 과정은 임사심리학자들에 비해 부족하고, 또 현재 수가는 의사들이 치료를 수행하기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다.
지난 1월 의결된 ‘정신치료 건강보험 수가개편’안에 따르면 정신치료 등급은 기존 3등급에서 5등급으로 세분화시켰고, 인지·행동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시켰다. 또 인지·행동치료 시행 주체를 ‘정신과/신경과 전공의 3년차 이상 및 전문의’로 한정했다. 개편안은 법령 개정 및 전산 개편을 거쳐 이르면 5~6월 중 적용될 예정이다.
그러나 기존에 인지·행동치료를 시행하던 임상심리학자들은 시행 주체에 대해 지속적인 불만은 제기했다. 인지·행동치료는 스키너와 같은 심리학자들이 창안한 치료기법으로, 전 세계적으로는 모든 병원에서 정신건강임상심리사가 치료를 주체적으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우리나라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교육을 관리하는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지난해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이론교육과 실습교육과정에 ‘인지·행동치료’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수련교육 커리큘럼을 개정했다. 국내 임상심리 전공 대학원 과정에서는 심리치료와 인지·행동치료 관련 강의를 개설해 필수 도는 선택과목으로 이수하도록 편성돼있다.
이날 토론 패널로 참석한 김대호 한양대 구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이번 개편안이 공개된 후 정신과 의사들 중 오랫동안 인지·행동치료를 시행한 의료진에게 물어보니 반은 인지·행동치료를 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반은 다른 치료를 하겠다고 했다”며 “저비용으로 국민 부담을 줄이는 것은 좋지만, 수가가 비현실적이면 시행을 포기하는 의료진이 많아지면서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김대호 교수는 “시행 인력에 대한 문제도 있다. 기존에는 병원에 인지·행동치료를 함께 해왔던 준비된 임상심리사들이 있었다. 그러나 이들을 시행 인력에서 배제한다면 인지·행동치료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라며 “정신과 학회에서도 인지·행동치료에 대한 인지도가 낮다. 또 아무나 인지·행동치료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명확한 자격 기준이 없어 입증되지 않은 분들이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 정신과, 신경과 의사 중 자격에 부합한 사람 몇이나 될지 걱정된다”고 전했다.

청중으로 참석한 홍승봉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교수는 “인지·행동치료는 주인력과 보조인력으로 나뉘는데, 신경과는 이번 개편안 논의 중 인지·헹동치료 주체에 대해 임상심리전문가도 들어가야 한다고 요청했다, 결과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다”며 “인지·행동치료는 의사는 물론 임상전문가, 일반인도 알아야 한다고 본다. 특히 자살율이 높은 우울증 환자 치료는 약물, 상담 어느 하나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일본도 인지·행동치료 건강보험 급여 신청 대상이 의사만 됐었는데 현재 바뀌고 있다”고 설명했다.
발제를 맡은 채정호 서울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도 “정신과 학회에서도 인지·행동치료에 임상심리사들이 참여해 협업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다”며 “게다가 현재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상심리사들 중 연구원처럼 무급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와 법도 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료진조차 임상심리학자와 함께 인지·행동치료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에는 저수가의 문제도 있다. 한국임상심리학회에 따르면 이번 개편안에서는 30분 이상 인지·행동치료를 실시했을 때 개인 4만4000원, 집단 1만3283원의 수가가 책정돼 있다. 대부분의 인지·행동치료는 과제 점검(5~10분), 교육(10~15분), 인지적, 행동적 실습(practice) (30분), 정리 및 다음 회기 과제 설명(5~10분)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개인인지·행동치료의 경우 50~60분, 집단인지·행동치료는 60~90분 정도 진행된다. 그러나 개인정신치료는 5단계로 세분화해 30분 초과 40분 이하 시 6만3239원(4단계), 40분 초과 시 8만3858원의 수가가 책정됐다.
학회는 “정신건강의학과 장면에서 정신과전문의 및 전공의에게 시행주체를 한정시킬 경우, 인지행동치료보다는 개인정신치료 4, 5단계를 실시할 것이 자명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적은 부담으로 근거 기반의 인지·행동치료를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한 개정 취지와는 반대로 정신건강의학과 장면에서는 인지행동치료가 시행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지고 위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료진들의 시간적 부족도 이유로 꼽힌다. 채정호 교수는 “2015년 국가정신건강현황 예비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개원가에 전문의 1인당 외래환자 수는 25.8명”이라면서 “9시에서 7시까지 진료를 하고 1시간 식사시간을 가진다고 가정했을 때, 60분 곱하기 9시간을 하면 540분이다. 이를 외래환자 수인 25.9로 나누면 약 20분 정도밖에 진행이 어렵다”고 말했다.
홍승봉 교수는 “오전에만 40~50명의 환자를 보는데 진료시간에 인지·행동치료를 하는 것은 어렵다. 따로 약속을 잡아서 시행한다”며 “그래서 보조인력에 임상심리사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수가가 낮아도 의사는 치료를 해야 하는데, 의사 혼자서 하기는 어렵다”고 토로했다.
권정혜 고려대 심리학과 교수는 “인지·행동치료를 의사만 실시하게 될 경우 시행 인력의 부족으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활동하는 임상심리사는 이 치료에 대한 수련과 교육을 가장 많이 받은 정신보건 인력이며,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해 20년간 국가적으로 양성된 정신건강 전문인력이다. 국가가 양성한 인력을 쓰지 않을 거면 왜 이런 일을 했는가”라고 반문했다.
권 교수는 “의학적 치료, 약물치료는 심리학자가 하면 안 된다. 그러나 인지·행동치료는 심리학적 이론에 기초한 심리치료로 의사만 해야 할 이유가 없다. 또 임상심리사는 심리평가와 심리상담 등의 서비스 지원에 특화된 전문인력으로 전세계적으로 인지·행동치료를 가장 활발하게 하고 있다”며 임상심리사들을 치료 시행 주체의 전문인력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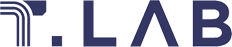














































 포토
포토








![이젠 진짜 정치가 필요한 때 [데스크칼럼]](http://img.kukinews.com/data/kuk/image/2024/04/18/kuk202404180020.300x28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