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남은 갑작스럽게 이뤄졌다. 약속장소에 도착하자 이미 해는 반쯤 기울어져 있었다. 유재순(60)씨는 일본과 한국에서 활동하는 르포작가다. 현재 일본 정세에 가장 정통한 언론인으로 정평이 나 있다.
유씨는 취재 중에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갔지만 치료비를 치를 돈이 수중에 없었다고 했다. 세금을 못 낼 정도로 힘겹게 언론인 생활을 이어가는 그에게 지인들은 '버티는 게 경이롭다'며 혀를 내두른다. 타고나길 독한건지, 기자로서 '노 타협'을 부르짖는 것인지는 알 길이 없다. 다만 언론인으로서 굵직한 특종을 쏟아내온 지난 세월이 고군분투의 연속인 것만은 분명해 보였다. 아래 문답은 지난 2015년 4월 유씨와의 인터뷰 중 일부다.
- 그러니까 '타협은 금기'라는 것인데.
홍보나 협박기사는 쓰지 않는다. 단 한 번도 없다. 물론 제안은 많았다. 언론을 하다보면 자의반 타의반 일종의 타협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을 나도 잘 알고 있다. 다만, 나 같은 사람도 한 명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언론인도 동시에 생활인 아닌가.
나도 사람인데 흔들릴때가 없겠나. 지난주에도 한차례 유혹이 있긴 했다. 통장을 차압당하고 병원비는 지인이 대신 내어주는 걸 보고 있자니 ‘나도 타협을 해볼까’ 싶긴 했다. 돈은 꿨다가도 갚으면 그만이다. 조금 부끄럽고 굴욕적일 뿐 양심을 파는 짓은 아니다. 그러나 홍보기사나 협박기사는 다르다. 영혼이 더럽혀진다. 그렇게되면 더 이상 복구가 안된다.
- 기자정신, 저널리즘에 충실하자는 것?
그저 성격이 그렇다.
- 한국 언론의 고질적인 병폐는 어디에 기인한다고 보나.
‘참기자’가 없기 때문이다.
- 참기자는 무엇인가.
있는 그대로 쓰는 기자 아니겠는가. 기사에는 사심과 욕망, 야망이 들어가면 안 된다.
- 언론은 차고 넘치게 많아요. 평가가 궁금하네요.
잘하는 곳도 있고, 과한 곳도 있다.
- 어떤 점이 아쉽나.
약자를 위한다고 하면서 정작 자기 일을 하는 느낌이 든다. ‘내가 이걸 하고 있다’고 말이다.
- 르포르타주로 명성이 높다.
우리 언론이 해외 취재를 하면 며칠이나 나가있나. 당일치기도 부지기수다. 그러면서 쓰긴 거창하게는 쓰더라.
80년대 잡지사에서 기사를 쓸 때였다. 전두환이 보안사령관인 시절이었다. 그런데 기사만 쓰면 기무사에서 통째로 들고가더라. 죽어라 취재는 하는데 기사를 안 실어 주는 엄혹한 시절이었다. 우연히 타매체 기자가 난지도에 간다기에 따라갔다. 충격을 받았다. 난지도 거주민들은 쓰레기 더미에서 살고 있었다. 기사를 썼고 그것 때문에 끌려가서 조사를 받았다. 이런 기사를 쓴 의도가 뭐냐고 추궁하더라. 이전에는 한 번도 이런 기사가 나온 적이 없었다.
기자가 정부 홍보 기사만 써야하냐고 편집장과 대판 싸우고는 짐 싸들고 나왔다. 집에는 친구집에 간다고 하곤 쓰레기 매립지에 있는 교회에서 석 달을 살았다. 그때 경험을 <여성동아>에 기고했다. 엄청난 반향이 있었다. 무엇보다 높은 현장성 때문이었다. 이렇게 외부에선 칭찬이 쏟아지는데 정작 난지도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면서 썼다고 욕을 하더라. 에라, 다시 가서 1년 8개월을 살고는 소설로 써버렸다. (‘난지도 사람들(1985)’, ‘쓰레기섬에서 살다(1986)’)
- 수차례 특종을 한 것으로 안다. 본인이 생각하는 특종은 무엇인가.
특종은 유일하게 ‘한 사람’만 보도한 것이어야 한다. 먼저 보도했다고 특종이 아니다. 난 일본의 역대 수상을 전부 인터뷰 했다. 이건 자랑이 아니다. 일본에 사는데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한국의 다른 특파원은 섭외부터 애를 먹더라. 당시 모일간지가 총리 인터뷰를 시도했는데 거절당했다. 이후 그 매체 기자가 나 같은 프리랜서와는 인터뷰를 하면서 왜 자긴 안 해주냐고 항의를 했다더라. 이런 건 특종이 아니다. 당연히 하는 것이다. 그 수상 인터뷰를 나 혼자 했나. 수십 명이 했다. 그 기자만 못나서 못한 것뿐이다.
그는 ‘대작’을 쓰고 싶다고 했다. 나는 머지않아 그의 대작을 읽게 될 것 같아 가슴이 뛰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현재 연성 기사와 받아쓰기가 횡행하는 디지털 공해의 시대. 대작은 커녕 졸작도 내놓지 못한 나는 여전히 그의 대작을 기다린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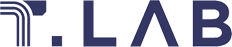













































 포토
포토








![이젠 진짜 정치가 필요한 때 [데스크칼럼]](http://img.kukinews.com/data/kuk/image/2024/04/18/kuk202404180020.300x28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