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꾀병환자’, ‘약쟁이’, ‘마약 중독자’…. 만성 통증 환자들에 대한 세간의 시각이다. 이들은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지만 외양이 멀쩡하다는 이유로 번번이 통증진단가이드의 문턱을 넘지 못해 장애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통증 완화에 필요한 진통제 처방도 제한을 받는다. 초과 처방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경고장’이 날아든다.
환자는 환자대로 적잖은 비용을 들여 약을 타고, 의사는 의사대로 심평원으로부터 시달리니 병원에서도 통증 환자는 달가운 존재가 아니다. ‘마약성 진통제에 중독된 골칫거리’ 취급마저 받는 전국 2만여 명의 만성 통증 환자들은 의료 강국 대한민국에서 소외된 존재다. 쿠키뉴스는 2회에 걸쳐 통증 환자들이 가슴에 담아둔 호소를 전한다.

통증 환자들의 일상은 투쟁에 가깝다.
싸움의 상대는 외부에 있지 않다. 시시각각 몸을 조여 오는 통증과 환자들은 매순간 사투를 벌인다. 발병 원인도 다양하고 증상도 여러 가지다. 수년간 병원비와 약값에 가정은 파탄지경이 나고 통증에 넌덜머리가 난 나머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이런 환자들에게 서울대학교병원은 가뭄의 단비 같은 곳이었다. 그러나 이마저도 이젠 과거의 일이 됐다. 병원에서 통증 환자를 주로 맡던 전문의가 재임용이 되지 않아 곧 병원을 떠나기 때문이다. 담당 의사에게 마지막 진료를 받은 통증 환자들 중에는 울음을 터뜨리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고 한다. 여러 의료기관과 의사들을 전전하다 서울대병원에 온 환자들은 자신들을 전문적으로 치료했던 의사의 부재에 낙담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박수현(가명·40)씨도 있었다.
◇ 답 없는 고통은 일상이 됐다
- 아프기 전에는 어떤 일을 했나요.
“동네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했었어요.”
- 어떻게 발병하게 된 거죠.
“2년 전에 손목 수술을 받고 나서 증상이 시작됐어요. 저는 손이 아파요. 기본적인 가사활동도 할 수 없어요. 설거지나 빨래, 하다못해 물병을 잡는 것조차 힘들어요.”
- ‘물병 잡는 것도 힘들다.’ 통증이 올 때 어떤지 설명해주겠어요.
“심해지면 정말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까요. 손바닥을 펼치면 가운데 동그란 부분의 온도 차이가 그 옆에 비해 7도가 낮아요. 캔 커피 두께의 쇠파이프가 손바닥에 꽂혀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 주위로는 온도 차이 때문에 열이 나서 화상 입은 것처럼 계속 불타는 것 같아요. 안 보이는 쇠파이프가 박혀 있는 것 같아서 정말….”
- 맞벌이였다가 지금은 외벌이인데, 병원비 부담이 커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일 것 같은데.
“보통 입원하면 한 달에 500만원~600만원이 드는데, 저는 작년 5월에 수술을 해서 2000만원이 들어갔어요. 실비로 조금 지원을 받고 있는 상태에요. 입원을 안 하려고 했어요. 병원비가 너무 부담이 돼서요. 서울대병원 담당 의사 선생님이 서울대에 힘든 사람들을 위해 의료비 지원을 해주는 게 있다고 알아봐주기도 하고 그랬어요.”
- 통증 환자에게 강한 효과를 주는 진통제를 주는 것에 갑론을박이 있는 것 같더군요.
“심한 돌발통이 오거나 혈압이 180에서 200까지 치솟으면 숨도 못 쉴 정도로 고통스러워 하니까 이전에는 다른 의사 선생님들도 진통제를 주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마약성 진통제는 안 된다’고 딱 끊어버렸어요. 만약에 돌발통이 왔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줘야지 희망이 있지 않겠냐고,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 다른 의사선생님께 말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약물펌프 안에도 마약성 진통제는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무슨 중독자처럼 몰면 저는 아파 죽겠는데, 앞으로 살아갈 방법이 없잖아요.”
- 앞으로 어디서 치료를 받을 예정인가요?
“병원 떠나는 의사선생님께 진료를 아예 포기하겠다고 말했어요.”
- 만성 통증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의료기관과 전문의가 다른 곳에는 없나요.
“통증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의사선생님들이 많아서 너무 놀랐어요.”
- 하고 싶은 말이 더 있을 것 같아요.
“가족이 이 병에 걸려도 지금처럼 하실 건지, 가족이 이 병에 걸렸다고 한번만 더 생각해주세요. 조금만 더 따뜻한 마음으로 통증 환자들을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고통은 공포다
유년시절 치과는 무서운 곳이었다. 이런 저런 핑계를 대고 충치 치료를 미루던 기자는 어느 날 밤 ‘끔찍한’ 치통에 몸서리쳤다. 밤새 소염 진통제 한통을 씹어대다가 며칠 동안 속앓이를 했던 기억이 있다.
만성 통증 환자들은 치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통에 일상적으로 시달린다. 지긋지긋하지만, 도통 익숙해지지 않는 통증에 박수현씨는 공포를 느끼는 것 같아보였다. 언제, 어느 때고 불시에 찾아올 돌발통을 그는 두려워했다.
서울대병원의 일개 의사 한명이 병원을 떠난다고 해서 환자들이 낙담할 지경의 상황이라면 작금의 만성 통증 치료 시스템은 현저한 문제가 있음이 분명해 보인다. 박씨의 사례가 전국의 모든 통증 환자의 경우에 들어맞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는 절망에 사로잡혀 있다. 앞서 진료를 포기하겠다는 게 무슨 의미이냐고 되묻자 박씨는 “삶을 아예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답했다.
여기 삶을 포기하려는 단 한 명의 환자가 있다. 작금의 만성 통증 치료 시스템 하에서 누가 그에게 희망을 가지라 말할 수 있을까. 무관심 속에 오늘도 고통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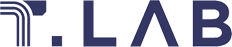












![전국 흐리고 ‘비소식’…미세먼지는 점차 해소 [날씨]](http://img.kukinews.com/data/kuk/image/2024/04/19/kuk202404190288.275x150.0.jpg)

































 포토
포토








![이젠 진짜 정치가 필요한 때 [데스크칼럼]](http://img.kukinews.com/data/kuk/image/2024/04/18/kuk202404180020.300x28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