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vs 책] ‘사용자를 위한 디자인’ vs ‘디자이너 사용설명서’](/data/kuk/image/20180831/art_1533114519.jpg)
디자인이 미술의 일부분이었던 시절이 있었다. 당시 디자인이란 무언가를 장식하는 수단 정도였다. 디자이너는 사용자보다는 사물에 초점을 맞췄다. 얼마나 예쁜지, 잘 어울리는지가 관건이었다.
사물에서 사용자로 디자인의 관점이 바뀌며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졌다. 제품 디자인을 위해 과학과 비즈니스가 필요해졌고, 세상에 없던 디자인이 필요한 경우도 있었다. 사용자들에게 제품은 성능보다 디자인으로 기억되기 시작했다. 자연스럽게 디자인의 위상은 올라갔다.
덕분에 디자인의 중요성을 모두가 아는 시대가 됐다. 하지만 디자인은 점점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되어갔다. 디자인을 가운데에 두고 일반인과 전문가의 거리가 멀어진 것이다. 사용자 입장에서 디자이너에게 새로운 디자인을 부탁할 때 설명하기 난감한 경우가 많아졌다. 디자이너도 소통에 답답함을 느끼긴 마찬가지였다. 디자인 감각과 표현할 언어가 부족한 실무자의 마음을 디자이너가 단번에 읽는 독심술을 발휘하는 것도 어렵다.
‘사용자를 위한 디자인’과 ‘디자이너 사용설명서’는 디자인의 시작과 현재를 짐작하게 해주는 책이다. 1955년 처음 출간된 ‘사용자를 위한 디자인’이 사용자를 의식하는 디자이너를 위한 책이라면, 2018년 출간된 ‘디자이너 사용설명서’는 디자이너를 의식하는 사용자를 위한 책이다. 두 권의 책에서 시대와 언어, 방향성이 정반대로 교차하는 것이 흥미롭다.
△ ‘사용자를 위한 디자인’
‘사용자를 위한 디자인’은 미국에서 오랫동안 디자이너들의 교과서로 사랑받아온 책이다. 저자인 헨리 드레이퍼스가 인간 중심 디자인 철학을 상세하게 기록해둔 책으로 인간 중심 디자인을 실천하기 위해 도입한 방법부터 디자이너들이 어떻게 인간을 배려하면 되는지를 상세히 안내한다.
저자는 미국을 대표하는 1세대 제품디자이너로 현대적 의미의 산업디자인을 개척한 것으로 유명하다. 디자인과 미술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았던 시기에 개인적 취향이나 주관적 발상보다는 과학적 수치와 체계적 단계에 따라 객관적으로 문제를 해결한 최초의 디자이너로 알려져 있다. 사용자 경험 디자인의 시초라 할 수 있는 인체공학적 디자인을 창시하기도 했다.
저자는 ‘사용자를 위한 디자인’에서 디자이너들이 앞으로 부딪힐 현실적인 고민들에 대한 답을 제시해준다. 디자이너가 작업 비용을 어떻게 청구하면 되는지, 디자인 회사를 어떻게 경영하면 좋을지 등 나름대로의 아이디어까지 담겨 있는 점이 인상적이다.
△ ‘디자이너 사용설명서’
원하는 디자인을 얻기 위해 디자이너와 일해야 하는 클라이언트, 상대의 욕망을 구현해내기 위해 클라이언트와 소통해야 하는 디자이너 모두를 위한 비즈니스 실무 서적이다. 원하는 작업을 디자이너에게 뽑아낼 수 있는 디자인 감각을 갖추는 방법부터 뛰어난 작업 능력을 세상에 펼치지 못하고 있는 디자이너를 위한 클라이언트 용어 번역기까지 모두를 위한 디자인 관련 팁을 50개 항목에 나눠 담았다.
디자인 커뮤니케이션 멘토로 활동 중인 저자 박창선은 디자이너와 클라이언트 양쪽 모두 경험한 업무력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업무 조언을 카카오 브런치에 올리기 시작했다. 각계각층 독자들에게 기대 이상의 지지를 받으며 현재 1만여 명의 구독자를 확보하고 230만 뷰를 기록했을 정도로 인기다.
‘디자이너 사용설명서’에는 젊은 멘토의 성공담 대신 실패담이 가득하다. 직접 경험한 다양한 사례들을 현실의 눈높이에서 쉽게 풀어낸 점이 장점이다. 쉽다고 가벼운 내용은 아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얻어갈 수 있는 깊이가 결정될 것이다. 디자이너를 상대하기 껄끄러운 클라이언트와 디자이너는 물론, 디자인에 큰 관심이 없는 독자들에게도 추천할 만한 책이다.
이준범 기자 bluebell@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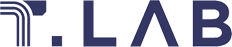













![전국 최대 의병 축제 '홍의장군축제' 개막 [포토뉴스]](http://img.kukinews.com/data/kuk/image/2024/04/20/kuk202404200013.275x150.0.jpg)
































 포토
포토








![이젠 진짜 정치가 필요한 때 [데스크칼럼]](http://img.kukinews.com/data/kuk/image/2024/04/18/kuk202404180020.300x28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