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폐암에 걸리면 그저 죽어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폐암을 고칠 수 있는 약이 이렇게나 많이 있다는 것도, 회사 다니면서 꼬박꼬박 냈던 건강보험으로 그 약을 먹을 수 있다는 것도, 이렇게 암 환자가 되어 병원에 와서야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해가 안 되는 점은 같은 폐암 환자라도 누구는 정부가 치료를 지원해주는데, 누구는 안 해준다는 것입니다. 저는 후자에 속한 사람입니다.
지난 2016년 의사 선생님은 제게 폐암 3A기라고 진단해주셨습니다. 이전까지 잔병치레 한 번 없이 건강했기에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1년에 서너 번씩 왼쪽 가슴께에 무언가 진득한 것이 붙었다는 느낌이 있었을 뿐입니다.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모르고 내버려둔 못난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사진출처= unsplash [병실에서 온 편지] 생사를 가르는 폐암 치료 급여기준 장벽](/data/kuk/image/20180833/art_1534212827.jpg)
그런데 진짜 문제는 수술 받고 항암치료를 시작한 후였습니다. 첫 번째 약을 네 번째 맞자 임파선이 너무 붓는 부작용으로 치료가 중단됐습니다. 다른 약으로 바꿨지만 이번엔 6번 만에 내성이 생겼습니다. 절망스러워하던 제게 의사 선생님께서 마지막으로 한번만 더해보자고 설득하신 약이 지금까지 잘 맞고 있는 면역항암제입니다.
새로운 약을 맞기 시작한 이후로 정말 2가지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먼저 면역항암제 주사 세 번 만에 CT를 찍어보니 폐에 가득했던 암세포가 절반 이상 사라졌습니다. 저를 치료해 주시는 선생님께서 누구보다도 가장 기뻐하셨습니다.
다른 하나는 몸이 편해졌습니다. 부작용이 없어 힘도 붙고 치료 받으면서 떨어졌던 식욕도 되살아났습니다. 식사를 잘 하고부터 살고자 하는 의지도 강해졌습니다. 이제 매일 집 앞으로 등산을 다니며 체력도 회복하기 시작했고, 얼마 전부터는 재취업을 위해 자격증 공부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만나는 저와 비슷한 다른 폐암 환자들 중 몸 상태가 저처럼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선생님께서 저 말고도 여러 환자에게 추천을 했으나 건강보험이 안되는 약이라 대부분 한 번에 수백만원 하는 비싼 약값 때문에 엄두도 못 낸다고 합니다.
물론 저도 약값을 감당할 정도로 금전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신뢰하는 선생님께서 한 번 더 치료해보자고 손을 잡아주셨고, 두세 달 후에는 이 약이 보험급여가 될 테니 그 기간은 사보험으로 버텨보자는 희망이었지요.
그래서 올해 1월 제가 맞고 있는 면역항암제도 드디어 보험급여가 된다는 소식에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기쁨은 물거품으로 변했습니다. 모두 보험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조직검사 결과의 수치가 일정 기준을 통과해야 건강보험을 해준다는 겁니다. 심지어 제게는 검사를 받을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앞서 온갖 검사와 항암 치료를 견뎌온 제 폐는 더 이상 검사를 진행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처음 폐암 진단을 받았을 때처럼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저 같이 부작용이나 내성 때문에 다른 약을 쓸 수 없고, 이 약으로 치료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폐암 환자들이 왜 비급여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요. 만약, 검사조차 받지 못하는 폐암 환자들에게 숫자 같은 급여기준이 아니라 제게 나타나고 있는 이 치료 효과가 더 중요한 것 아닌가요. 치료 효과 기준이라면 더 많은 사람들이 투병 의지를 가지고 암을 이겨내고, 체력을 회복하고, 일해서 돈 벌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을 텐데요.
급여 기준의 장벽 때문에, 제 처지에 이제 이 약을 앞으로 석 달 밖에 못씁니다. 치료를 중단해야 합니다. 생사를 가르는 항암치료는 현재 진행형이고 저는 자꾸 만약을 기대하게 됩니다.
만약, 급여기준의 장벽이 허물어진다면 저는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정부가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겠다’ 약속했습니다. 또 모든 비급여를 급여화하겠다, 환자 부담을 줄여 주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니 제 희망과 기다림의 끝에도 분명 기쁜 소식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부산시 문병준(가명)>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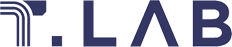




















































 포토
포토





![한 지붕 多 가족, 멀티 레이블의 함정 [데스크칼럼]](http://img.kukinews.com/data/kuk/image/2024/04/24/kuk202404240205.300x28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