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vs 책] ‘피싱’ vs ‘발밑의 혁명’](/data/kuk/image/20180833/art_1534408355.jpg)
200만 년 전 인류가 식량을 획득하는 방법은 세 가지였다. 사냥과 채집, 그리고 고기잡이다. 인류는 먹을 것을 찾아 이동하면서 주로 산과 숲, 강과 바다에서 식량을 구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인류는 한곳에 정착하기 시작했다. 사냥과 채집은 목축과 농경의 형태로 바뀌었다. 식량을 획득하는 방법도 인류에 맞는 형태로 진화한 것이다.
다음 두 권의 책은 그 중 고기잡이와 농경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피싱’은 긴 시간 동안 변함없이 주요 식량 획득 수단의 자리를 지킨 고기잡이의 역사를 통해 인류사의 변화를 정리한다. ‘발밑의 혁명’은 농경이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흙을 분석해 앞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농업은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한다.
△ ‘피싱’
어부들은 과거나 지금이나 무명(無名)의 존재들이다. 어부들이 사는 곳은 대체로 도심과 멀리 떨어진 변두리였다. 매일 묵묵히 물고기를 잡는 그들에게 글을 쓰고 읽는 건 중요하지 않았다. 그들의 이야기가 기록으로 전해지지 못한 이유다.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옛 어부들은 학자 입장에서 파헤치기 힘든 존재다. 그럼에도 저자인 브라이언 페이건은 평생에 걸쳐 세계의 주요 유적을 둘러보고, 고고학, 인류학, 역사, 해양생물학, 고기후학 등 여러 분야에서 고기잡이 역사와 관련한 자료를 수집했다. 저자는 무명의 어부들에 대해 “인류의 역사가 그동안 놓친 이야기”라며 “어부들이 현대 세계가 세워지는 데 어떻게 이바지했는지 보여주고 싶다”고 집필 이유를 밝혔다.
저자는 과거 인류의 문명이 융성하는 데 고기잡이가 농경만큼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주장한다. 어부들이 잡은 물고기가 없었으면 파라오는 기자(Giza)의 피라미드를 세우지 못했고, 캄보디아의 웅장한 앙코르와트 사원도 지금 같은 위용을 뿜지 못했다. 또 어부들이 잡아올린 물고기들은 인간이 아메리카 대륙에 정착하는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하지만 최근 어장량이 급감하는 사태에 도달했다. 지금껏 고기잡이의 덕으로 살아남은 인류가 100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마구 잡아들인 결과다. 이에 저자는 “바다를 영영 사막화시키고 싶지 않다면, 지속가능한 어업은 하나의 예술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편이 낫다”며 “안 그러면 바다에서 더 이상 물고기를 구경하지 못할 테니까”라고 경고한다.
△ ‘발밑의 혁명’
흔히 ‘농사’(農事)하면 소나 경운기를 통해 논밭의 흙을 파헤치는 모습을 떠올린다. 하지만 저자 데이비드 몽고메리는 “농업의 상징인 쟁기는 인류의 가장 파괴적인 발명품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한다. 땅을 갈아엎는 경운(耕耘)이 흙을 비탈 아래로 밀려 내려가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러면 겉흙은 자연적인 부존량을 조금씩 잃는다. 결국 쟁기질이 이어진다는 건 땅이 비옥함을 잃어가는 것과 같은 뜻이다.
‘발밑의 혁명’은 보존농업(재생농업, 혹은 자연농업)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책이다. 저자가 10년 전에 쓴 ‘흙: 문명이 앗아간 지구의 살갗’으로 흙을 침식시킨 모든 문명은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는 걸 설득력 있게 증언했다면, ‘발밑의 혁명’을 통해선 세계 곳곳에서 실제로 흙을 되살리고 있는 이들의 분투기와 성장기를 다루며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저자는 “수백 수천 년이 지나도 인류는 여전히 흙에서 먹을 것을 얻을 것”이라고 말한다. 당장 높은 효율로 많은 작물을 생산하는 것보다, 기름진 흙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하는 이유다. 실제로 아프리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의 여러 농장에서 만난 농부들이 보존농업의 원리에 따라 농사를 지으며 흙의 생명력을 통해 꾸준한 수익을 거두고 있는 모습을 그린 대목은 눈여겨 볼만하다.
이준범 기자 bluebell@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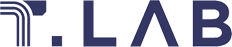














![[단독] “바쁘다며 신생아대출 거절”…은행·국토부 ‘네 탓’ 공방](http://img.kukinews.com/data/kuk/image/2024/04/23/kuk202404230269.275x150.0.jpg)
![[단독] 도로 위 무법지대 ‘야외방탈출’...파악도 못한 지자체 ‘안전구멍’](http://img.kukinews.com/data/kuk/image/2024/04/22/kuk202404220359.275x150.0.png)



![“느려도 너무 느리다” 밀원숲 회복까지 100여년 [꿀 없는 꿀벌②]](http://img.kukinews.com/data/kuk/image/2024/04/23/kuk202404230391.275x150.0.jpg)



























 포토
포토







![AI 시대에는 ‘두뇌 체육관’이 뜬다 [데스크칼럼]](http://img.kukinews.com/data/kuk/image/2024/04/22/kuk202404220461.300x28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