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vs 책] ‘엄마의 언어로 세상을 본다면’ vs ‘엄마 미안해’](/data/kuk/image/20181041/art_1539158360.jpg)
“아이를 낳으니 세상이 달라졌어요.”
각종 커뮤니티와 SNS를 돌아다니다 보면 만날 수 있는 육아 후기다. 엄마가 된 여성들은 새 생명의 탄생과 함께 새로운 세상을 만난다고 한다. 엄마의 자녀로 수십 년을 살면서 생각하지 못했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다.
반대의 경우도 있다. 80세가 넘은 엄마를 간병하는 아들이 만나게 되는 새로운 세상이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엄마와 끈질기게 대치하고 설득하면서 공적 제도에 대한 생각이 깊어진다.
다음 두 권의 책에는 두 명의 ‘엄마’가 등장한다. ‘엄마의 언어로 세상을 본다면’에서는 아이를 낳고 엄마가 된 30대 한국 여성의 이야기가 그려지고, ‘엄마 미안해’에서는 심한 치매를 앓게 된 엄마를 돌보는 50대 일본 남성의 이야기다. 엄마가 된 첫 순간과 엄마의 마지막 순간을 그린 두 권의 책을 통해 앞으로 이어질 엄마의 삶, 과거에 존재했을 엄마의 삶을 상상해보는 건 어떨까.
△ ‘엄마의 언어로 세상을 본다면’
엄마가 되는 순간부터 전에 몰랐던 즐거움과 괴로움이 교차하기 시작했다. 아이와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잠든 아이를 내려다볼 때는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단단해지는 느낌을 받지만, 퇴근 후 책 한 권조차 읽어 주지 못할 정도로 피곤할 때면 엄마로서 부족하다고 느낀다. 아이와 함께 하는 일상이 더 행복하고 즐거워야 할 것 같다고 느낀 저자는 문제점을 하나씩 파악하고 바꿔나가기 시작한다.
저자는 자신이 느끼는 불안감, 죄책감의 원인이 ‘모성 신화’에 있다고 파악했다. 아이가 잘못되는 것을 모두 엄마의 잘못으로 돌리는 사회 분위기가 문제였던 것이다. 저자는 고정된 성역할과 가부장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아이와 함께 더 나은 세상을 살아가기로 결심한다.
‘엄마의 언어로 세상을 본다면’은 세계일보에서 사회부 기자로 근무 중인 저자의 연재 기사를 책으로 엮어낸 결과물이다. 저자는 1980년대에 태어나 현재 30대를 살고 있는 한국 기혼 여성들의 보편적인 삶을 그렸다. 동시에 엄마들이 일상에서 겪는 문제의 뿌리가 한국 사회 문제와 맞닿아 있다는 지적을 잊지 않는다.
△ ‘엄마 미안해’
어느 순간 돌아보니 냉정하게 생각하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정신이 피폐해져 있었다. 치매에 걸린 노년의 엄마를 자신이 돌봐야 한다는 책임감이 만들어낸 결과였다. 때로는 이성적으로 절대 해선 안 될 행동을 하는 자신을 발견하기도 했다. 그럴 때는 자신의 기억도 모두 지우고 싶었다.
‘엄마 미안해’는 ‘중요간병대상자1’ 판정을 받은 엄마를 간병하는 50대 독신남 아들의 이야기다. 과학 저널리스트로 한창 일에 빠져 살던 저자는 시설과 간병인의 도움을 거부하는 엄마 덕분에 지긋지긋한 전쟁을 시작한다. 하지만 직접 간병을 시작하자 놀랄 정도로 좋아진 엄마의 건강 상태를 보며 간병인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는다.
저자는 개인이 노인 간병을 감당할 수 없다는 점도 지적한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간병제도를 이용하지 않으면 간병인이 먼저 쓰러진다는 사실을 몸소 겪었다. 언젠가는 반드시 겪어야 하는 돌봄 가족의 삶을 개인적 경험과 고백의 형식으로 전달한다.
이준범 기자 bluebell@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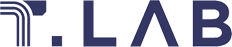













































 포토
포토








![이젠 진짜 정치가 필요한 때 [데스크칼럼]](http://img.kukinews.com/data/kuk/image/2024/04/18/kuk202404180020.300x28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