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쿡기자] “얼마나 더 죽어야” 숨죽여 우는 가정폭력 피해자](/data/kuk/image/20181145/art_1541578287.jpg) “참 문제 많은 집이네” “조만간 가게 문 닫겠어”
“참 문제 많은 집이네” “조만간 가게 문 닫겠어”
가정폭력을 신고한 이씨 가슴에 경찰의 말은 비수가 돼 꽂혔습니다. 이씨는 수십년을 가정폭력에 시달렸습니다. 이씨 남편은 사람을 칼로 찌른 적도 있고 “전과가 있다”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신혼 때부터 시작된 의심, 폭행, 협박. 그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이 발목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가게 하는 사람’이라는 고충도 있었습니다. 남편의 폭행 수위가 높아진 지난해 겨울. 이씨는 용기를 내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집사람이 바람이 났다”. 남편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경찰은 별다른 조치 없이 돌아갔습니다. “좋게들 해결하세요”라는 말만 남긴 채였죠.
수사기관이 도움을 요청한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냉담한 반응에 좌절한 이는 이씨뿐이 아닙니다. 지난달 29일 전국 690개 여성단체가 주최한 기자회견에서는 비슷한 사례가 나왔습니다.
16년 동안 가정폭력을 당해 늑골이 부러지고 목에 졸려 기절하기도 했다는 한 여성. 그는 전 남편이 한밤중 ‘죽이겠다’며 한밤중 문을 부수자 112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전 남편과 대화 후 ‘아줌마가 좀 잘하세요’라고 했습니다. 또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에게 수차례 폭행을 당했다는 다른 여성은 흉기를 들이대고 죽이겠다는 아버지를 신고하자 ‘그래도 아빠인데 어떻게 신고를 할 수 있니’라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다양한 기관들이 존재합니다. 여성단체, 법원, 상담센터등등이 있지요. 경찰은 이 중 피해자들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기관입니다.
그러나 경찰은 가정폭력 사건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가정폭력 범죄 검거 건수는 4만5614건으로 지난 2011년(6848건)에 견주어 7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구속된 이는 약 1%(509명)에 그쳤습니다.
경찰은 가정폭력 현장에서 직권으로 주거지 격리,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긴급임시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재범 위험성이 높고 현장이 긴급할 경우 피해 여성 보호를 위해 경찰 권한을 확대한 겁니다. 그러나 지난 2013년 기준, 전체 가정폭력범죄 검거 건수 중 경찰이 긴급임시조치권을 행사한 경우는 5.9%에 불과했습니다.
경찰은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걸까요. 먼저 가정폭력을 ‘집안 갈등’ 정도로 치부하는 안이한 인식을 들 수 있습니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 베기’ 같은 옛 속담도 우리 사회의 느슨한 인식을 뒷받침합니다.
단순히 인식 탓만 할 수는 없습니다. 실효성 없는 법도 문제입니다. 경찰들은 가해자가 접근금지명령을 어겨도 처벌이 과태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기에, 긴급임시조치 행사에 무력감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접근금지를 위반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라는 말을 가해자에게 하지 않는 편법을 쓸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한 경찰도 있었습니다.
지난달 22일 발생한 ‘강서구 아파트 살인사건’은 우리 사회에 충격을 줬습니다. 이혼한 아내 이모(47)씨를 4년 동안 집요하게 쫓은 피의자 김모(49)씨. 이씨는 6번이나 이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미루어 짐작해볼 뿐입니다. 김씨는 결국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이씨 차량에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달아 두 달 동선을 추적한 끝에 결국 새벽 운동에 나선 이씨를 살해한 겁니다. 가발을 쓰고 접근할 정도로 김씨는 치밀했습니다.
얼마나 더 많은 희생자가 나와야 우리 사회 인식이 바뀔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당장 죽을 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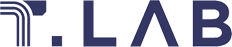














































 포토
포토








![이젠 진짜 정치가 필요한 때 [데스크칼럼]](http://img.kukinews.com/data/kuk/image/2024/04/18/kuk202404180020.300x28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