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정신질환자 혐오말라” 외친다고 될 일인가](/data/kuk/image/20190103/art_1547454589.jpg)
지난해 12월 말 故임세원 서울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외래진료실에서 진료 중 정신질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 그간 조현병 환자의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정신질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지 말아달라”고 외쳤던 정신과 의사마저 무참히 살해당한 사건이었다. 의료계는 물론 온 국민들은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계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깨야 한다고 주장한다. 환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는 것이 근본적인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이라는 것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현재 정신질환자들은 ‘편견과 차별-치료지연-사고 증가-편견 심회’라는 악순환 과정 속에 있다.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가 저조할수록 환자가 병원에 가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하게 되고, 이는 환자의 낮은 의료 이용률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조현병 등 중증 정신질환은 꾸준한 약물 복용과 치료로 극복이 가능한 질환인데도, 환자들은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조현병 발생 후 처음으로 치료를 받기까지 미치료기간은 2.5년이다. 이는 선진국의 2배로, 그만큼 치료를 늦게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료계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인식’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뚝딱 바뀌는 것은 아니다. 범죄 가해자의 정신질환을 중점적으로 다뤘던 언론의 영향도 있겠지만, 환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증상들과 잔혹한 범죄 행위,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 등 여러 이유로부터 정신질환자에 대한 불편한 감정이 형성됐다. 악의적인 의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폭력을 휘두르는 행위를 두고 질환의 증상으로 봐야 할지, 해를 가할 수 있는 사람으로 봐야할지 판단하는 일은 일반인에겐 난제일 수밖에 없다.
국민들에게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하기 전, ‘정신질환자도 환자’라고 인식하는 환경부터 만들어야 한다. 이를 테면 캠페인 등을 통해 국민들이 정신질환을 자세히 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환자를 발견하면 도움을 줄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다.
동시에 환자를 지속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기반을 확립해 환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주민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신의료기관이 환자 수용소처럼 느껴지지 않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동네의원이나 보건소처럼 쉽게 드나들 수 있도록 정신의료기관에서 다양한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시행해 의료진과 환자, 환자와 주민, 의료진과 주민 간 관계를 형성시키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다.
정부는 오는 6월부터 노인, 장애인은 물론 정신질환자까지를 대상으로 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실시한다. 적절한 치료와 투약 관리, 돌봄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실증 모델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선도사업이 국민들에게 질환을 알고, 환자에 대한 인식도 개선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해본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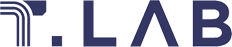
















































 포토
포토







![AI 시대에는 ‘두뇌 체육관’이 뜬다 [데스크칼럼]](http://img.kukinews.com/data/kuk/image/2024/04/22/kuk202404220461.300x28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