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쿡기자] 노무현이 남긴 숙제, 검찰 개혁](/data/kuk/image/20190521/art_1558506726.jpg)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박연차 게이트’로 첫 검찰 소환조사를 받던 날 함박웃음 짓던 검사들. TV로 생중계되는 ‘전국 검사들과의 대화’ 중 고졸인 대통령에게 학번을 묻던 검사들. 무소불위 검찰을 상징하는 장면들입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박연차 게이트’로 첫 검찰 소환조사를 받던 날 함박웃음 짓던 검사들. TV로 생중계되는 ‘전국 검사들과의 대화’ 중 고졸인 대통령에게 학번을 묻던 검사들. 무소불위 검찰을 상징하는 장면들입니다.
고 노 전 대통령 추도식이 벌써 10번째를 맞이했습니다. 그가 꿈꾸던 검찰 개혁은 여전히 갈 길이 멉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수사권, 영장청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 등 권한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검찰과 비교도 안 되는 권력입니다. 고 노 전 대통령은 검경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밀어붙였습니다. 그러나 단단한 기득권의 벽에 가로막혀 실패했습니다. 사람들은 고 노 전 대통령을 ‘순진하다’ 비웃었습니다. 결국 퇴임 직후 검찰의 보복 수사 칼날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핵심 과제입니다. 자유한국당의 결사 반대를 뚫고 지난달 국회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습니다. 상황을 지켜보던 문무일 검찰총장은 결국 공개적으로 항명했습니다. 지난 1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밝힌 겁니다.
며칠 뒤 문 총장은 해외 출장에서 급거 했습니다. 문 총장은 공항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국민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여론에 호소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이후 지난 16일 문 총장은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셀프 개혁안’을 제외하고 새로운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문 총장은 검찰이 과거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권 조정안은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국민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스스로 재킷 상의를 벗어 흔들면서 ‘검찰을 누가 흔드는지 봐달라’고 말하기도 했죠. 그러나 문 총장의 말을 곧이곧대로 들을 국민이 얼마나 있을 지 미지수입니다. ‘우리도 잘하지 못했지만 경찰은 안 된다’ 식의 태도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이기 때문입니다.
문 총장이 발표한 ‘셀프 개혁안’ 역시 물타기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해 검찰과 경찰이 서로 견제하는 구조를 만든다는 것이 수사조정안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수사 지휘권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죠. 문 총장이 제시한 검찰 종결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확대, 마약·식품의약 수사 등의 분권화는 본질과 거리가 멉니다.
검찰의 진의를 의심하게 하는 배경은 또 있습니다. 법무부 산하 과거사진상위원회(과거사위)는 검찰의 수사권 남용 의혹을 재조사하고 진상 규명 한다는 취지로 출범했는데요. 진상 규명을 방해하는 검찰 측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사위는 지난 20일 ’장자연 사건’을 재조사 권고하지 않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13개월 동안 조사를 해 온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진상조사단)은 “참담하다”는 입장입니다. 과거사위가 진상조사단 주축인 외부 위원들의 다수 의견은 묵살하고, 소수의 검찰 측 내부 위원들의 소수 의견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진상조사단 팀장인 김영희 변호사는 “(장자연 사건) 당시 검찰 수사는 직무유기 수준으로 부실했는데 수사 미진으로 보도자료가 나갔다”면서 “일부 검사들이 장자연 조사를 방해하고 결과를 축소하는 데 분명히 많은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상조사단은 앞서 수차례 조사단 활동에 검찰 인사들의 ‘외압’이 가해지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죠.
“민주주의를 말할 때 우리는 겸허해야 한다. 정말 내가 그렇게 살아왔는지 옷깃을 여미며 돌이켜보고도 당당할 수 있을 때 입에 올려야 할 단어, 그것이 민주주의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 총장 발언을 두고 한 말입니다. 검찰이 인권을 침해하고 검찰권을 남용한 사례는 '삼례 나라슈퍼 사건', '유우성씨 간첩 증거조작사건',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용산 참사 사건' 등 추리고 추려도 무려 17개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스스로 수족(手足)이 되어 조직과 기득권을 지키는 데 혈안이 됐던 검찰. 희생양이 된 무고한 시민들과 그 유가족들의 고통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검찰은 과연 민주주의를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자문해봐야합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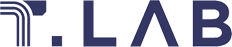









![제49회 의령 홍의장군축제 이모저모 [포토뉴스]](http://img.kukinews.com/data/kuk/image/2024/04/18/kuk202404180454.275x150.0.jpg)



![[포토]특허청-전남대 '지식재산교육 발전방안 간담회' 개최](http://img.kukinews.com/data/kuk/image/2024/04/18/kuk202404180452.275x150.0.jpg)































 포토
포토








![이젠 진짜 정치가 필요한 때 [데스크칼럼]](http://img.kukinews.com/data/kuk/image/2024/04/18/kuk202404180020.300x28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