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부메랑 돼 돌아올 주 80시간의 ‘부작용’](/data/kuk/image/20190522/art_1559127203.jpg)
“젊었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은 의사라면 꼭 새겨야할 말이다. 그런데 요즘 젊은 애들(전공의)은 이 말을 참 싫어하는 것 같다. 그래서 날 꼰대라고 하나보다. 그런 것도 같다. 하지만 꼰대가 아니라도 주변 교수들과 얘기해보면, 분명한 것은 (전공의) 주 80시간이 전공의들에겐 ‘독’이 될 것이란 점이다. 요즘 전공의들은 듣고 싶어 하지 않겠지만, 10년이 지난 후 땅을 치고 후회하지 않을 의사를 찾기가 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한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사회적 화두다. 의사들은 문재인 케어의 반작용이라며 경고하고 있다. 이 가운데 돌아봐야할 일이 있어 자판을 두드린다.
앞선 인용구는 한 대학교수와 전공의 특별법에 따른 근무시간 단축이 가져온 변화에 대한 대화를 나누던 중 그가 흥분하며 토해낸 말들 중 일부다. 2016년 12월 23일, 정식명칭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명 ‘전공의 특별법’이 시행된 후 2년 5개월여가 지난 지금, 수련병원에 근무하는 ‘선생’들의 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이다. 그리고 지금의 사회적 문제현상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요소를 지적한 말이기도 하다.
전공의특별법 시행에 따라 전문분야의 술기를 배우기 위해 전공의들이 근무하는 수련병원들은 주 80시간 이상 근무를 요구할 수도 없고, 36시간을 연속해서 근무하도록 해서도 안 된다. 만약 전공의들이 16시간 이상의 연속근무를 했을 경우에는 이어 10시간 이상의 휴식시간도 보장해줘야 한다. 전공의들의 인권을 위해서는 당연한 조치다.
문제는 전공의 특별법 시행으로 인한 폐해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다. 법의 사각에서 전문의들의 노동강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펠로우라고 불리는 전임의들은 전공의들이 떠난 당직근무시간을 메우기 위해 2배, 3배의 시간을 병원에서 보내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병원들 또한 말 잘 듣는 전임의를 더 충원하는 모습들도 연출되고 있다.
무제한에 가까운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던 인력이 법에 의해 보호되자 그보다는 비싸지만 활용도가 높고 역시 교수가 되기 위해 혹은 학위를 받기 위해 교수들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해 상대적으로 부리기 쉬운 전임의들을 선호하게 된 모습이다. 이 같은 변화가 환자들에겐 긍정적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좀 아닌 것 같다.
당장의 변화만을 보면 아직 수련해야할 전공의들의 업무과중으로 인해 발생하는 실수로 인한 의료사고가 줄어들 수도 있어 보인다. 보다 전문성을 갖춘 전임의들의 관리를 받는 점도 긍정적일 듯하다. 하지만, 벌써부터 문제가 발생하며 삐걱대고 있다. 4명 이상의 업무가 전임의 1~2명에게 집중되며 야간에는 의사보기가 더 어려워졌고, 케어의 질도 떨어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미래다. 전공의들의 수련을 담당하는 지도전문의들에 따르면 전공의들의 의술이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과거, 주 140시간씩 병원에 있으며 전문의들이나 교수들이 실수를 막아주거나 수습하는 상황 하에 다양한 임상적 경험과 환자 사례들을 경험할 수 있었다면 지금은 절대적인 시간이 80시간 이하로 줄어 의술을 쌓을 기회가 줄었다는 설명이다.
앞서 대화를 나눈 교수는 “지금 몸이 편하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다. 줄어든 시간만큼 습득할 수 있는 의술은 줄어들고 부메랑이 돼 돌아올 것”이라며 “환자에게도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 의술이 부족한 의사들이 진료를 보다 실수하는 경우가 많아지면 환자도 그만큼 의료과오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실수를 줄이기 위해 진료도 위축돼 상급종합병원 쏠림이나 의료쇼핑과 같은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과연 스스로를 ‘꼰대’라고 지칭한 이 교수의 경고나 우려가 과한 것일까. 잘 모르겠다. 그러나 이 질문에 선뜻 그렇다고 대답할 수 없는 상황인 것만은 분명하다. 분명 의료기관들은 잘못하고 있다. 전공의를 학생이 아닌 값싼 노동력으로만 취급하며 너무 몰아쳤다. 전공의특별법이 생기며 이젠 그 대상이 전임의로 옮겨졌을 뿐 달라진 점이 거의 없다. 이를 해결할 직접적인 책임은 분명 의료기관에 있다.
그렇다고 의료기관에게만 책임을 지워서도 안 된다. 병원들은 ‘의사가 없다’고 해명한다. 납득이 된다. ‘의사를 뽑을 돈이 없다’는 점에서도 이견은 있지만, 병원이 전공의들을 노동자가 아닌 학생으로 인식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돼야한다. 적어도 지금처럼 ‘사회적 합의’라느니 ‘의사의 자율적인 선택’이라며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실력이 좋은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고, 공적인 역할도 강조하며 공보험 체계에서 일하길 기대한다면 정부나 사회는 그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어떤 형태로든 지불해야한다. 현대 사회에서 보상 없는 의무를 강요할 수는 없다. 해서도 안 된다. 방법은 다양할 수 있다. 제시된 방안들도 많다. 고민과 결단이 필요해 보인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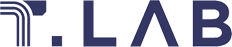














































 포토
포토








![이젠 진짜 정치가 필요한 때 [데스크칼럼]](http://img.kukinews.com/data/kuk/image/2024/04/18/kuk202404180020.300x28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