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벽부터 부지런히 채비를 하고 집을 나섰다. 추석 쇠러 집에 가는 길이다. 버스 정류장엔 아무도 없다. 아직 제주공항 가는 버스가 오려면 시간이 꽤 남아 있다. 정류장 의자에 앉아 바라보니 한라산 봉우리 끝이 깨끗하게 보인다. 여름이 지나도록 아침에 이렇듯 깨끗하게 보인 적이 거의 없었다.
새벽부터 부지런히 채비를 하고 집을 나섰다. 추석 쇠러 집에 가는 길이다. 버스 정류장엔 아무도 없다. 아직 제주공항 가는 버스가 오려면 시간이 꽤 남아 있다. 정류장 의자에 앉아 바라보니 한라산 봉우리 끝이 깨끗하게 보인다. 여름이 지나도록 아침에 이렇듯 깨끗하게 보인 적이 거의 없었다. 
노인 한 분이 유모차를 밀며 다가온다. 아침 일찍 산책을 나온 듯하다. 유모차에 의지해도 멀리 걷기는 힘에 부치는지 가까이 다가온 노인이 잠시 의자에 앉았다. 물끄러미 우리 내외를 바라보더니 묻는다.
“어디 가시오?”
“추석 쇠러 집에 갑니다.”
“어디 사시오?”
“저기 새로 지은 집 보이시지요? 저기에 삽니다.”
“언제 오셨소?”
“두 달 조금 넘었습니다.”
“뭘 하며 사시오?”
“퇴직하고 여기서 1년 살면서 여기 저기 좋은 곳 보려고 왔습니다.”
“한라산은 제주에서 볼 때 더 예뻐. 사람들이 그래. 서귀포에서 보다 제주에서 더 예쁘다고.”
“예. 여기서 산이 참 예쁘게 보이네요.”
“제주도 사람들이 다 한라산을 올라가 봤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못 가본 사람이 태반이오. 다들 살기 바빴으니. 그래 한라산은 올라가 봤소?”
“전에 몇 번 가 보았습니다. 요즘엔 오름에 자주 갑니다.”
“용눈이오름이 좋다고 합디다.”
“거기 엊그제 다녀왔는데 좋은 곳입니다.”
“잘들 다녀 오시우.”
할머니는 다시 유모차를 밀며 마을 쪽으로 걸어가고, 나와 아내는 마주보며 웃었다.

한 달 보름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여섯 번의 면접을 통해 많은 질문을 받았다. 마지막 면접 후 그 다음 날부터 출근할 수 있느냐는 질문은 ‘내일부터 출근하라’는 지시로 다가왔다. 내가 어떤 직책에서 어떤 일을 하는 지도 모른 채 ‘예’라 답을 하고는 그 집무실을 나왔다.

총무과장을 따라 부원장실에 가서야 내가 비서실장이라는 말을 들었다. 행정 사무실에서 채용에 필요한 추가 서류와 몇 가지 안내를 받고나서야 긴장이 풀렸다.
“저를 새로 온 비서실장이라고 소개하셨는데.”
“자네 비서실장인 줄 몰랐어?”
“네. 전 그냥 병원 인쇄물과 학술지 편집하는 줄 알고 왔습니다.”
“그것도 자네 할 일이고.”
“그러면 내일은 어디로 출근합니까?”
“면접 대기했던 비서실로 가야지. 거기가 자네 사무실이니까.”
근무와 관련해 궁금한 것이 산더미인데 그날 다 물어볼 수는 없었다. 집에 와 어머니께 백병원비서실장이라 말씀 드렸더니 피식 웃으며 한 마디 하신다.
“네가?”
시장에서 장사를 하시던 어머니께는 그렇게 큰 아들이 자랑스러운 이유가 하나 더 늘었고 나는 가슴 설레는 길로 들어섰다.

산굼부리는 제주에 와서 가본 몇몇 오름과는 전혀 다른 곳이었다. 오름이라기보다는 잘 정돈된 공원이다. 누구든 발에 흙 묻히지 않고 걸으며 제주를 살필 수 있는 곳이다. 유모차나 휠체어와 함께 둘러보는 사람들도 간혹 보인다.

산굼부리에서 출입이 허용된 곳은 오름 전체를 기준으로 약 사분의 일 정도이다. 나머지 부분은 보존을 위해 남겨두고 있다. 이만큼으로도 부족함은 없어 보인다. 적지 않은 입장료에도 불구하고 눈과 마음에 담을 장면들이 많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성문처럼 생긴 출입문을 통과하면 마음이 급한 사람들은 곧장 분화구 위로 걸어 올라가기도 한다. 마음먹으면 단숨에 갈 수 있을 만큼 경사도 완만하고 거리도 가깝다. 그러나 서두를 필요는 없다.

문에 들어서기 전 돌하르방 앞에서 제주 돌하르방의 유래를 읽고 산굼부리 산책을 시작한다. 그 앞의 오른쪽으로 담장을 따라 햇빛이 좋은 잔디밭이 있다. 그 주변으로 제주의 풍경과 해녀를 주제로 한 사진과 그림을 따라가다 보면 막연했던 제주의 일상이 보인다. 8월 말 이곳에선 제주상사화가 절정이었다. 남도 일대에서 9월 중순이면 붉게 타오르는 꽃무릇과는 전혀 다른 느낌의 애잔한 색이 인상적이다.

다양한 모양의 화산석들을 살피고 마치 고속도로처럼 넓은 길로 들어서면 마치 양쪽으로 스톤헨지의 거대한 돌기둥이나 이스터섬의 모아이석상이 연상되는 커다란 바위가 도열해 있다. 오른쪽엔 삼나무가 높이 치 솟아 있고 왼쪽 산굼부리 언덕엔 억새가 무성하다. 단조로운 길이지만 도열해 있는 바위의 모습이 제각각이고 그 바위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나무와 풀을 살피다 보면 새삼 생명의 끈질김에 감탄할 수밖에 없다.

10월 중순이면 이 넓은 억새밭이 온통 하얗게 변하고 그 사이의 샛길을 따라 평생 기억에 남을 사진 찍기에 바쁠 것이다. 이런 저런 생각 속에 잠시 걷다보니 어느새 능선이다. 산굼부리를 내려다보기 전 돌아보니 한라산 능선이 예쁘다. 산들바람 느끼며 시선을 가까이로 옮기면 억새들이 춤춘다. 저 깊은 분화구와 그 주변 경사면의 울창한 숲을 보고 고개를 들어 멀리 보면 여러 오름들 사이로 멀리 얼핏 성산 일출봉이 보인다.

산굼부리가 특별한 이유는 저 깊은 분화구 때문이다. 지름 650미터, 둘레가 2킬로미터에 깊이가 132미터의 이 분화구는 한라산 백록담보다도 더 넓고 깊다. 지질학자들은 산굼부리를 함몰 분화구라 설명한다. 즉, 용암이 분출과 폭발을 하게 되면서 지하에 빈 공간이 생기게 되는데, 이후 냉각되어 굳은 화구의 상부가 자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지반이 함몰되어 산굼부리의 분화구모양이 이루어졌다.

산굼부리에서 숲을 그냥 멀리서 바라만 볼 필요는 없다. 전망대 왼쪽에 구상나무길로 들어서서 1.2킬로미터의 길을 천천히 걷다보니 잘 다듬어진 잔디밭엔 무릇꽃이 한들거리고 억새풀 사이에선 야고가 고개 숙여 인사한다. 잔대는 작은 꽃을 흔들고 아직 이름을 모르는 이런저런 꽃들이 알아보아 주기를 바라듯 고개를 내밀고 있다.

그리고 거기서 구상나무를 본다. 1907년 한라산에서 처음 발견된 이 나무는 1915년 하버드대 교수였던 윌슨 박사에 의해 그 존재가 미국에 알려지게 되었다. 현재 구상나무와 관련된 재산권은 미국 스미소니언박물관이 가지고 있어서 우리나라 고유종임에도 정원수 등의 용도로 수입할 때는 지적재산권 사용료를 지불하고 수입한다. 우리나라 고유종인 털개회나무가 미국에서 미스킴라일락이 되어 수입되고 있는 상황과 같다. 산림청은 1997년 털개회나무를 희귀 및 멸종위기 식물로 지정했다. 구상나무 역시 기후 변화에 따른 생육환경의 변화로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다.

구상나무길을 돌아 나와 꽃굼부리라 불리는 잔디밭은 돌고 보니 산굼부리 출입문까지는 몇 걸음 되지 않는다. 산굼부리의 억새꽃이 기다려진다. 그 때쯤이면 다랑쉬오름 옆의 아끈다랑쉬오름과 새별오름의 억새꽃 소식도 들려올 것이다.

기고 오근식 1958 년에 출생했다. 철도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철도청 공무원으로 사회에 첫발을 내디뎠다. 강원도 인제에서 33개월의 군 복무를 마치고 다시 복직해 근무하던 중 27살에 성균관대학교 영어영문학과에 입학했다. 대학 졸업 후 두 곳의 영어 잡지사에서 기자로 일했으며, 인제대학교 백병원 비서실장과 홍보실장, 건국대학교병원 홍보팀장을 지내고 2019년 2월 정년퇴직했다.
편집=이미애 truealdo@kukinew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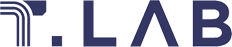




















































 포토
포토





![한 지붕 多 가족, 멀티 레이블의 함정 [데스크칼럼]](http://img.kukinews.com/data/kuk/image/2024/04/24/kuk202404240205.300x28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