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화의 티타임에 초대] 가을산책](/data/kuk/image/2020/11/23/kuk202011230176.200x.0.png)
모처럼 산책을 나갔다. 동네 근처 둘레길을 걸었다. 갈대와 억새가 사이좋게 몸을 비비고 강물도 흐르는 곳이었다. 새도 지저귀고 드문드문 들꽃도 남아있었다. 아름답고 맑은 가을날이었다. 그러나 날이 좋아서, 단풍이 좋아서, 그러며 나섰지만 그것도 잠시뿐, 막상 걸으면서 내가 보는 것은 내 발끝뿐이었다. 그러고 보면 나의 산책은 둘레길이나 강변이 아니라 내 마음을 산책하는, 말 그대로 마음산책이지만 그럼에도 나의 산책은 가을 산책이었다. 그것은 삶을 한 해로 치면 나도 가을을 지나고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었다.
사실 내가 그런 생각을 한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였다. 내 아이들이 어렸을 때, 나의 행동반경은 집과 애들 학교, 마트, 그 세 곳을 쳇바퀴 돌 듯 돌았다. 부모님을 찾아뵙는 일 외에 집 동네를 벗어나는 것은 겨우 손에 꼽을 만큼이라 나의 영역은 지극히 좁고 단순했으며 그러다 보니 엄마나 주부가 아닌 나 자신의 존재감은 점점 사라지고 있었다.
그렇게 사십 세가 되었을 때, 나는 별다른 족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내 삶이 아쉽고도 한심해 그것을 한 해와 하루의 시간으로 바꾸어 생각해보았다. 그리고 중년을 넘어선 내 인생의 시각은 아마도 가을의 오후 세시 쯤일 거라고 생각했다. 내 자신을 위한 씨앗은 심은 적도 없으니 거둘 것도 없던 가을과, 뭘 새로 계획하기엔 좀 늦은 것 같지만 남은 하루를 그냥 보내기엔 뭔가 섭섭해서 시작도 끝도 할 수 없는 애매한 오후 세시…. 그러고 나니 나는 나 자신이 더 시시하게 느껴졌고 그만큼 초조해졌다.
![[이정화의 티타임에 초대] 가을산책](/data/kuk/image/2020/11/23/kuk202011230177.680x.0.jpg)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뭔가 벗어나야겠으나 달리 갈 곳이 없어 돈을 주고 길을 샀다. 러닝머신 위의 길이었다. 나는 5킬로 10킬로 무작정 주어지는 대로 길을 걸었다. 어디를 가는지 의심하지 않고, 어떻게 갈지 걱정도 없이…. 그런 가운데 더 멀리 나아가기도 하고, 기계를 조절해 산길을 오른 후 정상에 다다른 듯 대견해 하면서…. 그러나 그것을 내려설 땐, 언제나 조금씩 슬펐다. 매번 단 한 발자국도 앞으로 안 나간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여전히 수확 없는 가을의 오후 세시를 서성거렸었다.
지금 생각하면 고작 사십 무렵에 내 인생에 가을이 왔다고 느꼈던 것이 우습다. 그때는 그때의 절실한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렇다면 내 삶에서 가을은 너무도 일찍 시작해 오래 가고 있는 셈이다.
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지금은 사실 내 시간이 남은 시간과 견주어 가을인지 언제인지, 또 아직도 오후인지 석양인지, 나도 모르는 사이 밤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다. 어떻든 살아온 해수로 나이를 생각할 때보다, 가을의 어느 시간을 지나고 있다고 생각하면 느낌이 다르다. 가을이라면 그동안 겪어온 시간만으로도 스스로를 너그럽게 봐줄만 하고, 언제 해가 저무는지 모르면 무엇을 꿈꾸거나 시작하기에 늦었는지 어쩐 지도 몰라서다.
어쩌면 이것을 깨닫는데 이만큼의 계절과 시간을 보내온 것 같다. 이제는 나의 노화나 수명의 계절이 가을이든 겨울이든, 저녁이든 밤이든 초조해하지 않는다. 내려놓는 것이 포기하는 건 아니란 것도, 받아들이는 것이 체념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도 안다. 그러니 여전히 앞날도 모르고 손은 빈손이지만 나는 지금이 암울하지만은 않다.
혼자 산책을 하였다. 길고 긴 산책이었다. 무얼 새로 깨닫는 데에 늦은 시간이란 없다. 놀랍고도 아름다운 가을이 가고 있었다. 놀라운 어떤 겨울이 오고 있었다. 묵묵히 걸어가야 할 겨울이. 어쩌면 어느 때보다도 새로울지 모를 어떤 겨울이. 기사모아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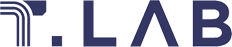
























![[인문학으로의 초대] 최금희의 그림 읽기(33)](/data/kuk/image/2024/04/15/kuk202404150058.300x203.0.jpg)







![[조한필의 視線] 아산 현충사 일본어 안내판 '오류 10년'](/data/kuk/image/2024/04/04/kuk202404040529.68x68.0.jpg)
![[조한필의 視線] 80세 총장의 놀라운 프런티어 정신](/data/kuk/image/2024/03/18/kuk202403180041.68x68.0.jpg)
![[포토]특허청-전남대 '지식재산교육 발전방안 간담회' 개최](/data/kuk/image/2024/04/18/kuk202404180452.300x203.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