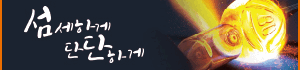‘맛집’은 음식 맛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주인 및 종업원 친절도가 중요하다. 아무리 맛있어도 서비스가 형편없는 곳은 먹는 내내 찝찝하다. 또 맛이 있더라도 계산대서 너무 비싼 값을 치루면, 있던 맛도 사라진다. “천안은 조금만 맛있으면 장사가 되는 곳.” 예전부터 자주 내뱉는 말이다. 물론 이 말을 수긍하지 않는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도 유효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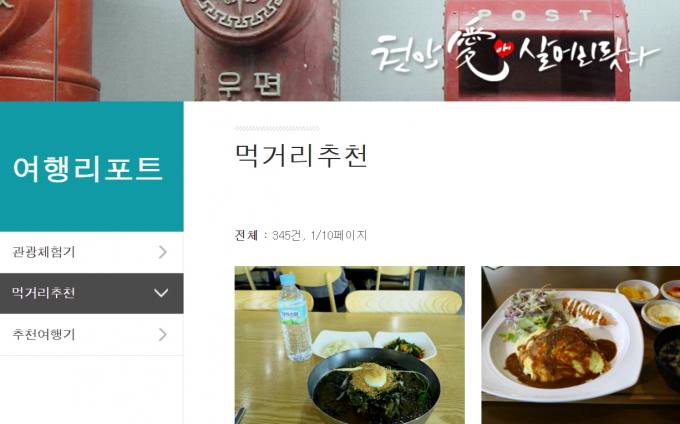
천안에는 오래된 맛집이 드물다. 도시의 역사와 규모로 보면 이상한 일이다. 특색 전통음식은 없는데 생뚱맞게 생태찌개가 유명하다. 유량동 원조집을 시작으로 괜찮은 생태찌개집들이 생겼다, 사라졌다를 반복했다.
최근 수년간은 두정동 한 생태찌게집에 몰리고 있다. 유명세 탓인지 요즘 손님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종전과 달리 예약을 받지 않는다. 찌개를 손님상에서 끓이기 때문에 미리 예약하면 편했던 곳이다. 그러나 지금은 전화하면 “우리 집은 예약을 받지 않는다”고 싸늘하게 답한다. 근데 꼭 그런 것도 아니었다. 한 번은 홀에 앉아 찌개가 ‘언제나 끓을까’ 기다리고 있었다. 서너 명의 손님이 들어서자 주인이 방안의 예약 자리로 안내하는 게 아닌가. 이 집은 손님에 따라 차별 대우를 하는 곳이었다. 그 광경을 보고 발길을 끊었다.
음식점 입구에 극혐 문구를 붙이는 곳들이 있다. “신발 분실시 책임지지 않는다”와 “셀프 반찬 남기면 벌금 물린다” 등이다. 그보다 더 싫은 건 배짱부리기 불친절이다. 이런 주인 태도를 종업원들은 귀신같이 배운다.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난 격이다.
휴가에 어디 갈까 고민될 때 가고 싶은 음식점이 있는 지역으로 결정하기도 한다. 이렇게 여행객을 불러올 만한 ‘맛집’이 천안에 얼마나 있을까. 주위에 천안 관광을 추천하도록 만드는 음식점이 많으면 지역 관광산업은 저절로 일어난다. 음식맛, 서비스, 음식값의 3박자 조합이 이뤄져야 가능하다.
지난주 경북 울진·영덕지역 여행을 했다. 점심 때 영덕군 영해(寧海)면에서 3박자 조합을 이루는 곳에서 식사하는 행운을 잡았다. 그 즐거움에 예정에 없던 영해 관광을 반나절 했다. 천안 아우내장처럼 영해시장에서 3000명이 모인 대규모 3·1만세운동이 일어난 걸 처음 알았다. 유서 깊은 고장의 근대등록문화재 건물을 살필 기회도 가졌다. 또 목은 이색이 이곳의 외갓집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가까운 관어대(觀魚臺)에 올라 너른 평야와 하천이 흘러 만나는 동해가 한 눈에 들어오는 장관을 감상할 수 있었다.
천안 태조산공원 앞에 한 만두집이 있다. 맛과 서비스도 한결 같지만 고객들 원활한 주차를 위해 한 아저씨가 항상 나와 있다. 무슨 맛이 그리 자신 있는지 손님 주차 신경도 쓰지 않는 곳과는 맛집 차원이 다르다.
우리가 천안서 찾는 ‘맛집’은 바로 이런 곳이다. 아내가 다녀 온 지 몇 일이나 된다고 3시간 넘게 걸리는 영해 얘기를 계속 한다. 올해 안에 또 가자미 구이와 서비스 ‘맛’ 보러 가야 할 것 같다.
/천안·아산 선임기자 chohp1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