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운 교수 “지구의 주인은 우리가 아냐” [쿠키인터뷰]](/data/kuk/image/2023/12/11/kuk202312110268.680x.9.jpg)
“끝까지 자리를 지켜서 여기까지 온 거로 생각해요. 만약 다른 분들도 자리를 지켰다면 더 훌륭한 분이 이 자리에 있었을 겁니다.”
지난달 제18회 동북아생물보전대상에서 수상한 임영운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교수는 그저 오래 자리를 지킨 것을 수상 이유로 설명했다. 이전까지 주로 식물 분야 연구자들이 상을 받았지만, 올핸 배꼽낙하산버섯 등 115종의 신종과 붉은달걀광대버섯 등 190종의 미기록 진균을 발굴한 공적으로 임 교수가 수상했다.
곰팡이, 버섯 등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도 있다. 잠깐 방심하면 귤이나 음식을 뒤덮고 환기가 잘 안 되는 집을 점령하는 골칫거리이기도 하다. 일상에서도 이런 인식이 드러난다. 이순신 장군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 ‘명량’(감독 김한민)엔 “독버섯처럼 번지는 두려움”이란 대사가 나온다. 임 교수는 이 역시 오해라고 설명한다. 실제로 독버섯은 굉장히 천천히 자란다. 또 자연‧사람에 이로운 진균도 많다. 임 교수가 발견한 해양균류 중에는 플라스틱 등을 분해하거나, 항생제를 만드는 데 요긴하게 쓰일 진균도 있다.
“지구의 주인은 우리가 아냐…자연과 친해져야”
임 교수는 인간이 자연의 중심이라는 전제에서 생물다양성 개념이 흐릿해지고 환경오염, 기후 위기로 이어진다고 진단했다. 이를 바꾸려면 수직이 아닌 수평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게 그의 철학이다. ‘다른 생물이 있어 내가 있을 수 있고, 내가 있어 다른 생물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자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순환을 만든다고 믿는다. 이 관점이 쓰레기를 덜 버리고 동‧식물, 진균 등 자연 자체를 보호하려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임 교수는 설명했다.
임 교수는 “지구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지구의 주인이니 잘 관리해서 인류가 영원히 번성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전제에서 무언가 행동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인류가 지금 우세한 종이긴 하지만, 길게 보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지구 전체 주기를 들여다보면 어느 한 종이 우세하다가도 빙하기나 소행성 충돌 등으로 사라지고 또 다른 종이 나타나는 식으로 순환한다. 인간 역시 순환하는 생태계 속 일부분이다.
![임영운 교수 “지구의 주인은 우리가 아냐” [쿠키인터뷰]](/data/kuk/image/2023/12/11/kuk202312110272.680x.9.jpg)
어릴 때부터 자연과 친해져야 이런 관점이 삶에 스며들 수 있다는 것도 그의 철학 중 하나다. 온라인 세상을 많이 접하면 자연을 봐도 특별한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는 얘기다. 임 교수는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같은 곳에서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자연과 함께 한다”라며 “자연에 감사하고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한국은 이런 기회가 적다 보니, 근처에 산이 없어져도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아쉬워했다.
“놀면서 연구할 수 있다기에…기초학문 탄탄해야”
‘30여 년 동안 진균 분류와 계통 연구’ 외길을 걸어 왔다. 전공 분야에 처음 발을 디딘 건 ‘교수님이랑 산도 다니고 놀면서 연구할 수 있다’는 친구의 말 때문이었다. 오랜 시간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동력은 ‘즐거움’이다. 하다 보니 즐거웠다. 즐거워서 몰입하다 보니 자신감이 생겼다.
임 교수는 “다들 촉망받는 분야로 빠지고 있었다. 내가 하는 분야는 남들에 비해 뒤처지는 게 아닌지 걱정도 들었다”라며 “깊게 빠져보니 처음 발을 디딜 때와 다른 세상이 펼쳐졌다. 어느 순간 ‘내가 최고가 될 수 있다. 이게 내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깊이에서 넓이로’. 그의 요즘 고민거리다. 임 교수는 “진균 또는 곰팡이가 이로운 역할을 많이 한다는 사실을 사람들도 많이 알아줬으면 한다. 나 역시도 연구에 많이 집중해왔다”라며 “이제라도 곰팡이, 버섯에 대한 좋은 점을 알리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대중을 향한 첫걸음으로 어린이를 위한 교재 제작을 고려하고 있다.
기초과학에 대한 고민도 계속되고 있다. 정부의 R&D 예산 삭감 지침으로 연구비‧인건비가 줄어들며 연구 자원인 인력들을 유인할 요인이 더욱 적어졌다. 임 교수는 “기초학문은 1~2년 내 또는 10년 내 바로 성과를 내는 학문이 아니다”라며 “그렇지만 기초학문이 쌓여야만 다른 응용 분야도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예산 증감에서 중요한 건 ‘예측 가능성’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물론 예산이 늘어나면 좋다”라며 “그러지만 항상 늘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건 안다. 다만 예측이 가능해야 우리도 준비할 수 있다. 예고 없는 변화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제학자인 에른스트 슈마허는 저서 ‘작은 것이 아름답다’에서 우상이란 거대한 것에 집중하며 고통 받는 현대인들에게 “작은 것의 미덕을 고집하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임 교수가 학문을 통해 전하려는 메시지 역시 마찬가지다. 그는 매 강의 마지막 시간에 학생들에게 꼭 한다는 이야기를 들려줬다.
“각자에겐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한 나무에서 자신의 자리에서 빛을 받고 역할을 충분히 잘하는 수천 개의 이파리처럼, 우리 역시 그러면 돼요. 진화학에선 끝까지 살아남은 놈이 최강자입니다. 우리도 지금 여기 남아 있지 않나요.”
유채리 기자 cyu@kukinews.com
![임영운 교수 “지구의 주인은 우리가 아냐” [쿠키인터뷰]](/data/kuk/image/2023/08/04/kuk202308040137.500x.null.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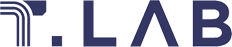


















![“어깨가 안 올라 갔다는 박수홍” [건강 나침반]](http://img.kukinews.com/data/kuk/image/2024/05/02/kuk202405020038.275x150.0.jpg)



















 포토
포토






![조합원이 아닌 모든 노동자 삶부터 세심히 살피길 [데스크칼럼]](http://img.kukinews.com/data/kuk/image/2024/05/01/kuk202405010151.300x28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