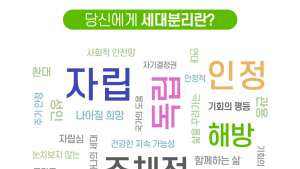짧은 기자경력 중 ‘감정 소모’가 제일 심한 취재였다. 잊혀져 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만나 일단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처음 인터뷰 방법을 알려준 선배에게 ‘취재원의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팩트를 확인하라’고 배웠지만 이번에는 말처럼 쉽지 않았다.
다섯 살 난 딸의 곁을 오래 지켜주고 싶다는 소박한 소원을 가진 피해자 신지숙씨를 만나던 시간은 특히 더 그렇다.
마른 팔다리와 거친 숨소리, 병색이 완연한 그는 집에 방문한 기자를 보고 애써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화답하듯 밝게 인사하며 거실에 들어섰지만 사실 마음은 이미 불편했다. 전날 갑자기 아이가 아파 약속을 미뤄도 되겠냐는 부탁을 들은 차였다. 소파에 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는 신씨를 보니 취재라는 명분으로 가뜩이나 아픈 그를 더 힘들게만 만드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머리 속을 맴돌았다. 어린 딸에게 짐이 될까, 외벌이를 하며 희생하는 남편에게 부담될까 걱정하던 그는 중간 중간 고통스러워하며 기침 소리를 뱉어냈다. 그리고 그 소리는 지금까지 귓가를 떠나지 않고 있다.
뱃속의 태아와 아이 한 명을 먼저 떠나보낸 권민정씨와의 전화통화에서는 죄책감마저 들었다.
권씨가 아픈 상처를 떠올리며 흐느끼는 소리가 수화기 넘어 들려왔다. 그런 권씨에게 뼈아픈 질문을 던져야 하는 이 직업이 원망스러워지기도 했다.
세상을 떠난 아이들의 증세는 어땠는지, 병원비와 장례비는 지원받았는지, 당시 느꼈던 감정은 무엇인지 등을 계속 물어댔다. 통화를 마치고 나자 그가 울면서 대답한 시간 동안 기사로 옮길만한 말이 뭐가 있나 생각했던 게 뒤늦게 미안했다.
정확한 병명도 모르고 세상을 떠난 아내를 떠올리면 억장이 무너진다는 최주완씨는 큰 수술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몸으로 흔쾌히 만남에 응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게 관심을 가져줘 고맙다는 이유에서다.
최씨는 “정부의 무관심과 해당 기업들의 대응에 이미 너무 지쳤다. 나 혼자만의 일이었으면 벌써 그만뒀을 것”이라며 한숨을 쉬었다. 그러나 이내 “같은 고통을 함께 감내해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멈추지 않을 것이다. 아내를 위해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다짐했다.
취재 말미, 잘생긴 아들과 야무진 딸 자랑을 늘어놓는 그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보통의 아버지였다.
이 글의 마무리를 어떻게 지어야 할지 떠오르지 않는다. 아니, 굳이 거창한 마무리를 생각해내야 할 필요성도 못 느낀다. 오로지 하나만 궁금하다. ‘이들의 눈물이 마르게 될 날은 과연 언제일까.’
민수미 기자 min@kmib.co.kr
[쿠키영상] '팬티 속에 불개미 넣기!' 태국 용사(?)의 무모한 도전 말.못.미.
[쿠키영상] ‘WOW’ 피자헛 박스가 ‘빔 프로젝터’로 변신!
[쿠키영상] ‘후덜덜’ 다이빙 하자마자 상어가 내 눈앞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