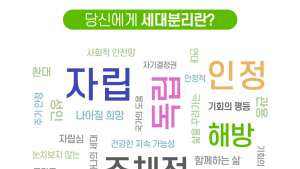전통적 의미는 퇴색되고 있지만, 그래도 명절은 명절이다. 열차 승차권을 구하기 위해 귀성객들은 서울역 바닥에 앉아 누워 쪽잠을 자고, 마트와 시장은 차례상에 올릴 음식을 마련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로 북적인다. 오랜만에 가족들이 만나 정겹게 이야기하는 모습도 여전하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는 돌아오는 명절에 서글퍼하는 사람들도 존재한다.
보육원에서 자란 대학생 정모(23)씨에게 명절의 의미는 크지 않다. 오히려 ‘안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정씨는 “보육원에서 지냈던 시절엔 그래도 친구들과 함께 있어 외로움이 덜 했는데 성인이 되고 그곳에서 나온 이후 맞은 몇 번의 명절은 너무나 외로웠다”고 털어놨다.
그는 “처음엔 서툰 음식 솜씨로 전을 부쳐 먹거나 친구들을 만나 명절 분위기를 냈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마저도 힘들어졌다”며 “외롭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마는 나와 같은 사람들이 추석이나 설날에 느끼는 감정은 보통 사람들은 이해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추석 계획을 묻는 말에 한숨부터 내쉬던 정씨는 “‘다행히’ 아르바이트가 있어서 일할 것 같다”며 “집에 혼자 있는 것보단 차라리 낫다”고 답했다.
인천 중구에서 혼자 사는 김모(68)씨도 명절이 적적하긴 마찬가지다. 그도 한때는 아내, 자식들과 시끌벅적한 추석을 보냈다. 하지만 젊은 시절 겪은 사업 실패로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지금까지 그는 홀로 생활하고 있다.
김씨는 “나이가 들어 이제는 무슨 날이 됐다고 해서 설레지는 않는다. 그런데도 설날과 추석에는 마음 한쪽이 많이 아리다. 가족들 생각 때문”이라고 고백했다.
이어 “아내 요리하던 모습, 아이들 한복 입고 뛰어다니던 모습, 연휴에 웃으며 나들이 가던 기억이 잊히지 않는다”며 “명절에 혼자 있다가 그런 생각들을 하면 웃음도 나다가 눈물도 나다가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에서 돈도 조금 나오고 지자체 사람들이 가끔 들리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외로움까지 해결되진 않는다. 다만 이 근방에 사는 사람 대부분이 혼자라 가끔 이웃집에 들러 서로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에 위안을 얻는다”고 했다.
가족이 있어도 명절이 반갑지 않은 사람도 있다. 취업준비생들이다.
오모(32)씨는 4년 전 회사를 다니다 직장 내 갈등으로 인해 퇴사했다. 이후 공무원이 되기로 마음먹은 그는 바로 공부를 시작했지만 지금까지 이렇다 할 성과는 내지 못하고 있다.
오씨는 “나이는 점점 먹어가는 데 시험에 번번이 떨어진다. 가족들과 떨어져 서울 노량진 근처 고시원에서 따로 살고 있는데 부모님 뵐 낯이 없어 이번 추석에도 고향에는 못 갈 것 같다”며 한숨을 쉬었다.
이어 “본가가 큰집이라 친척들도 많이 모인다”면서 “친척 어른들이 내가 없으니 나에 대한 질문을 우리 부모님께 한다던데 난처해하실 것만 생각하면 앉아서 죄를 짓고 있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2년 전 대학을 졸업한 이모(26)씨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아직 취직하지 못한 이씨는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다. 그는 “남들은 고향에 안 내려가면 그만이라고 하지만 나는 그럴 수도 없다”며 “친가, 외가 친척들도 모두 근처에 살고 있어 연휴 때마다 가시방석에 앉아있다”고 토로했다.
“나도 너무 취직하고 싶은데 노력해도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지 않나”라고 반문하던 이씨는 “가족들 모두 일부러 취업 관련 질문은 피해주는데 그런 분위기마저 고통스럽다. 정말 명절이 안 왔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하다”고 전했다.
민수미 기자 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