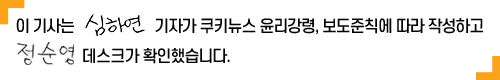향수는 패션 브랜드의 무덤이라고 했던가. 브랜드에게 향수 사업은 종종 마지막 불꽃이 된다. 패션 브랜드가 더 이상 본업으로 수익을 낼 수 없을 때, 혹은 브랜드 감도가 떨어져 더 이상 명품 시장에서 주목받지 못할 때. 이름 좀 날렸던 브랜드는 그간 쌓아온 브랜드 이미지를 활용해 마진율이 높은 큰 향수를 만든다. 존 바바토스, 지미 추, 티에리 뮈글러가 예시다.
최근 패션 브랜드는 향수뿐 아니라 ‘뷰티’ 전반으로 손을 뻗고 있다. 프라다는 별도 법인을 설립해 ‘프라다 뷰티’를 공식 론칭했고, 루이비통은 창립 17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루이비통 뷰티’라는 이름의 뷰티 전용 조직을 출범시켰다. 명품 브랜드의 뷰티 진출이 놀라울 일은 아니지만, 지금처럼 공격적인 확장을 시도한 적은 드물다.
그렇다면 패션 기업은 왜 단가도 낮은 뷰티 사업을 넘볼까. 패션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이상 기후와 글로벌 경기 침체로 패션 산업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여름은 비상식적으로 길고, 겨울 기온 역시 종잡을 수가 없다. 봄과 가을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다. 트렌드에 맞춰 시즌 제품을 기획하는 일 자체가 불확실해졌다. 시즌에 맞춰 옷을 사야 할 타이밍이 사라지는 것이다.
반면 뷰티는 비교적 안정적이다. 화장품은 계절에 구애받지 않고, 재고 관리에도 용이하다. 프리미엄이 붙어도 옷보다 저렴하다. 돈이 없어 ‘명품 가방’은 살 수 없어도 ‘명품 립스틱’은 살 수 있는 것이다.
이에 국내 패션 기업들도 뷰티 카테고리를 키우고 있다. 신세계인터내셔날은 향수를 본격적으로 수입하기 시작했고, 프리미엄 뷰티 브랜드 ‘연작’ 등을 운영하고 있다. LF도 자사 패션 브랜드에서 비건 뷰티 라인을 넓혔다.
사실 패션기업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옷은 버블 경제 때나 잘 팔렸다’는 말도 있지만, 지금은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대부분의 패션 브랜드가 수년째 매출과 영업이익이 동반 하락하고 있으며, 오프라인 기반의 중견 패션 기업들은 특히 큰 타격을 입고 있다.
특히 첫 시도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중소 패션 브랜드에게는 작금의 환경이 치명적이다. 대기업처럼 적자를 감수하면서 새로운 브랜드를 시도할 수 있는 실탄이 없기 때문이다.
패션 산업의 위기는 이제 글로벌 변수에서도 나타난다. 최근 미국 정부는 일부 한국산 의류 제품에 대해 최대 25%의 상호 관세 부과를 추진하고 있다. K-패션을 기반으로 해외 ODM 사업을 펼치고 있는 국내 기업들에 치명적인 악재다.
국내 의류 제조·수출기업인 한세실업은 GAP, H&M, 타미힐피거, 자라 등 글로벌 브랜드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데, 관세가 본격화되면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고, 신규 수주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베트남·방글라데시 등으로 생산지를 다변화하고 있지만, 구조적 리스크는 여전하다.
장기적으로 뷰티 사업에만 의존하는 패션 기업은 오래 살아남을 수 없다. 패션은 감각만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수많은 디자이너들의 꿈으로, 봉제공장의 노동자로, 지역경제의 일환으로, 유통망의 생계로 존재한다.
패션 산업에 대한 제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단순 멋을 추구하는 일이 아닌 수많은 청년 디자이너와 일자리, 원부자재 기업, 중소 제조공장과 유통망이 얽혀 있는 종합 산업으로 해석해야 한다.
지금 이 산업은 명백히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트렌드를 만드는 산업이 아니라, 지금은 생존을 모색해야 하는 산업이다. 기업의 자구책 마련엔 한계가 있다. 정책적 관심과 실질적 지원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