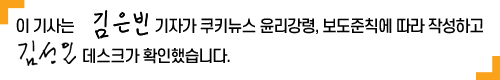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 1월 닻을 올린 대통령 직속 국가바이오위원회가 출범 직후부터 위기를 맞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위원장을 맡을 대통령 자리가 공석이 되면서다. 위원회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8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바이오위원회가 지난 1월 출범했다. 국가바이오위원회(바이오위)는 국내 바이오 분야 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범부처 최상위 거버넌스다. 대통령이 직접 운전대를 잡고, 바이오 연구개발(R&D)부터 인허가까지 바이오 정책 전반을 심의한다는 점에서 업계의 기대가 높았다.
그러나 바이오위는 출범부터 삐걱거렸다. 당초 지난해 말 닻을 올릴 예정이었으나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전 대통령의 직무정지로 출범에 제동이 걸렸다.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지만, 지연 끝에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으며 올해 1월23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어렵게 출범했으나, 바이오위의 실효성에 물음표도 달린다. 불과 1년여 전인 2023년 12월 출범한 국무총리실 산하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혁신위)의 목표와 성격이 크게 다르지 않은 탓이다. 두 위원회는 2027년까지 바이오헬스분야 11만명의 산업인재 육성, 국가 바이오데이터 플랫폼 민·관 데이터 연계, 바이오 기술격차 감축 등 목표가 겹친다. 민간위원의 경우 이상엽 한국과학기술원 생명화학공학과 특훈교수, 김영태 서울대병원장,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허은철 GC녹십자 대표이사, 황희 카카오헬스케어 대표이사, 김법민 고려대바이오공학부 교수 등 6명이 두 위원회에 나란히 소속돼 있다.
두 위원회의 임무와 구성이 겹친다는 지적에 대해 이창윤 과학기술방송통신부 2차관은 지난 1월23일 브리핑을 통해 “혁신위는 보건·의료 분야의 산업 진흥, 규제 완화에 포커스를 두는 전문위원회다. 바이오위는 보건·의료 뿐 아니라 제조, 농수산식품, 에너지 등 정책 영역이 넓어진다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다만 앞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두 위원회 간 기능 차별성 등에 대해선 면밀하게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큰 문제는 바이오위의 지속 가능성이다. 바이오위 운영의 법적 근거는 대통령령인 ‘국가바이오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시행령’이다. 위원회의 종속 시한은 2027년 6월30일까지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인 만큼, 새 정부가 들어서면 백지화 될 공산이 크다.
업계에선 바이오위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에서 리더십 진공 상태에 놓인 점이 아쉽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향후 의약품 관세 부과 가능성을 시사한 만큼 정부 차원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제약바이오업계의 한 관계자는 “바이오위는 혁신위와 성격이 비슷하다는 점에서 아쉽긴 하지만, 대통령이 직접 수장을 맡은 만큼 산업 육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던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미국의 의약품 관세 부과 방침 등에 적극 대응해야 할 시기에 바이오위가 정치 상황으로 인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게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