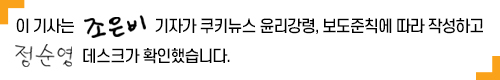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관세 정책이 글로벌 배터리 산업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중국 중심 구조인 LFP(리튬인산철) 배터리 시장 중심의 판도가 흔들릴 수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에너지 전문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2월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양극재 적재량은 전년 동기 대비 46.6% 성장했다.
해당 기간 순수전기차·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EV)·하이브리드차(HEV)에 사용된 양극재 총 적재량은 28만600톤으로 집계됐다. 특히 중국을 제외한 시장에서 28.0% 증가한 10만9900톤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갔다.
같은 기간 LFP 시장의 적재량은 90.4% 급증하며 15만2400톤을 기록했다.
이에 LFP의 시장 점유율도 54.3%로 과반을 넘어섰다. 미국의 초고율 관세 정책은 중국산 LFP 양극재 및 배터리 소재의 미국 내 가격 경쟁력을 현저히 약화해 미국 내 배터리 제조기업과 완성차 제조사(OEM)에 공급망 다변화 압력을 가중할 전망이다.
SNE리서치는 “중국 정부가 희토류 수출 규제 등 추가 대응을 검토하는 만큼 글로벌 배터리 소재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더욱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 시장 전략으로 현지 생산 설비 증설, 글로벌 공급망 전략 재편, 포트폴리오 다변화 등 다각적인 대응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정부는 지난 2일 각국에 10~49%의 상호 관세를 발표하면서 중국엔 34%의 관세율을 책정한 바 있다. 하지만 중국이 보복 관세로 맞불을 놓자 미 정부는 중국에 대한 두 차례 관세를 끌어올리며 대중 관세를 125%에 달하는 고율 관세 부과를 언급했다.
미국은 이번 조치를 통해 자국 내 제조업 회복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이 이에 대응해 희토류 및 리튬 화합물 수출 제한을 검토하면서, 글로벌 배터리 소재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더욱 심화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로 인해 중국산 LFP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하면서 한국, 일본, 유럽 등 다른 지역 업체들이 미국 시장에서 입지를 확대할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한 배터리 업계 전문가는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은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 다변화와 비용 상승 유발 등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도 “기존에는 중국 중심의 저비용 공급망 구조가 주를 이루었지만, 앞으로는 지역별 생산 다변화와 현지화 전략 등 새로운 전략적 도전을 통해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