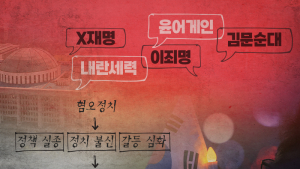"[인터뷰] ‘배우’라는 수식어가 누구보다 잘 어울리는 황정민. 실제 만난 그는 유명 배우라는 느낌보다는 털털한 이웃주민 같았다. 허세와 과시욕 대신 솔직함과 편안함이 그를 채웠다.
연기 이야기를 할 때는 눈을 반짝이며 욕심과 열정을 가득 내비쳤고 아들 이야기를 할 때는 너털웃음을 지으며 ‘아들바보’가 되기도 했다.
영화 ‘댄싱퀸’을 통해 우리 곁을 찾은 황정민을 지난 11일 서울 삼청동 카페에서 만났다. 인터뷰 시간은 오전 10시. 다소 이른 시간이지만 상쾌한 미소를 지으며 카페에 들어선 그는 누구보다 활기찼다.
“제가 아침잠이 없어요. 나이 들면서 더더욱 없어졌고요. 어젯밤에 ‘댄싱퀸’ 스태프들과 술 한잔했더니 정신은 조금 없네요(웃음).”
자신을 애주가라고 소개한 그는 술을 통해 사람과 더 친해질 수 있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스스로 찾지 못했던 것을 얻을 수 있다고 했다. 변명 같지만 이러한 장점 때문에 술자리를 더 자주 만든다고.

“영화 속 실명사용, 벌거벗은 기분”
‘댄싱퀸’은 서울시장후보의 아내가 댄싱퀸이라는 독특한 설정을 바탕으로 한 코미디 영화다. 어쩌다 보니 서울시장 후보가 되는 정민(황정민)과 우연히 댄스가수가 될 기회를 잡은 왕년에 잘 나가던 신촌 마돈나 정화(엄정화)가 부부로 등장해 극을 이끈다.
설 연휴를 맞아 개봉한 ‘댄싱퀸’은 금세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며 호평받고 있다. 엄정화의 화려한 춤과 노래 실력에 눈과 귀가 즐겁다. 또 ‘내 생애 가장 아름다운 일주일’(2005)과 ‘오감도’(2009)에 이어 세 번째로 호흡을 맞추는 엄정화와 황정민의 실감 나는 부부 연기는 관객을 울고 웃게 한다.
특이한 점은 이번 영화에서 두 배우 모두 실명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황정민은 “처음에는 벌거벗은 기분이었다”며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배우들은 역할을 맡으면 새로운 인물을 창조합니다. 어떻게든 실제 모습을 숨기려고 하죠. 마치 가면을 쓰는 것처럼 관객들에게 새 캐릭터를 인식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댄싱퀸’에서는 정민이라는 실명을 씁니다. 처음에는 저를 다 보여주는 것 같아 창피했습니다. 마치 홀딱 벗겨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하지만 이왕 이런 거라면 정확하게 저를 보여주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초반에는 불편함과 고민이 있었지만 영화를 보는 순간 실명 사용이 탁월한 선택이었음을 깨달았다.
“영화를 보니 정민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객들이 인물에 더 친숙하게 동화될 수 있는 것 같고 연기를 하면서도 편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실 영화 내용은 실제상황에서 벌어지기 힘든 이야기인데 그런 점을 상쇠 시켜주는 데는 이름이 주는 효과가 컸던 것 같습니다.”

“‘댄싱퀸’ 30대 때였다면 절대 안했을 작품”
모든 것을 잘하려고 애쓰다 보면 부러지기 마련이다. 노력은 하되 유연함을 가져야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법. 마흔을 넘긴 황정민은 유연함의 미덕을 역설했다.
그는 서른 살 때부터 영화를 시작해 10년 넘게 연기에 몸을 담고 있다. 마흔 살이 될 때까지는 누구보다 치열하게 경쟁했다. ‘연기 잘하는 배우’ ‘관객에게 좋은 배우’가 되는 것이 그의 삶의 목표였을 정도다. 하지만 현재 그의 생각은 예전과 조금 달라졌다.
“그동안은 미친것처럼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그만 좀 해. 너 열심히 하는 거 아니까 이제 좀 놀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로는 일하는 것이 편해졌습니다. 아마 30대 때 ‘댄싱퀸’ 대본을 받았으면 안 했을 것입니다. 그때는 영화는 관객에게 어떠한 의미를 줘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것이 예술가로서의 의무이고 덕목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은 아무 생각 없이 ‘팝콘 영화’를 보는 것도 의미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만큼은 롤러코스터를 타듯 즐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편하게 ‘댄싱퀸’을 택하게 됐습니다.”
마흔 살을 넘기고 달라진 점은 연기에 대한 자세뿐이 아니었다. 삶도 한층 여유로워졌고 마음가짐도 편안해졌다. 예전에는 촬영 현장에 가족과 기자 등 외부인이 오는 것을 끔찍이 싫어했지만 요즘에는 지인들을 초대하기도 한다.
“마흔 살이 되면 연기를 천장에 붙어서도 할 만큼 달라질 것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기술적으로 달라지는 건 없더군요. 단지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스스로를 믿고 인정하게 됐죠. 예전에는 촬영 현장에 누가 오면 집중력이 흐트러질 것 같아 못 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여유가 생기니 친구도 부르고 가족도 부릅니다. 아기를 데려오기도 하고 거의 파티분위기죠. 그만큼 사람이 자연스럽게 변한 겁니다.”

“배우라는 이유로 삶의 영역이 좁아지는 것, 절대 못 참죠”
황정민은 배우일 때와 아닐 때를 철저히 구분한다. 배우라는 이유로 삶의 영역이 좁아진다면 본인과 가족을 위해서라도 배우를 그만둬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만큼 일상에서는 연예인이 아닌 한 가정의 평범한 남편이자 아빠다.
“일하지 않을 때는 백수입니다.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기도 하고 집안일을 돕기도 하죠. 연기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철저하게 구분 짓는 편입니다. 제 삶에 배우라는 것을 끌고 오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삶이 좁아집니다. 직업이 배우라는 것 때문에 제 삶이 닫히는 거면 배우 안 해도 됩니다. 이런 생각으로 평소에는 더 꾸미지 않고 다닙니다. 주위 사람들이 ‘이렇게 다녀도 돼?’ 라고 묻기도 하고 ‘동네 양아치 형’이라고 부르기도 하죠(웃음). 하지만 이게 더 편합니다.”
‘호감 배우’로 불리는 황정민. 스스로 생각하는 매력은 무엇일까. 한참을 고민하더니 “아내에게 물어봐야겠다”며 수줍은 미소를 지었다.
“배우로서는 상당히 쿨한 것이 매력인 것 같습니다. 할 것이면 확실히 하고 아쉬울 것 같으면 아예 하지 않습니다. 또 잊을 건 금방 잊고 기억할 것은 확실히 기억합니다. 하지만 일반인 황정민으로서는 어떤 점이 매력인지 쉽게 떠오르지 않습니다. 사람이야 알고 보면 누구나 다 착한 것이고… 아내에게 물어보고 알려 드리겠습니다(웃음).”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입이 귀에 걸렸다. 특히 아들 세현이를 떠올리고는 “예뻐 죽겠다”며 천진난만한 미소를 지었다.
“아들과 노는 것이 정말 즐겁습니다. 아내는 철없다고 싫어하는데 제 삶의 행복이죠. 지금 일곱 살인데 한창 사고치고 떼를 부립니다. 하지만 전 절대 아들을 혼내지 않습니다. 일곱 살짜리를 혼낼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럴 나이고 아이는 아이의 잣대로 봐야 하니까요. 유치원에 가기 싫다고 하면 가지 말라고 하고 안 보냅니다. 물론 쪼르륵 엄마에게 일러 잔소리를 듣게 하긴 하지만요(웃음).”
국민일보 쿠키뉴스 한지윤 기자 poodel@kukimedia.co.kr / 사진=이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