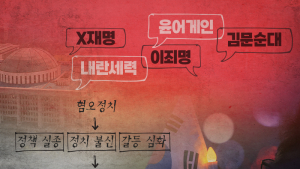최근 논란이 돼 백지화된 문재인 대통령만의 기록관이 대통령의 주도 하에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2일 “문 대통령, 본인 대통령 기록관 모를 수 없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셀프기록관 사업추진에 문재인 대통령의 암묵적 승인 하에 정권 초부터 치밀하게 준비돼왔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라며 지난 8월 대통령이 직접 주재해 관련예산을 심의·의결한 국무회의와 그에 앞서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기록원 원장이 지난 3월 2차례에 걸쳐 청와대 담당 비서관에게 직접 보고한 사실도 공개했다.
그는 “대통령기록관 건립을 위한 172억원의 전체 예산 가운데 부지매입비, 설계비 등 32억1600만원이 들어가 있는 2020년도 예산안은 지난 8월 29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당시 국무회의록에 따르면 이낙연 총리 등 16개 부처 장관 전원과 청와대 및 정부인사 19명도 배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당시 국무회의에서 500조원이 넘는 예산안을 의결했는데 불과 30억원 정도인 예산을 어떻게 일일이 확인했겠냐고 하지만, 국정과제로 추진됐다는 점, 대통령 퇴임 이후를 준비하는 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납득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국가기록원장은 세종시의 기존 통합 대통령기록관의 서고가 부족해 개별기록관을 추진했다고 해명했지만 이것도 사실과 다르다. 확인결과 현재 83.7%를 사용하고 있는 서고는 사무가구를 포함한 집기류 등이 있는 박물, 선물서고다. 비밀문서 서고는 50%, 일반문서 서고는 42%, 시청각자료 서고는 37.3%의 사용률을 보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 외에도 박 의원은 21대 대통령까지 관련 자료를 보존할 수 있도록 수요를 추산했던 ‘대통령기록관 설치운영 방안연구’ 등 다양한 연구와 추진계획 보고서를 제시하며 “(미국 사례를 보더라도) 대통령 기록관을 다수 건립하면 경제성과 효율성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고가 모자르고 미국이 하고 있으니 우리도 필요하다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와대와 정부가 계획적으로 추진했던 것이 진실에 가까울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치밀하게 준비해왔음에도 대통령이 몰랐다고 하는 것은 대통령 보고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며, 이 사업이 처음서부터 어떻게 시작했는지, 누락과정은 없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