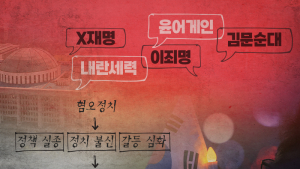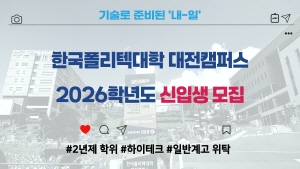사소한 일에도 굳이 큰 의미를 두게 될 때가 있다. 책임과 걱정이 많은 나이가 된 뒤 부쩍 그랬다. 아이들의 중요한 일을 앞둔 아침이면 유난히 까치발로 걸어 다니게 되던 것도 그 때문이었고, 남편 출장길에 남편의 구두코를 현관의 어느 쪽으로 앞에 둘지 망설이는 것도 그 때문이었다. 꽃병이 깨지는 순간, 머릿속에서 기타 줄 하나가 튕겨 끊어지는 것 같았다. 유난히도 산산이 부서진 조각을 보자 지금 내게서 깨져 나간 것은 무엇일지, 이처럼 조각날 것이 있다면 무엇일지, 생각하게 되었다. 꽃을 꽂던 시간보다 더 공을 들여 깨진 조각을 주웠다. 치운다고 치웠지만 이미 알 수 있었다. 언젠가 어디선가 꼭꼭 숨어있던 유리 조각이 비수처럼 발을 찌르고 상처를 입힐지도 모른다는 것을….
아주 오래전, 우리 아파트 거실 망창에 거미가 집을 친 적이 있었다. 처음 보는 아주 커다란 거미였다. 망창을 빗자루로 흔들어 거미를 쫓고 거미줄을 헤쳐 버렸다. 그런데 다음날 또 그 거미가 나타났다. 이번엔 좀 더 사납게 거미를 털어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물도 뿌렸다. 그러나 거미는 다음날도, 그 다음 날도 잊을만하면 어김없이 아침마다 그 자리에서 나를 기다렸다. 눈을 깨어 제일 먼저 마주치는 거미와 며칠간의 사투를 벌였다. 끔찍했다. 문득, 거미줄을 보며 지난날의 내 잘못도 내 삶 곳곳에 이렇게 악연처럼 진을 치고 있다면 어떨까 걱정이 되었다. 아득히 먼 곳, 먼 시간까지 찾아와 털어내고 끊어내도 사슬처럼 내 주위를 엮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니 그것이 더 끔찍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온 아들애가 우스갯소리를 했다. “지구를 들 수 있냐?”고 물었다. 빙글빙글 도는 지구에 민들레 씨처럼 빽빽이 매달려 안간힘 쓰고 있을 우리 들 모습을 그려보며 난 감히 어떻게 지구를 들겠냐고 말했다. 그때 아들이 갑자기 물구나무서기를 하며 외쳤다. “봐요! 지구를 들었어요!” 아들은 정말 지구를 들고 있었다. 지구를 든 아들을 보며 나는 ‘지구 들기’가 ‘마음 바꾸기’고 모든 것은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사실을 명쾌하게 깨달았다. 마음을 바꾸는 것이 내게는 지구를 드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었으나, 아들에게는 물구나무서기만큼 쉬운 일이었다.
오늘은 다시 지구를 들고 환하게 웃던 그 시절의 아들을 떠올린다. 오늘은 내게 위안을 주었던 꽃병이 깨졌다. 나는 이제 더는 위안이 필요 없는 거라고 생각을 바꾸어본다. 내게 위안이 필요했던 모든 일, 우울과 불안과 잘못과 가벼움까지 모두가 어쩌면 유리 조각과 함께 사라졌다고 믿어본다. 어쩌면 내가 거미줄처럼 펼쳤던 소소하나 따뜻했던 나의 옛 마음들도, 내 삶의 곳곳 어딘가에 햇살같이 퍼져 있을지 모른다고 되뇌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