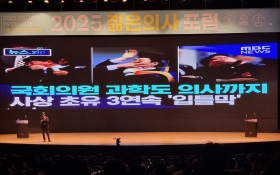최문갑 기자
mgc1@kukinews.com
나의 첫 문상은 오래전, 한 지인의 모친상이었다. 연락 닿은 사람들과 상가에 닿은 시각은 이미 해가 저문 때였다. 언제나 활기찼던 지인이 지친 모습으로 우리를 맞았다. 나도 모르게 ‘안녕하시냐?’고 묻고 말았다. 안녕하지 못한 상가에서 그렇게 묻다니 어처구니없었지만 꼭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늘 고운 옷을 즐겨 입던 지인의 검은 상복이 너무도 생경해서였다.
고인과는 국화 한 송이, 기도 하나로 영원한 이별을 하고 전과 떡을 차린 상을 받고 앉으니 옛 영화가 생각났다. 흩어진 가족들이 다시 모여 장례를 지내며 망자를 둘러싼 애증의 기억들을 그리던 ‘축제’란 제목의 영화였다. 자신과 깊이 관계있던 한 사람의 마지막 길에서 꽃잎처럼 흩어지던 숱한 표정들과 곡소리, 그 사이에 이어지던 언쟁과 웃음… 삶의 끝자락이 잔치처럼 질펀한 상차림 속에서 더욱 처연했던 영화였다.
올 사람은 다 왔다 갔는지 한적한 상가에서 지인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 구순의 어머니를 놓쳐버린 상가의 모습은 순하고 조용했다. 우리로 하여금 결국 죽음을 받아들이게 만드는 건 어쩌면 무겁던 삶이 먼지처럼 가벼워졌으리라는 위안 때문일 것이었다. 그렇지 않다면 누구를 쉽게 놓아주지 못할 테니… 그러며 삼일장, 오일장, 이별의 시간이 긴 것도 새삼 이해했다. 그것은 망자에 대한 추모의 시간만이 아니라 그 빈자리에 유족을 위한 사람을 불러 채우는 시간인 듯하였다. 또 타인의 초상을 지켜보며 자신들의 건재함에 감사하고 자신의 가족을 염려하는 다른 살아있는 자들의 시간처럼도 보였다.
상가에서 나오는 길엔 유난히 달이 밝았다. 어릴 적 마당 깊은 어둠 속에서 유성을 보는 날이면 어머니는 지금 누군가 이승을 떠났나보다고 하셨다. 그 떠난 이는 또다시 하늘의 별이 되리라고 믿기도 했다. 그러고 보면 꽃은 시들고 달도 기우는데 별만 이곳과 저세상을 오가며 멀리 서로의 그리운 얼굴로 남아 바라보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또 하나가 찾아 올라간 밤하늘의 별빛이 서럽도록 반짝이던 밤이었다.
첫 문상 이후, 그동안 정말 많은 문상을 다녔다. 그리고 늘 내 부모생각에 언제나 남의 일 같지 않다고 느꼈는데, 언제부턴 어느 날의 내 모습도 그려보게 된다. 얼마 전 또 친구의 시어머니 문상을 갔다. 코로나 때문에 적막했지만 한편으론 고인이 떠난 자리에서 살아남은 사람들만 먹고 마시고 떠드는 소란 없이 온전한 상가였다. 부고를 듣고 갔으니 어찌 보면 나를 그곳에 부른 사람은 고인이지만, 나는 생전에 고인을 몰랐다. 영정 속에서 고인을 처음 보고 상주와 닮은 곳을 발견하며 고인의 생전이야기를 듣는데 고인이 내게는 죽음과 함께 태어난 것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첫인사이자 끝인사를 나누며 문득 죽음은 삶과 다른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일부라는 생각도 들었다.
문상을 다녀와, 나는 의상제작 일을 하는 딸에게 잘 타는 천연섬유로 언제 입어도 예쁘고 오래 입을 수 있는 옷을 만들어달라고 하였다. 늘 그 옷을 입고 가족과 친구와 함께하다가 좋은 추억이 잔뜩 묻은 그 옷을 수의로 입고 싶었다. 딸은 그러려면 “옷이 예쁘고 안 예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옷을 입었을 때의 기분이 중요하니까 엄마가 평소에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들은, 만일 부모가 죽어서 슬플 때 그나마 자식에게 위안이 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래도 우리 부모는 참 행복하게 살다 가셨지,” 딱 그 하나뿐 일거라고 하였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살아가는 날들이다. 하지만 모든 생명에겐 마지막이 있고 그것이 내일일지라도, 먼 훗날일지라도, 죽음을 잘 준비하겠다는 것은 결국은 행복한 삶을 계획하는 일이다. 나를 위해서도 어느 날의 남은 누구를 위해서도 내게는 행복해야 할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