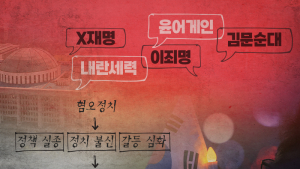촬영장에 갈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다. ‘올해까지만 살자’는 생각으로 임했다. 길거리를 지나는 사람들만 봐도 가슴 한쪽이 시큰했다. 지인을 만나도 이따금씩 울컥했다. 작품을 마치고 나서야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짊어져야 했던 무게가 생각보다 컸다는 걸. JTBC ‘서른, 아홉’에서 시한부 정찬영을 연기한 배우 전미도는, 모든 게 끝나고 나서야 비로소 중압감을 털어냈다.
지난 5일 만난 전미도는 차분하면서도 후련해 보였다. ‘서른, 아홉’을 마친 뒤 해방감을 느끼면서도 긴 여운에서 헤어 나오기 어려웠다. 작품 이야기가 나오거나 방송을 볼 때면 다시금 감정이 차올랐단다. 마지막 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눈물로 함께했다. “대본을 볼 때부터 글자가 안 보일 정도로 오열했다”고 돌아보던 그는 “내가 맡은 역할인데도 꼭 아는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슬펐다”며 먹먹해했다. 죽음과 관련된 공연을 해봤지만, 시한부 캐릭터는 사뭇 다르게 다가왔다. 그럼에도 슬픔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줄곧 노력했다.
“죽는다는 전제가 있었지만 작품 분위기가 무겁지만은 않았잖아요. 찬영이는 시한부라는 현실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친구들과 남은 시간을 함께 보내겠다고 스스로 결정한 사람이에요. 그런 만큼 대본 속 찬영이의 감정만을 마주하려 했죠. 혼자 남았을 때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몰려오는 순간도 있었지만 티 내려 하지 않았어요. 주변인들과 삶의 마지막을 보낸다는 것에만 집중했어요.”

시한부 캐릭터는 도전이었다. 회가 거듭될수록 체중을 감량하며 정찬영의 심정을 헤아렸다. 자신의 부고를 누구에게 알릴지도 생각해봤단다. 친한 사람들과 시간을 함께한다는 게 무엇인지 되돌아보는 시간도 가졌다. 작품을 마칠 때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갖던 그는 ‘서른, 아홉’을 마치고 예외적으로 지인들과 약속을 빼곡하게 잡았다. 정찬영의 그늘이 실제 전미도에게도 영향을 미친 셈이다. 힘든 순간을 안겼지만, 그럼에도 전미도는 정찬영에게 자꾸만 마음이 기울었다.
“전작에서 너무나도 이상적인 인물을 연기해선지 정찬영에게 저도 모르게 눈길이 갔어요. 방황하면서도 갈피를 못 잡고, 사회적으로도 특별히 성공을 이루지 못한 인물이잖아요. 하지만 죽음을 앞두자 두 친구를 통해 자신이 그렇게 잘못 산 것만은 아니라는 걸 깨닫죠. 잘살기만 했던 사람보다 찬영이가 죽음을 맞는 게 더욱더 큰 울림을 남긴다고 느꼈어요. 정찬영의 불완전하고 불안정한 삶이 좋았어요.”
논란도 있었다. 김진석(이무생)과 정찬영의 관계를 다루는 방식이 불륜을 옹호, 미화하는 것으로 비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전미도 역시 대본을 보고 이 같은 반응을 우려했다. 이후 그는 작품 전체를 보며 서서히 김진석과 정찬영 사이를 납득했다. 전미도는 “김진석을 연기한 이무생 덕분에 확신을 가졌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극에서 절친으로 호흡을 맞춘 손예진, 김지현과는 각별한 사이로 남았다.

“(불륜은) 충분히 말 나올 수 있겠다 싶었어요. 하지만 찬영이의 불안한 삶을 보여주기 위한 장치라고 느꼈어요. 김진석과 정찬영 사이엔 둘 만의 언어가 있던 것 같아요. 연기하면서 찬영이의 선택을 납득했어요. 감정을 나누는 두 사람에게 설득됐죠. 이무생이라는 좋은 파트너를 만난 덕이에요. (손)예진 씨와 (김)지현 씨에게도 고마워요. 예진 씨는 정말 훌륭한 배우이자 프로예요. 경험이 많은 만큼 저를 잘 이끌어줬어요. ‘이래서 손예진, 손예진 하는구나’ 싶더라고요. 지현 씨와는 원래부터 친한 터라 호흡도 금세 맞았어요.”
전미도는 ‘서른, 아홉’을 만들어가며 비슷한 아픔을 가진 이들에게 여러 메시지를 받았다. 자신의 시간을 되돌아보고 위로를 얻었다는 반응들은 그에게 힘이 됐다. 죽음, 장례식,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다시금 생각하게 됐다. 공연 무대에서 활약하다 TV 등 매체 연기에 도전한 지 어느덧 3년째. 전미도는 계산할 수 없는 연기가 나오는 순간을 만끽하고 있다. “내가 연기하는 모습을 TV로 볼 수 있는 게 여전히 신기하다”며 수줍게 웃던 그는 “더욱더 많은 인물이 되고 싶다”며 소망을 전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부터 ‘서른, 아홉’까지 쭉 달리기만 했어요. 이제는 잠시 쉬며 여러 작품을 둘러보려 해요. 제 연기도 더 살펴보고 싶어요. ‘서른, 아홉’에서도 제가 예상치 못한 표정들이 나와서 신기했거든요. 뜻하지 않게 나온 즉흥적인 연기를 보는 맛이 있더라고요. 공연과 매체를 오가며 집중력이 좋아진 것 같아요. 더 나아진 모습으로 무대에도 서고 싶어요. 어디서든 연기하고 싶어요. 다양하게, 치열하게.”
김예슬 기자 ye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