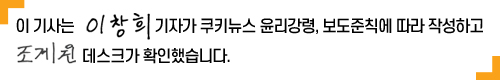“관세는 양자역학적 불확실성에 놓여있다. 주가 반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세 불확실성이 제거돼야 한다. 향후 관세 문제 해결 진척에 따라 주가는 등락을 보일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무분별한 관세 후폭풍이 다소 잠잠해졌지만 반도체 기업 주가 흐름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글로벌 경쟁 대립구도가 심화하는 가운데 상호관세 리스크가 잔존한 영향이다. 이같은 상황 속에 25년 경력의 반도체 전문 애널리스트인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과 만나 향후 전망 및 주가 흐름을 들어봤다.
이 센터장은 24일 쿠키뉴스와 인터뷰에서 올해 1분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전쟁에 따른 글로벌 증시와 반도체 지수 상황에 대해 “리스크는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23일(현지시간) 종가 기준 기술주 중심의 미국 나스닥 지수는 52주 최고점 대비 19% 하락한 상태다. 아울러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고점 대비 35% 떨어졌다.
다만 불확실성은 아직 완화되지 않았다는 게 이 센터장의 설명이다. 국가별 상호관세가 폐지가 아닌 90일간 유예로 발표되면서 세부 내용이 정해지지 않은 채 당장의 위기만 넘겼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 의사도 피력했다. 이 센터장은 “예정대로 상호관세가 하반기 부과되는 그림이라면, 전고점 돌파는 당분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센터장은 지난 14일 반도체 관세 문제에 대한 보고서에서 ‘트럼프의 발언이 관측되기 전까지 양자역학적 중첩 상태가 지속될 것’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센터장은 “관세가 얼마나 적용될지 확정되지 않은 중첩 상태를 빗대어 설명했다”라며 “슈뢰딩거의 고양이처럼 마지막 뚜껑을 열어보기 전까지는 여러 상황들이 확률적으로만 존재한다는 의미”라고 했다.
그러면서 “관세는 여전히 양자역학적 불확실성하에 있다. 따라서 기업들도 향후 가이던스를 제대로 제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면서 “상호관세가 90일 유예됐기 때문에 2분기 충격은 덜할 수 있지만, 하반기 적용될 경우 수요가 쉽지 않아 불확실성이 더욱 클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센터장은 미·중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이 가장 큰 악재라고 평가했다. 갈등이 봉합될 시 주가에 주는 충격은 크지 않다는 진단이다. 그는 “실적보다 중요한 것은 미국과 중국의 관세 협상이다”라며 “미국과 중국이 파국으로만 가지 않는다면, 설령 하반기 실적이 악화된다 하더라도 주가 충격은 크지 않을 것이다. 대부분의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고점 대비 30~50% 하락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삼전·SK하닉 “관세 불확실성 해소 필요, 글로벌 경쟁력도 회복해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서도 관세 불확실성이 해소돼야 주가가 반등할 것이란 분석이다. 이 센터장은 “두 회사 모두 주가 레벨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세 불확실성이 제거될 필요가 있다”며 “주가는 향후 관세 문제 해결 진척에 따라 등락을 보일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SK하이닉스는 기술과 실적이 괜찮아 보이지만, 결국 인공지능(AI) 과잉투자 논란으로 상승이 제한되는 상태다”라며 “삼성전자에 대한 시장 평가는 주가순자산비율(PBR) 0.8~0.9배라면 하락 리스크가 제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글로벌 경쟁력을 견고히 확보하는 게 중장기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설명이다. 이 센터장은 “반도체를 포함해 국내 주력 산업이 급격하게 중국에 따라 잡힐 우려가 커졌다”며 “중국은 전략 산업의 R&D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및 우수 인재들의 치열한 경쟁을 통해 미국 제재를 서서히 극복해 가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반도체를 포함해 R&D 발적 속도가 현저히 둔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국은 전력 달리기로 기술개발에 나서고 있으나, 한국은 천천히 워킹하거나 심지어 백스텝을 밟고 있다는 게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이 센터장은 국내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그는 “기술적인 혁신을 위해서는 52시간 근무 제한 해제를 포함한 반도체 특별법 지원 등이 필요하다”며 “또 최고 경영진의 냉철하고 복합적인 의사결정과 설정도 중요하다. 특히 이공계 엔지니어들의 혁신적 성과에 대한 대우와 보상이 뒷받침돼야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