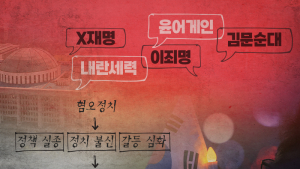장서우 캠프라인 전무이사
“등산 마니아들이 우리 신발을 고집한다는 건 그만큼 우리의 기술을 인정받고 있다는 겁니다.”
창립자인 장정선 대표에 이어 캠프라인의 경영을 맡고 있는 장서우 전무이사의 말에서 한국 산악지형에 최적화된 전문 등산화를 만들고 있다는 자부심이 고스란히 묻어났다. 실제 중등산화와 전문등산화가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캠프라인은 전문 등산화에서 만큼은 산꾼들에게 입소문이 자자하다.
캠프라인의 시작은 장정선 대표가 1974년부터 운영한 ‘빅토리 산악사’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국산등산용품이 별로 없었기에 해외 제품들을 들여와 팔았다. 의류나 신발들이 서양인 체형에 맞춰 나온 것들이라 옷은 팔다리가 길고 신발은 폭이 좁았다. 특히 바닥이 흙으로 이뤄진 외국 산과 달리 화강암 지형의 국내 산에선 외국 브랜드 신발들이 잘 맞지 않았다. 장 대표는 한국 지형에 맞는 등산화를 개발하기 시작했다. 한국 산악지형에 적합한 등산화를 만들겠다는 캠프라인의 정체성은 이때부터 시작됐다.
기존 제품과 신제품을 한쪽씩 신고 산을 오르내리며 직접 성능을 비교했던 장 대표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건 독자기술로 개발한 등산화 밑창(아웃솔)인 ‘릿지엣지’가 탄생하면서부터다. 아무리 유명한 해외 아웃솔이라해도 국내 화강암 지형에선 자꾸 미끄러지며 맥을 못 췄다. 장 대표는 이 점에 착안해 접지력이 우수한 아웃솔을 개발했다.
“부틸창이 지금이야 보편화됐지만 당시에는 획기적인 일이었죠. 돌산이 많다보니 접지력을 높이기 위해 부틸 성분을 첨가했습니다. 그런데 부틸성분이 많으면 밑창이 마모성이 약해 빨리 닳죠. 접지력이 우수하면서도 마모도를 최소화하는, 최적의 비율을 찾는 게 어려웠습니다. 개발 후에는 이미 브랜드화 된 해외 아웃솔에 대적해 소비자들에게 어필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기능에 대해 설명하고 설득해야 했으니까요.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제품을 직접 경험해 본 소비자들에게 인정을 받으면서 점차 전문 등산화로서의 입지를 다질 수 있었습니다.”
2002년 한국지형에 특화된 릿지엣지 아웃솔에 고어텍스 소재를 사용해 ‘블랙스톰’을 출시했다. 그 제품이 7세대 ‘퍼스트스톰’까지 스테디셀러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4세대 ‘애니스톰’은 당일 산행이 대부분이었던 국내 산행 스타일에 착안해 발목 부분을 전문 등산화와 경등산화 중간 높이로 제작해 선풍적인 히트를 쳤다.
“애니스톰은 특히 한국 족형에 잘 맞았고 발목도 잡아주면서 전문 등산화에 비해 착화감이 우수했죠. 당일 산행에 편안하게 신을 수 있었습니다. 접지력이 중요한 아웃솔, 신발이 비틀어지지 않도록 하면서 푹신한 쿠션 기능이 있는 미드솔, 통풍도 잘되면서 아치를 잘 잡아주는 인솔까지 이 모든 게 균형이 맞아야 합니다. 저희는 연간 2만5000건의 A/S를 합니다. 대부분 창갈이죠. 창만 갈아서 오래도록 신는 고객들은 저희 제품의 성능에 대한 증거죠. 또 이를 바탕으로 축척된 데이터로 스톰시리즈는 물론 다른 제품들도 꾸준히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스톰시리즈만 봐도 알 수 있지만 등산화의 본질에 집착하다보니 캠프라인은 고지식하다. 신발은 스타일도 중요하지만 등산화는 등산을 위한 장비이기 때문에 몸에 잘 맞고 편안한 게 중요하다는 것. ‘전문 등산화는 기능이 곧 스타일’이라는 게 캠프라인의 정신이다. 다른 아웃도어 브랜드에서 좀더 스타일리시하고 가벼운 트레킹화와 워킹화를 내놓으며 시장을 넓혀가고 있는 요즘에도 그 열풍에 동참하지 않는다. 유행이 아니라 정말 등산을 좋아하는 고객들이 냉정하게 판단하고 조언해주기 때문에 그 요구에 부응하고자 한 눈 팔지 않고 묵묵히 ‘마이웨이’를 지킨다. 장 전무는 “최근에 시작한 아웃도어 의류는 남들이 의류로 돈벌었다고 해서 뛰어든 게 아니다”며 “아웃도어 멀티숍이 줄어들면서 캠프라인에 대한 고객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유통을 확장하기 위해서 시작했다. 이제 소박하게 캠프라인의 정신을 의류에 접목시키고 있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어떻게 보면 단순무식한 브랜드입니다. 내년 매출 목표 같은 걸 거창하게 세우지도 않습니다. 소비자들께서 캠프라인은 지금도 등산화 열심히 만들고 있고, 이전보다 더 나은 제품을 만드는 게 목표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김 난 기자 na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