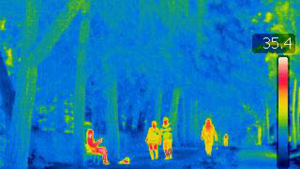문희상 국회의장이 일제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한·일 양국이 참여하는 ‘기억인권재단’을 설립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의장은 26일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양국의 기업과 정부, 국민이 참여하는 ‘2+2+α’식 재단을 통해 총 1500명에게 3000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대일항쟁기 강제 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소개했다.
이는 이달 초 문 의장이 일본 도쿄 와세다대 특강에서 제시했던 양국 기업 주도의 ‘1+1+α’안 보다 구체화된 안으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을 ‘기억인권재단(가칭)’으로 확대하고, 일본군 위안부 등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가족의 위자료지급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재단의 기금은 ▲한·일 양국 관련 기업들의 자발적인 기부금 ▲한·일 양국 민간인들의 자발적 기부금 ▲활동 종료된 ‘화해치유재단’의 잔액(약60억원) 등으로 구성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아래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위자료지급 대상과 규모를 정하도록 하고, 위자료 신청은 법 시행일로부터 1년 6개월 내에만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이밖에 기억인권재단이 추도공간(추도묘역·추도탑·추도공원) 조성 등 위령사업, 강제동원 피해 사료관 및 박물관 건립, 문화·학술 사업 및 조사·연구 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언론 등 일각에서는 재단의 기금조성 방식이 국가가 개인청구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는 한·일 공통 입장에서조차 후퇴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화해치유재단의 잔액을 포함하는 것 또한 2015년 위안부합의를 한국 법률로 합법화하게 만든다는 것.
나아가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 일본에 배상금을 요구할 경우 재단에서 위로금 지급을 강제할 수 없을 것이란 관측도 제시했다. 이에 문 의장 측은 “법안 초안에서 구체적 내용은 각계 의견을 수렴해 변경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