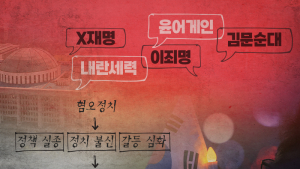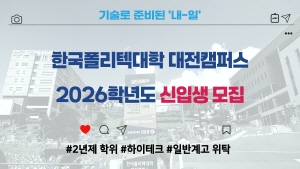'알아차림'은, 자신의 감각 지평을 확장 시키고, 그 경험으로 감성, 아니 감수성을 예민하게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여기에 사유를 더하면, 우리는 통찰력(insight)을 키울 수 있다. 살면서, 문제에 직면하면 그걸 '탁' 하고 알아차리는 것이 통찰력이다. 이런 '알아차림'은 체험과 개념, 아니 경험과 이론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알아차림'이란 말의 정의는 ‘기억과 사유가 일치된 앎'이다. 어려운 말 같지만, 기억은 체험에서 나오고, 사유는 개념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알아차림은 경험이나 체험에 개념이나 이론이 뒷받침되면 더 잘 작동된다. 알아차리는 것도 조건이 맞아야 한다. 다양한 분야를 '공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름 붙이기'를 하거나 생각을 '정리하기'는 자신 안에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에게 '어서 와'하고 환영하고 차를 권하는 일과 같다. 그때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 깨어 있을 수 있다. 그것들과 나의 자각 사이에 여유 공간이 생겨난다. 그때 알아차림이 일어난다.
'확증편향'은 무섭다. 최근 우리 사회를 달구는 것은 서울과 부산 시장 보궐선거와 한국주택토지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건이다. 가급적 정치적인 민감한 내용은 피하려 한다. ’장자‘를 읽으면서, 허심(虛心)을 추구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시비(是非)를 중단하거나 소멸시키려 하지 않고, 화(和)하는 일이다. 단(斷)도 멸(滅)도 아니고, 시비의 긍정도 부정도 아닌 화를 주장한다. '화하라'는 것은 시비를 잠재워버리거나 잘라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 ‘자기 앎'에 기초한 시비의 근거가 서로 허구적인 것임을 깨달아 스스로 풀어지도록(해소되도록) 하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화시비’(和是非')는 시비하지만 시비가 없는 것이고, 시비가 없으면서도 각자의 시비가 모두 인정되는 것, 즉 양행(兩行)이다. 이런 화시비를 위해서는 자아의 판단을 최소화하고, 자연의 조화에 맡겨 분별지를 쉬게 해야 하는데 이것이 자연의 균형에 맡기는 것, 즉 ‘휴천균’(休天鈞)이다.
확증편향은 무서운 것이다. 공부를 하지 않으면, '못된' 수구 보수 언론들이 무지한 대중들에게 생각을 '은근히' 심어주기 때문이다. 특히 TV를 많이 보면 더 그 증세가 심하게 일어난다. 시야가 좁은 사람들이 가지는 세 가지 특징을 공유한다.
(1) ‘지나친 일반화 현상’이 일어난다. 이 말은 하나의 사건이나 사실에 대해 어떤 검증도 거치지 않은 채 그것이 절대적인 것인 양 받아들이는 현상을 말한다. 나 자신도 가끔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곤 한다. 이런 심리를 가진 사람들은 단정적인 말을 자주 사용한다. 예를 들면, ‘결코’, ‘항상’, ‘매번', ‘아무도'라는 등 단정적 언어를 사용하여 다른 가능성의 문을 닫아버린다.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하면 남의 말을 듣지 않고 장광설을 늘어놓거나 다른 사람 말을 끊고 ‘그게 아니고’ 하면서 끼어들어 주책바가지 소리를 듣는다. 이런 사람들이 사용하는 사고방식이 '여과하기(filtering)'이다.
'여과하기'란 현실에서 특정한 사실만을 선택적으로 발췌하여 집중하고 나머지 것은 무시하는 방식이다. 이를 심리학에서 '확증편향'이라고 한다. 이것은 어떤 색유리를 통하여 세상을 보는 것과 같다. 문제는 여과하기가 인생의 경험 중에서 특별히 나쁜 점만을 부각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잘못된 사건에만 초점을 맞출수록 이것이 핵심 사고방식으로 굳어져 불만스럽고 고집스러운 태도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된다.
(2) '양극화된 사고'에 빠진다. 이것은 여러 가지 색깔 중 흑백의 두 가지 색깔만 사용하는 것처럼 자신이 접하는 모든 것을 흑백논리에 입각해 이분법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아군이냐 적군이냐, 우파냐 좌파냐처럼 모든 것을 양분해서 본다.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절대적 사고, 즉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무지막지한 사고방식을 유지한다. 중간은 있을 수 없다.
(3) '지레짐작'을 한다. '독심술(讀心術)'이라고도 하는 이것은 모든 사람이 다 자기처럼 생각한다고 여기는 왜곡된 사고방식을 말한다. 명확한 증거도 없이 무작정 결론으로 건너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