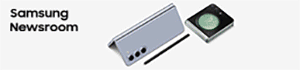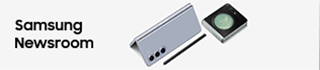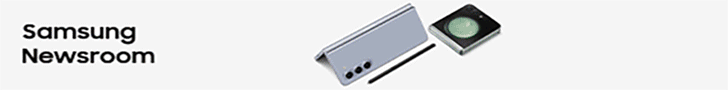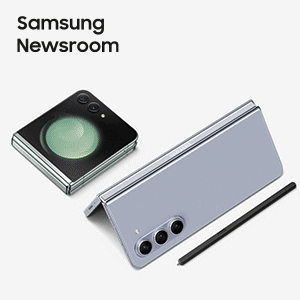[쿠키 문화] ‘엄마’라는 단어는 남녀노소를 비롯해, 애틋한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어릴 적부터 뭔가 위급한 상황이나 억울한 상황이 닥치면 입에서 나오는 말도 ‘엄마’다. 이는 자신을 낳아준 엄마를 지칭하기도 하지만, ‘모정’이라는 보편적 사회 정서가 자신을 보호해줄 것이라는 믿음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러한 ‘엄마’에 대한 감정은 대중을 대상으로 한 상업적 성공으로도 이어졌다. 지난 해 신경숙 작가의 ‘엄마를 부탁해’가 150만부이상 판매고를 올리며 ‘엄마 신드롬’을 불러왔고, 이어 영화 <애자>는 190만 관객을, 강부자 주연의 연극 ‘친정엄마와 2박3일’은 매진을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올 1월 원작 소설 ‘엄마를 부탁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연극 ‘엄마를 부탁해’ 역시, 배우 정혜선의 애절한 연기로 큰 인기를 보았고, 쌀쌀해진 겨울 배우 손숙이 ‘엄마’ 역의 바통을 이어받아 두 번째 막을 올렸다.
“엄마를 잃어버린 지 일주일째다…”라는 대사로 연극은 시작된다. 소설의 내용과 똑같은 시작은 물론 배우들이 읊조리는 대사도 그대로 가져왔다. ‘책과 똑같네’라고 생각하는 순간 배우들의 농후한 연기는 ‘책’과 다른 또 하나의 살아있는 소설이 탄생한다.
이번 무대의 ‘엄마’역을 맡은 손숙은 소설 속 ‘박소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 전라도 사투리는 물론이고 그녀의 갈라지는 목소리, 걸음걸이 하나까지 많이 닮았음을 느낄 수 있다. 그동안 수많은 어머니 상을 보여줬음에도 손숙은 또 한번 새로운 어머니 상을 만들어냈다.
‘엄마’의 딸 ‘지헌’ 역에는 방송인에서 연기자로 거듭나고 있는 허수경과 드라마, 영화, 연극 분야를 가리지 않고 종횡무진 활동하고 있는 김여진이 맡았다.
허수경과 김여진이 연기하는 딸의 모습은 차이가 있다. 허수경은 카랑카랑한 목소리의 차가운 도시적 이미지가 많이 묻어있는 딸이고, 여기에 조금의 따뜻함을 더한 게 김여진의 모습이다. 소설의 모습은 허수경이 더 닮았다면 김여진은 자신의 스타일을 더한 셈이다.
두 사람이 빚어내는 딸은 우리가 갖고 있는 모습을 담고 있어 어색하지 않다. 자연스러운 연기를 바탕으로 강요의 눈물이 아닌 엄마에 대한 미안함과 애틋함에서 비롯되는 눈물을 자극한다. 그녀들이 뱉은 “엄마는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엄마라고 생각했나 봐요” “내가 부르면 대답해주고, 내 얘기 들어주고, 내 편이 돼 주는 사람”이라는 대사는 엄마를 잃어버리지 않고도 우리가 일상에서 엄마에게 느끼는 감정들을 그녀들의 감성 짙은 목소리로 표출돼 심금을 울린다.
두 번째 무대에 오르는 만큼 첫 무대에서 보였던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해 재탄생시켰다. 작가로 성장한 딸과 엄마의 이야기가 주가 되고 흐름의 호흡을 위해 가족들의 이야기를 독백으로 배치시켜 두 시간의 공연에서 지루함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야기 전개가 빨라진 것이다.
소설을 읽은 사람이라면 연극의 결말을 알고 있는 셈이고, 엄마라는 주제가 가져오는 교훈이나 감동은 비슷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집집마다 김치 맛이 다르듯이 이번 연극도 손숙, 허수경, 김여진의 손맛으로 버무린 한 편의 맛있으면서도 깊은 감동을 주는 연극으로 재탄생할 것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은화 기자 choieh@kukimedia.co.kr
Ki-Z는 쿠키뉴스에서 한 주간 연예/문화 이슈를 정리하는 주말 웹진으로 Kuki-Zoom의 약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