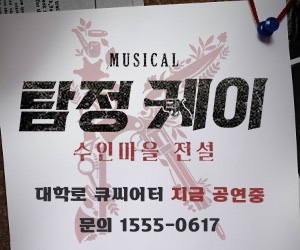“일단 일본 제품은 판매하지 않고 있어요.”
“일단 일본 제품은 판매하지 않고 있어요.”
서울 내 규모가 작은 약국들도 일제 불매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일본의 보복성 수출규제 조치로 촉발된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의약계로 번진 것이다.
최근 발표된 한 조사에 따르면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답한 국민은 약 63%에 달한다. 온라인에는 일본산 제품과 이를 대체할 제품 리스트가 공유되고 있고, ‘일본 여행 필수 기념품’으로 알려져 있던 의약품 및 의약외품의 인기는 크게 줄었다.
이에 맞춰 일본 의약품을 매대에 진열하지 않거나 뒤쪽으로 빼놓는 약국들이 생겨나고 있다. 아예 제품을 팔지 않는 곳도 있다.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 아닌 이상 제품 판매는 곧 ‘매출’과 연관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품을 판매하지 않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는 것은 그만큼 약사들의 불매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얘기는 즉슨 국산 의약품도 충분히 대체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전문가가 단지 ‘불매운동’을 위해 제품을 판매하지 않는 일은 없기 때문이다.
반대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의료계에서는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의사들이 일본 제약사의 전문의약품을 처방하는 이유는 대체 치료제가 없어서, 환자에게 맞아서, 부작용이 적어서이고, 이는 곧 치료 및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약을 바꿀 수 없는 것이다.
의료기기도 마찬가지다. 일본 제품 중에 고성능 기기가 많아 사실상 다른 기기로 대체할 수 없다고 전문가들을 말한다.
꽤 놀랐던 점은, 어쩌지 못하는 상황을 두고도 의견 충돌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병원에서 일본산 의약품을 처방해줬다’며 지적한 사례도 있었다.
히포크라테스 선서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 인종, 종교, 국적, 정당 정파 또는 사회적 지위 여하를 초월하여 오직 환자에 대한 나의 의무를 지키겠노라.”
‘불매운동’에 있어, 그리고 ‘의료’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 불매운동이 누군가의 치료권을 침해하는 운동으로 변질되어선 안 된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