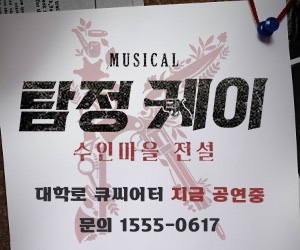해외 석학들이 게임 이용 장애와 관련해 아직 질병으로 확정하기 이르다며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게임문화재단은 1일 국립중앙박물관 소강당에서 '인터넷게임장애(IGD) 국제공동연구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공동으로 후원했으며, 정신의학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국제공동연구 진행 과정과 성과에 대해 강연을 진행했다.
이에 앞서 김경일 게임문화재단 이사장 “게임 장애에 대해 인과 관계와 상관 관계를 혼동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연구가 활발히 이뤄져 많은 논문들이 발표되면 그에 따른 후속 연구 등 학술적인 작업들이 순환 될 것이다. 단순히 게임 과몰입을 질병으로 분류하면서 ‘게임은 질병이므로 나쁘다’라고 단정 짓기보다는 더욱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70년대에 TV가 처음 나왔을 때 아동들의 행동과 매우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부모, 문화적인 요인이 굉장히 큰 것으로 보인다. 숨겨진 요인들을 보도록 더욱 노력해야하며 이러한 연구들을 대중들이 쉽게 접할 수 있게 전달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먼저 페리 랜쇼(미국 유타대학교 의과대학 정신의학과) 교수는 '인터넷 게임장애의 신경영상 및 신경 기저'를 주제로 한 연구 진행 상황을 발표했다.
본 연구는 인터넷 게임과 관련해 한국에서 진행된 뇌과학 연구들을 미국의 자료를 가지고 재검증한 연구로, 74명의 임상군과 대조군을 모집해 MRI 촬영까지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약 50%의 진척율을 보이고 있다.
연구의 목적은 장시간의 게임 이용이 뇌의 구조적, 화학적 변화 및 연결성의 변화와 관련이 있는지 고찰하고 장시간의 게임 이용이 임상적, 신경 심리학적 변화와 관련이 있는지 증명하는 것이다.
한국과 달리 미국에서 IGD 진단 기준에 맞는 대상자를 모집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웠고 모집된 15명도 인터넷 의존 점수가 낮아 진정한 IGD 대상자로 보기 힘들었다.
페리 교수는 연구를 통해 북미에서는 전반적으로 게임 이용 시간이 그다지 많지 않음을 알 수 있었고, 인터넷 활동에 따라 상당히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게임을 한다고 해서 누구나 이상 증세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며 과몰입 자체도 ADHD처럼 성별과 사회화의 결과에 따라 차이가 있다. 과몰입을 부모와의 대립, 수면 패턴의 불규칙성 등과 같은 부정적인 요소가 있음에도 계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규정하기가 매우 어렵고 기준점이 모호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로 드보라 유겔룬 토드(미국 유타대학교 의과대학 정신의학과) 교수는 'ABCD 연구 개요: 예비 조사 결과'를 주제로 미국 전역에서 연령 9~10세 사이의 어린이들 1만1500명을 대상으로 10년 간 진행한 사례 중심의 코호트 연구에 관해 발표했다.
드보라 교수는 이 연구를 통해 어린이들의 IT 미디어 사용은 불안 또는 우울 수준과 상관성이 있으나 인지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여러 요인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나쁘다고 단정 짓기는 힘들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녀는 “게임과 매체 활용에 대해서 악영향을 연구한 사례는 많지만 최근에는 노년층 학습, 우울증 완화, 인지적 능력 향상 등 긍정적인 연구도 나오고 있다”며 이러한 연구가 더욱 활발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세 번째로 블라단 스타서빅(호주 시드니대학교 의과대학 정신의학과) 교수는 ‘문제적 온라인 게임 이용의 개념화’를 주제로 ICD-11의 게임이용장애(GD)와 DSM-5의 IGD 진단 기준의 정확성과 비중을 비교했다.
그 결과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이용장애 진단 기준이 미국정신의학회의 인터넷게임장애 진단 기준보다 더 엄격하지만 공존 질환의 영향을 훨씬 많이 받는 것으로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게임 문제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 중 많은 경우 WHO의 진단 기준인 게임이용장애의 진단 기준과 맞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블라단 교수는 “ICD-11의 일부 요소의 임계치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진단 기준을 사용했을 때 과몰입으로 잘못 진단할 수 있어 개선될 여지가 필요하다”며 “중요한 요소들에 차별성을 줘야하는데 ICD-11과 DSM-5의 진단 기준에 격차가 있다. 통일이 되거나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정(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통합케어센터) 교수는 ‘IGD의 장기 경과에 미치는 ADHD 동반질환의 영향: 3년 추적 관찰 연구’에 대해 발표했다.
연구에 따르면 IGD의 증상 변화는 ADHD의 증상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ADHD 증상의 평가와 치료는 IGD 예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날 참석한 교수들은 공통적으로 '문화적 요소'가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에 공감했다. 페리 교수는 "한국에서 한 연구를 미국에서 같은 IGD 사례로 진행했는데 미국에서 대상자를 찾기가 한국보다 어려웠다. 이는 양국의 문화적 차이"라고 말했다. 드보라 교수 또한 "뇌는 백지 상태로 태어나 경험과 유전 등 여러 요소에 의해 발달한다. 뇌에 미치는 영향과 뇌가 자극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문화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동감했다. 블라단 교수는 "시드니에서 연구를 진행할 때도 학생에 따라 국가 별, 어렸을 때의 경험 등의 차이가 연구에 영향을 줬다. 국제적으로 확대해서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용산ㅣ문창완 기자 lunacy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