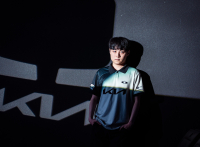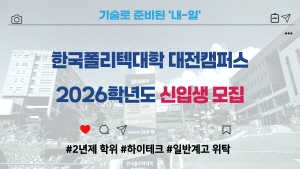최문갑 기자
mgc1@kukinews.com
아버지의 77세 생신과 50주년 결혼기념일을 함께 축하한 그해로부터 시작된 아버지의 병증은 질겼다. 폐암으로부터 전립선암 방광암을 거쳐 파킨슨병까지, 어쩌면 돌아가시던 90세까지 투병과 회복과 또 다른 장애를 견딘 아버지의 세월이 더 끈질겼던 걸지도 모른다. 그 13년 동안 자식들은 평생 우리들의 울타리며 긍지였던 아버지의 발병에 아버지보다 더 낙심해, 때로는 갑자기 효자 효녀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남의 일처럼 잊거나 지겨워 하다 아버지가 병원에서 지내시던 마지막 일 년은 순번을 정해 매일같이 아버지 옆을 지켰다. 그러며 우리는 하나같이 자신들은 오래 살고 싶지 않다는 말을 했다. 부모의 노년을 통해 인생이 고해임은 이미 알게 되었고 그러니 그것은 진심이었지만, 그럴지라도 아버지를 눕혀놓곤 절대로 자식이 먼저 해선 안 될 말이었다. 그 말은 아버지의 완쾌가 아니라 언젠가 올 임종의 순간만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 같다는 연락을 받은 밤. 우리는 한걸음에 병원으로 달려가 돌아온 탕자처럼 울며불며 다시 아버지를 붙잡았다. 깨어만 나시길, 그대로 옆에만 계셔주시길, 빌고 또 빌었지만 아버지가 정말 그러셔도 내가 아버지께 더 좋은 딸이 될 일은 별로 없다는 걸 짐작하면서... 다음날 의사는, 아버지가 고비를 넘겼지만 곧 또 위독해질 거라고 하였다. 고비를 넘겼다는 말과 곧 또 위독해질 거라는 말 중에 어느 말을 더 믿고 싶었던 건지, 내가 잠시 한숨 돌리며 자리를 비운 사이 아버지는 돌아가셨다.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겠다고, 그건 꼭 그러겠다고 별렀는데 늘 나의 마음과 마음은 서로를 속이고 배신했다. 그리고 나는 스스로에 대한 울화를, 아버지를 잃은 슬픔만큼 참을 수 없었다.

파킨슨병으로 자꾸 넘어질 때조차 한 걸음이라도 더 걸어보려 하고 떨리는 손가락으로도 일기를 쓰실 정도로 의지가 강했던 아버지는 누워만 지내던 마지막 병원 생활 중엔 점점 말도 하지 못하셨다. 이불속에 가려져 있던 다른 신체기관도 그렇지만, 음식을 먹을 수도 말을 할 수도 없는 아버지의 입은 참혹할 만큼 우리에게 먼저 이별을 고하고 백태만 쌓여갔다. 그런 어느 날인가, 아버지가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 듯 입을 달싹거리셨다. 나는 통 알아들을 수가 없어 아버지와 스무고개 하듯 그걸 맞춰보다 포기하고 말았다. 아버진 그때 무얼 말하려 하신 걸까, 그 뒤부터 그 순간은 내게 화두처럼 남았다. 바람이 몹시 부는 날은 바람이 분다는 말씀이셨던지 꽃이 지는 날은 꽃이 지냐는 물음이셨던지, 커피를 마시다가도 뜬금없이 생각이 났다. 미식가였고 커피를 좋아했던 아버지도 뭔가 마지막으로 커피나 드시고 싶은 것을 말씀하셨을 지도 모른다고... 어쩌면 아버지는 그런 의문을 주고 가셔서 내게 더 많은 말을 남겨주신 것 같다. 아버지가 내게 하려던 말씀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에 그 한마디만 들었어도 내 마음이 좀 나을 것 같지만, 시간과 함께 기억은 점점 희미해져도 의문은 늘 새롭게 내 안에서 태어나 그렇게 아버진 때때마다 내게 말을 거실 테니...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8년이 되었다. 이번엔 모이지 않고 각자 추모하기로 해 더욱 서글픈 기일이다. 이제 아버지는 어디든 자유롭게 다니시거나 머물 수 있어 우리가 한곳에 없어도 하룻밤에 여러 집을 찾으실 수 있을 테지만, 자식이 모이는 걸 흐뭇하게 바라보던 아버지를 생각하면 너무도 죄송하다. 나는 기일을 앞두고 일찍 친정에 가 아버지 방에 들렀다. 아버지의 안경과 메모와 약병과 사진까지 모든 게 그대로인데 아버지만 자리를 비운 곳, 아버지가 즐겨 바라보시던 창밖으로 구름이 흐르고 있었다. 아버진 이미 내 안에 계시지만 돌연 사무치게 아버지의 안부를 묻고 싶었다. 아버지 이젠 평안하신 거죠? 아버지의 답은 없고 아버지가 앉으시던 의자 밑으로 그림자만 길게 늘어진 날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