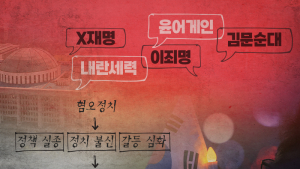“삐빅, 쿵”
체육관에 낯선 소리가 울려 퍼진다. 코트 안에선 바퀴 열 개가 치열하게 뒤얽힌다. 노란 유니폼을 입은 다섯 명의 선수가 두 손으로 분주히 바퀴를 돌리고, 달린다. 훈련에 열중한 선수들의 이마에는 구슬땀이 맺힌다. 이내 공을 뺏기 위한 사투가 벌어진다. 바퀴를 잡은 선수들의 팔뚝엔 힘줄이 울근불근 솟아난다. 휠체어끼리 “쿵”하고 부딪히면 관중석에선 “오”하고 함성소리가 터져 나온다. 두 발이 아닌 두 손으로 날렵하게 코트를 누비는 이들은 전국 최초의 휠체어럭비 실업팀 선수들이다.

지난 30일 오후 찾은 홍성군 장애인 스포츠센터는 겉보기에 여느 체육관과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내부로 들어가자 입구에 휠체어들이 줄지어 배치돼 있다. 방패처럼 생긴 휠체어 바퀴는 찌그러지고 금이 가있다. 짙은 상처를 가진 바퀴들은 견고해 보였다.
지난 11일 창단한 휠체어럭비팀은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손발을 맞추고 있다. 최재웅 감독(36)을 중심으로 한 이 팀은 남성 안태균(43)·전경민(39)·안영준(35)·송문령(28) 선수와 여성 박지은(33) 선수로 구성했다.

“아픔도 줬지만, 행복도 줬어요. 럭비가 없었으면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최 감독은 20여 년 전 영국 유학생 시절 방과후 활동으로 럭비를 접했다. 과격한 운동을 좋아하던 그는 럭비 매력에 금세 빠졌다. 그러던 중 시합에서 목뼈를 다쳐 사지마비 장애인이 됐다. 최 감독은 “장애를 가진 후로 슬럼프가 없었다면 거짓말이죠. 아무래도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계속 받아야 하는 것이 스트레스였어요.”라고 당시를 회상했다.
그를 다치게 한 럭비는 지금 그를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다. 최 감독은 “사람들이 왜 럭비 하다 다쳤는데 계속하냐고 물어요.”라고 털어놨다. 질문을 받을 때마다 그의 대답은 “그럼에도”였다. 장애는 최 감독의 럭비 사랑을 막지 못했다. 그는 “크게 연연하지 않아요. 내가 좋아서 한 운동이고, 재수가 없었다고 생각해요.”라고 말했다.

휠체어럭비의 매력은 선수들을 매료했다. 7년 전 다이빙 사고로 휠체어를 타게 된 송 선수는 럭비 경기를 본 순간 첫눈에 반했다고 한다. 그는 “2018년 5월 럭비 경기를 보고, 2019년 퇴원하자마자 럭비팀에 들어갔어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짜 멋졌어요. 저는 뭐든지 첫인상이 중요해서.”라고 호탕하게 웃었다. 28세인 송 선수는 팀의 막내지만, 벌써 5년째 휠체어럭비와 함께하고 있다.
박 선수는 2012년부터 휠체어럭비를 즐겼다. 팀 내 유일한 여성 선수다. 박 선수는 “처음 동아리에서 재미 삼아 시작했는데 점점 승부욕이 생기더라고요.”라고 럭비와의 첫 만남을 떠올렸다. 이어 “힘들어서 하기 싫을 때도 있는데 뒤돌아서면 또 생각나요.”라며 깊은 애정을 보였다.
어린 시절 그는 피아노를 쳤다. 말초 쪽에 힘이 빠지는 근육장애를 얻은 뒤로는 팔, 다리가 불편해졌다. 피아노를 치던 손은 휠체어를 잡게 됐다. 여성 선수로서의 고충을 묻자 박 선수는 “힘에서도 밀리고 스피드에서도 밀리긴 하죠.”라면서도 “턴을 빠르게 한다거나 저만의 장점을 기술로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라고 의지를 보였다.

안 선수는 박 선수와 같은 동아리에서 럭비를 시작했다. 그는 럭비의 매력을 “부딪혀도 반칙이 아닌 것”이라고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연신 천진난만한 미소를 짓던 그에게 넘어지면 아프지 않냐고 물었다. 안 선수는 “아프긴 하죠. 하지만 제가 거의 상대 선수를 넘어뜨리는 포지션이에요.”라고 익살스럽게 되받아쳤다. 선수들의 손에는 굳은 살이 박여 있다.
제주에서 충남까지 비행기를 타고 날아온 선수도 있다. 전 선수는 장애인 스포츠 20년 경력 베테랑 선수다. 장애인 수영과 농구 국가대표 생활을 했던 그는 이제 휠체어럭비 국가대표를 노리고 있다. 전 선수는 왜 럭비를 선택했냐는 물음에 “장애인이라서 럭비를 택한 게 아니라 스포츠인으로서 럭비에 매력을 느꼈어요.”라고 했다. 농구와 다른 점으로는 “부딪히는 것”이라고 답했다. 휠체어럭비는 휠체어끼리 유일하게 접촉할 수 있는 경기다.

최 감독을 비롯한 대부분의 선수들은 휠체어럭비 국가대표 출신이다. 이들에게 럭비는 단순한 운동이 아닌 삶의 즐거움이다. 선수들의 최종 목표는 전국장애인 체육대회 금메달이다. 이들은 일주일에 5번 모여 훈련을 한다. 서로 격려하며 ‘으쌰 으쌰’ 중이라는 선수들은 “우리가 첫 휠체어럭비 실업팀이기 때문에 좋은 본보기를 보여야 해요.”라고 입을 모았다. 박 선수는 “이제 하나하나 맞춰가는 중이에요. 앞으로 좋은 성적과 모습 보여줘야죠.”라고 포부를 밝혔다.
장애인 체육을 시작하는 후배들을 향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선수들은 “다치는 걸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못하니 아픈 걸 두려워하지 말아요. 집에 있지 말고 밖으로 나와요.”라면서 활짝 웃었다. 중요한 건 도전이라는 것이다.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님들을 향해서는 “우리보다 장애 정도가 더 심한 사람들도 스포츠를 해요. 이들을 응원해 줬으면 해요.”라고 했다.

이예솔 기자 ysolzz6@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