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수술로봇 업계가 글로벌 시장 진입을 위해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 이미 해외 대형 기업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 점유율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탑재하는 차별화된 전략을 펼치며 승부를 걸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수술 부위의 물리적 영향을 줄이는 최소 침습 치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수술용 로봇 시장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인 마켓앤드마켓의 보고서를 보면 수술로봇 산업 규모는 2024년 111억 달러(한화 약 15조5788억원)에서 연평균 16.5%씩 성장해 오는 2029년 237억 달러(약 33조2629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기업들은 주요 시장인 북미, 유럽은 물론 중국, 일본, 중동 등으로 진출을 전개하고 있다. 고영테크놀러지는 지난달 뇌 수술용 의료 로봇 ‘카이메로’의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획득했다. 고영테크놀러지 관계자는 “이번 허가로 미국에서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며 “일본에서 진행 중인 인허가에도 역량을 집중해 해외 진출 성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컴퍼니의 복강경 수술로봇인 ‘레보아이’는 지난해 러시아, 몽골, 파라과이 시장에 진입했다. 미래컴퍼니 관계자는 “올해도 시장 개척을 이어간다”라며 “동남아시아 등에서 허가를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큐렉소도 인공관절 수술용 로봇 ‘큐비스 조인트’의 수출 판로를 넓히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인도에 현지 법인을 세워 해외 영업을 위한 거점을 확보했다. 현재 미국, 유럽, 러시아,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등 총 7개국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해외 판매량은 점차 늘고 있다. 큐렉소의 경우 의료 로봇 판매량이 2020년 18대, 2021년 30대, 2022년 62대, 2023년 88대로 증가세를 그리고 있다. 큐렉소 관계자는 “2022년 들어 해외 판매량이 국내 판매를 넘어섰다”고 전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해외 판매가 4대에 그쳤던 미래컴퍼니는 2023년에 4대의 수출 실적을 보였다.
다만 후발주자인 국내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뚜렷한 점유율을 확보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글로벌 수술로봇 시장의 80% 이상은 미국의 인튜이티브 서지컬이 차지하고 있으며 존슨앤존슨, 스트라이커 등 유명 로봇수술 기업들도 진을 치고 있다. 특히 수술용 로봇은 특성상 가격이 매우 비싸고, 의사의 교육과 경험에 대한 투자가 뒷받침돼야 하는 만큼 후발업체가 안착하기 어려운 시장 구조를 갖고 있다.
이에 국내 기업들은 높은 기술력과 합리적 가격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갈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 A씨는 “의료진은 의료 장비에 대한 보수적 경향이 있어 새로운 제품의 진입이 쉽지 않은 게 사실이지만 우수한 서비스와 기능, 합리적 비용을 접목해 입지를 넓혀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존에 상급종합병원으로 집중됐던 수요가 종합병원과 전문병원으로 확장되면서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다”고 짚었다.
최신 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제품으로 차별성을 내세운 기업들도 있다. 로엔서지컬은 세계 최초로 신장결석 수술로봇에 AI를 탑재했다. 로엔서지컬 측은 “수술 난도와 의료진의 피로도를 낮출 수 있어 인도네시아, 태국, 동남아 등 다양한 국가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다”고 했다. 더블유에스아이의 자회사인 이지메디봇은 수술 보조자가 필요 없는 로봇 자궁 거상기를 개발해 주목을 받았다. 이지메디봇은 현재 국내에서 품목 허가 절차를 밟고 있으며, 다양한 해외 박람회에서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AI를 이용한 의료 로봇 연구도 추진 중이다. 업계 관계자 B씨는 “수술용 로봇 시장의 미래 먹거리는 AI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AI 의료 로봇 산업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시장을 선점할 기회가 열려 있다”고 피력했다.
업계에선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과 함께 정부의 수출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진다. 업계 관계자 C씨는 “지난해 2월부터 지속되고 있는 의료공백으로 인해 대형병원의 수술 건수가 급감했고, 업계도 타격을 입었다”라며 “향후 의료 로봇 산업이 성장하려면 해외 진출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주요 해외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실질적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면서 “국제 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현지 병원·의료기관과 협력을 강화하려면 정부의 공공·외교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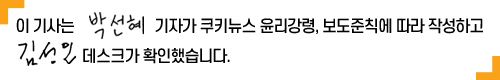






![“의사마다 다른 수술 역량, 로봇수술로 보편화” [쿠키인터뷰]](/data/kuk/image/2025/01/31/kuk2025013100031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