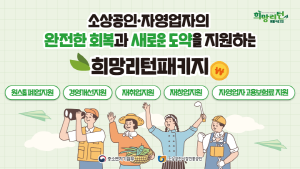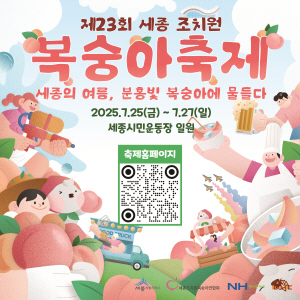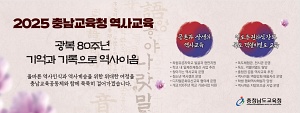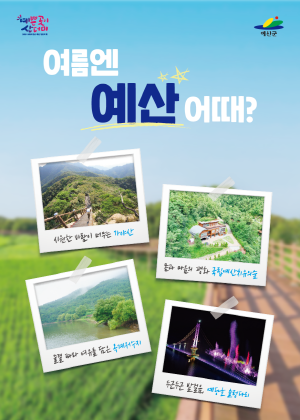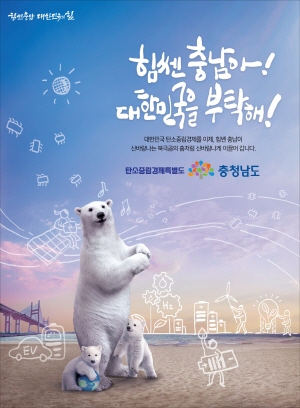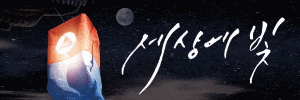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처는 몸을 다쳐 부상을 입은 자리나 피해를 입은 흔적을 말한다. 사람이 상처를 입게 되면 스스로 치유하려는 반응이 일게 된다. 예를 들어 찰과상이 생겼을 때는 혈액이 응고되어 지혈 과정을 거치면서 피부에 딱지 생기고 떨어지는 치유의 과정을 거친다. 그때 다른 세균에 상처가 감염되거나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소독을 하거나 깨끗하게 관리해 주는 것은 회복을 위해 중요한 일이다.
정서적인 부분도 그렇다. 상처를 입었을 때는 자기 인식을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며 아픔의 원인을 이해해야 한다. 또한 회복을 위해서 상처 부위를 관리하는 것처럼 정서적 상처 역시 타인과의 소통과 공감, 위로와 격려를 통해 치유 과정을 함께 해야 한다. 왜냐하면 상처는 그것이 육체적이든 정서적이든 우리 삶의 일부이자 일상처럼 대부분 관계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올해 상처 입은 사회에 장시간 머무르고 있다. 기상청은 이번 겨울이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했다고 하고, 서울은 영하 10.2도까지 내려갔다고 한다. 끝날 듯 끝나지 않는 한파에 우리 모두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다. 그러나 폭설이 내린 차가운 아스팔트 키세스 군단은 동장군처럼 버티고 있고, 많은 시민과 단체가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나누면서 겨울을 함께 나고 있다. 모두의 상처를 이해하고 서로에게 필요한 희망의 길을 묵묵히 걷는 중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찾기 위해 책장에 묻혀 있던 오래된 책을 다시 읽게 되었다. 상처 입은 이에게 치유의 길을 함께 걷기를 바라며 세몬의 이야기를 나눈다.
가난한 구두 수선공 세몬은 추운 겨울날 마을 사람들에게 빌려준 돈 5루블을 받아 가죽을 사고자 했다. 가죽은 구두 수선공에게 꼭 필요한 구두 만드는 재료였기 때문이다. 즉 가죽은 세몬 가족이 생존하는 원천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같이 돈이 없다고 하였고 헛수고 끝에 집으로 돌아오게 된다. 집에 가는 길, 벌거벗은 미하일을 만나게 된다. 세몬은 차마 외면하지 못하고 그에게 자신의 털장화를 신기고 겉옷을 입혔으며 심지어 집으로 데려오게 된다. 세몬의 아내 마트뇨나는 빈털터리로 집에 온 남편을 원망하지만 누추한 미하일을 동정하여 남은 빵을 내어 준다. 이들은 함께 구두 수선공 일을 하게 되었고, 세몬 가족에게 도움을 주게 된다. 이때 거구의 신사가 찾아와 1년 동안 신어도 탈이 나지 않는 구두를 만들라고 한다. 미하일이 구두가 아닌 슬리퍼를 만들자 세몬이 걱정하지만 신사는 돌아가는 마차에서 죽게 되었고, 장례를 위해 슬리퍼가 필요해진다. 두 아이를 데리고 온 여자는 아이들의 구두를 맞춘다. 아이들은 쌍둥이지만 자신의 아이가 아니며, 본인의 아이는 생후 2개월에 죽었다고 한다. 여자는 아이들이 자신을 살린 촛불과 같은 존재라며 귀히 여긴다.
이 이야기는 톨스토이가 1881년 발표한 단편소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이다.
세몬을 만나게 된 천사 미하일이 인간 세상에 내려와 살아가며 깨달음을 얻게 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첫 번째 인간 안에 무엇이 있고, 두 번째 인간에게 무엇이 허락되지 않았으며, 세 번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깨달음이다. 인간에게는 사랑이 있고,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은 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는 것이며, 그렇기에 혼자가 아닌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는 상처 안에 있다.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은 상처를 입고 입히고 치유하고 치유해 준다.
사회가 어떤 상처를 입었든 우리의 치유 노력은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 미래에 무엇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는 사랑이 있고 실천할 수 있으며 각기 흩어진 혼자가 아닌 함께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다.
한강의 장편소설 <작별하지 않는다>에서 주인공 경하가 인선의 어머니를 만나 상처를 마주하듯 우리는 오늘의 상처를 내일로 미루지 않아야겠다. 상처의 통증은 고통을 동반하겠지만 서로를 치유하는 소독제가 될 수 있다. 치유의 과정에서 오늘과 작별하지 않으면 폭설과 어둠에 갇히더라도 심장은 다시 뛰고 함께 걷는 길은 밝을 것이다.
이번 칼럼이 상처 입은 이에게 위로가 되길 바라며,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힘이 세다는 것을, 그 힘은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임을, 그리고 세상을 치유하는 희망이 될 것임을.
이연정 충무교육원 교육연구사는 공주사대 국어교육과를 졸업하고 2002년 교직에 입문했다. 이후 아산교육청, 충남교육청 장학사를 거쳤다. 충남교사문학회 활동을 시작으로 현재 (사)한국작가회의충남지회 사무처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세상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사회 온도를 1% 올리기 위해 교육 현장에서 치열하게 공감과 소통에 나서고 있다.






![[이연정의 1도 올린 세상]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그랬다고요"](/data/kuk/image/2024/12/26/kuk20241226000123.jpg)
![[이연정의 1도 올린 세상] “민주야, 너 여기 있구나”](/data/kuk/image/2024/12/18/kuk20241218000366.jpg)
![[이연정의 1도 올린 세상] 한강은 당연한 기적](/data/kuk/image/2024/10/14/kuk2024101400004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