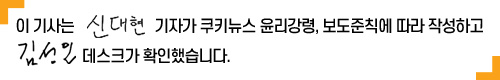이런 곳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가 갓 태어난 연약한 아기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싶다고 표현하고, ‘폭탄 덩어리’ 취급하며 농담거리처럼 희화화한 행위에선 일말의 직업윤리를 찾아볼 수가 없었다. 피해 환아의 부모는 아직도 가해 간호사로부터 사과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간호사는 지난 4일 병원에서 ‘파면’ 조치됐다.
이는 의료계에 속한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기 어렵다. 의사·의대생만 이용할 수 있는 익명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는 단순한 감정 표출을 넘어서 윤리와 책임의식을 무너뜨리는 문화가 자리 잡았다. 지난해 9월 의정 갈등이 극에 달했던 때엔 “(환자들이) 응급실 돌다 죽어도 아무 감흥 없다”, “더 죽어서 뉴스에 나와 줬으면 하는 마음뿐이다”, “매일 1000명씩 죽어나갔으면 좋겠다” 등의 막말이 쏟아졌다. 환자를 ‘개돼지’, ‘조센징’으로 칭하며 국민과 생명을 경시했다.
“죽음에 대한 공포로 온몸이 마비되고, 의사에게 진료받지 못해 생을 마감할 뻔한 경험이 여럿 쌓여야 생명을 다루는 의사에 대한 감사함과 존경심을 갖게 된다”는 발언은 집단 이기주의를 넘어 광기로 비쳐졌다.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다른 의견을 내는 동료나 교수에겐 ‘감귤’, ‘씹수’ 등 비하 표현을 서슴지 않았다. 참다못한 서울의대 교수 4명이 지난 3월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촉구하며 작심발언을 했지만, 돌아온 건 조롱과 인신공격이었다.
물론 모든 의료인을 한데 묶어 문제가 있다고 일반화할 수 없다.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최전선에서 묵묵히 헌신한 수많은 간호사, 깊은 책임감으로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함께 나눈 의사의 모습을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의료인의 도를 넘은 일탈과 왜곡된 자의식이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갉아먹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의사와 간호사가 갖는 ‘면허’는 국가가 부여한 공적 자격이다. 이들은 면허 취득을 통해 생명을 다룰 권한을 가진다. 모든 학사 과정을 수료하고 시험에 합격한 의대생과 간호대생에겐 사회에 나서기 전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해야 한다’는 당부와 함께 의료인 자격이 주어진다. 면허는 단순한 ‘자격증’이 아니다. 면허가 발급되는 순간 무거운 윤리적·사회적 책임도 함께 짊어져야 한다.
면허가 면책의 도구가 돼선 안 된다. 잘못을 저질러도 처벌이 미약하고, 내부 비판은 집단적 반발로 덮을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질수록 자정 작용은 더 어려워진다. 전문성과 윤리성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가치다. 그 균형이 무너질 때 의료의 본질도 위태로워진다. 의료계는 동료들의 부적절한 행위를 더 이상 ‘개인의 일탈’로 치부해선 안 된다. 무분별한 온정주의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되돌아올 뿐이다.
지금 필요한 건 자성(自省)이다. 국민은 의료인의 실력 만큼 높은 품격을 원한다. 생명을 다룬다는 것의 무게를 실감하지 못한다면 그 손에 쥐어진 면허는 환자를 헤치는 칼이 될 수 있다. 의료계는 윤리 교육을 강화하고, 익명성 뒤에 숨은 폭력을 경계해야 한다. 그리고 면허의 가치는 환자와 생명을 대하는 경외심에서 비롯된다는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 생명을 다루는 손에 가볍지 않은 마음을 얹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