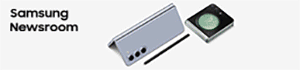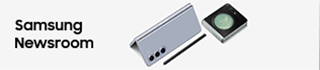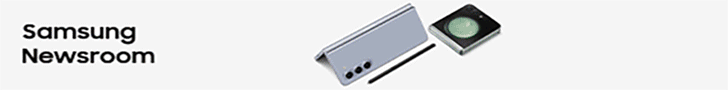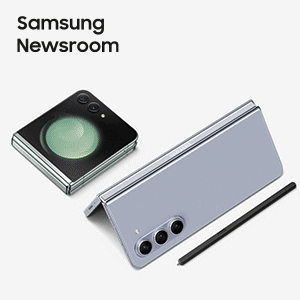[쿠키 문화] 2007년 1만5000달러를 투입해 무려 1만3000배가 넘는 2억 달러를 벌어들인 영화 <파라노말 액티비티>는 일상의 공포를 그려낸 수작이다. 2명의 주인공이 사는 주택으로 인물과 공간을 한정한 뒤 셀프 카메라 형식으로 찍어 다큐멘터리를 보는 듯 생생한 공포감을 일으켰다. 이 영화는 3편까지 제작됐다.
사람들이 이 영화에 몰입할 수 있었고, 흥행한 주요 이유로 꼽힌 것이 영화가 보여주는 일상의 공포 때문이다. 우리가 사는 일상의 주택이고,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가정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당시에 ‘파라노날 액티비티 후유증’을 겪는다는 사람들이 많았던 이유도 이 때문이다. 영화를 다 보고 돌아간 자신의 집도 그 공포를 느끼게 한 공간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이같이 영상을 통해 전해진 상황이 내가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는 공포든 기쁨이든 극대화된다.
이러한 일상적인 상황을 무대 위에서 느낀다면 어떨까. 연극 <이웃집 쌀통>은 소소한 제목과 달리 관객들에게 일상적 공포를 제공하고, 그 공포와 같이 찾아오는 물질적 유혹에 대한 선택의 기로에서 보여줄 수 있는 인간의 ‘속물 근성’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여준다.
내용은 이렇다. 허름한 달동네에 서로 나이 차는 나지만 ‘아줌마’라는 공통점 때문에 친구처럼 어울려 지내는 4명의 아줌마가 있다. 풍족하지 않은 살림에 애들을 키우고 바람 피우는 남편 때문에 속상한 이들은 이웃사촌이란 말처럼 때로는 의지하고 또 어느 때는 꼬마들처럼 아옹다옹 싸우기를 마다치 않는다. 그런데 어느날 ‘쌀통’ 하나가 등장하더니, 그 안에서 어린아이 손가락과 발로 추정되는 내용들이 나온다. 동시에 1천만원이라는 거금이 나오면서 아줌마들은 갈등한다.
‘이웃집 쌀통’은 지난 2010년 한국희곡작가협회 주관의 신춘문예 당선작이었던 연극 ‘그녀들만 아는 공소시효’의 제목을 바꿔 선을 보이는 작품이다. 원작의 제목에서 알다시피, 이들은 손가락과 발이 발견하는 사건에서부터 돈을 나눠 갖는 과정을 거쳐, 일에 가담하지 않는 사람까지도 끌어들여 ‘공범 의식’도 같이 나눠 갖는 일련의 모습을 보여준다.
여기서 관객들은 동화된다. 1차로 공간적 동화다. 골목길은 과거 친근한 공간에서 지금은 두려운 공간으로 종종 등장한다. 영화나 드라마, 무대에서 골목길은 피해야할 대상으로 다가온다. 공간적 동화는 그 뒤에서 들려오는 별거 아닌 소리에도 관객을 민감하게 만든다.
2차로 관객들은 극중 인물들에 동화된다. 이들이 비현실적인 인물이라든가, 과장된 인물이 아닌 흔히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머니, 아줌마들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이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 얘기하고, 싸우고, 서로 편을 이루고, 다시 화해하는 일련의 모습들은 우리가 동네에서 흔히 봐왔던 내용이다. 그러기에 이들의 말, 행동은 ‘있을 법한’ 일로 인식된다.
이런 동화된 상황을 바탕으로 벌어지는 공포와 속물 근성은 그래서 관객들도 같이 고민하게 만든다. 길거리에서 우연히 습득한 거액의 돈을 양심적으로 경찰서에 갖다주는 모습이 ‘사회의 의인’으로 뉴스화 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윤리적으로 당연한 일이지만, 내면적으로 갈등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일을 무대에서 직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물론 우리가 흔히 영화나 납량특집물에서 느낀 소름 끼치는 장면이나 공포스러움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대신 내적으로 갈등하는 공포가 존재한다.
연출을 맡은 선욱현은 ‘이웃집 쌀통’을 무대에 올리면서 1막을 추가해 아줌마들의 캐릭터를 설명하려 했지만, 도리어 연계성이 떨어져 붕 떠보인다. 지속적으로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아줌마 연기에 몰입하는 김곽경희, 우승림, 우진식, 김소영 네 명의 배우들의 앙상블은 10년차 배우들의 호흡답게 절묘하게 어우러진다. 다소 과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감정을 관객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하면, 도리어 친근하게 느껴진다. 오는 15일까지 서울 동숭동 대학로문화공간 이다 2관에서 공연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유명준 기자 neocross2kukimedia.co.kr
Ki-Z는 쿠키뉴스에서 한 주간 연예/문화 이슈를 정리하는 주말 웹진으로 Kuki-Zoom의 약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