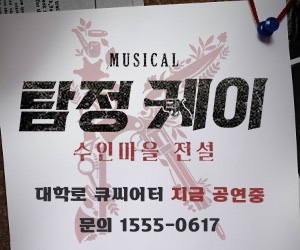이씨는 삼성 자회사인 ㈜케어캠프 상무이던 2009년 11월 케어캠프가 삼성서울병원에 수술용품 등을 납품하고 받은 약속어음 66억원 중 17억원을 회사 직원을 통해 전달받았다. 그는 곧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만들어 어음을 넣어뒀다가 그 다음해 1월 어음이 만기돼 현금으로 입금되자 이를 13개월 만에 소진했다. 회계 전문가가 거액을 횡령하면서 직원으로부터 어음을 건네받고 또 자신 명의 계좌로 관리하는 등 들통 날만한 흔적을 많이 남겼다는 얘기다.
이씨는 이 중 3억8000만원은 대출금 상환에 썼고, 6억1000만원은 전세금으로 지급했다. 1억원은 자신의 부친에게 송금했으며, 2억4000여만원은 주식 투자, 9100만원은 카드 결제 등에 사용했다. 조부 묘지 이장비에도 3000만원 가량을 썼다. 검찰 관계자는 8일 “17억원의 용처 파악은 다 끝났다”고 말했다. 문제는 2010년 6월(2000만원)과 7월(1억원) 채군 계좌로 송금된 1억2000만원이다. 이씨는 “2000만원은 그냥 준 것이고, 1억원은 사정이 딱해 빌려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그러나 동창의 내연녀에게 개인 여유자금도 아닌 불법적으로 빼낸 회삿돈을 건넸다는 것은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다. 삼성 측이 2011년 횡령 사실을 파악하고도 최근에서야 수사 의뢰한 배경도 여전히 의문이다. 이씨가 지난해 7월 채군에게 추가로 보낸 8000만원은 삼성 자금과 연결되지 않는다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객관적 정황과 이씨 등의 주장이 안 맞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