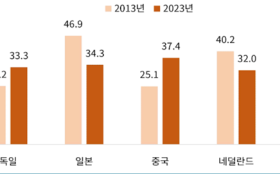영화 ‘워터 디바이너’가 자신을 선택한 것 같다는 러셀 크로우(51). “스토리를 책임지고 어떻게 표현할까 생각하면서 자연스럽게 연출을 맡게 됐다”는 그는 “수십 년 연기 생활을 하면서 근본적으로 감독을 하고 싶은 욕구가 있었다”고 고백했다. 물론 그 바탕에는 ‘닭살이 돋을 만큼 감동을 받아야 한다’는 나름의 작품 선정 기준이 있었다. 까다로운 기준을 뚫고 선택한 작품이 바로 ‘워터 디바이너’이다.
그는 19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리츠칼튼호텔에서 열린 ‘워터디바이너’ 기자회견에서 “어떠한 작품을 선정할 때 스토리를 가장 중요시 한다. 작품을 봤을 때 내가 감동을 받았는지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크로우는 그동안 리들리 스콧, 마이클 만, 피터 위어, 론하워드 등 수많은 거장들과 작업했다. 가장 호흡이 잘 맞았던 감독으로 스콧을 꼽았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 둘을 보면 만날 싸운다고 한다. 그런데 서로 토론하는 것일 뿐”이라며 “스콧이 좋은 의견이나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 때 꼭 얘기하라고 했다. 제작 후에 말하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스콧 감독과 5개 작품을 한 분명한 이유가 있다”며 “서로 존중하고 매우 잘 맞는다. 수많은 감독들과 일하면서 ‘무엇을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지’ 등을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경험은 ‘워터 디바이너’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더불어 음악에 관심이 많아 밴드 활동 등을 즐기는 크로우는 “음악이 관객에게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며 이번 작품에서도 많은 신경을 썼다고 털어놨다.
워터 디바이너는 제1차 세계대전 갈리폴리 전투로 세 아들을 잃은 코너(러셀 크로우)가 아내마저 목숨을 끊자 호주에서 1만4000㎞ 떨어진 터키로 아들의 시신을 찾아 나서는 이야기다. 영화에는 호주, 뉴질랜드, 터키 등의 문화가 섞여있다. 영화를 통해 말하고자 한건 무엇일까.
“아버지와 아들의 유대감을 표현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세계적인 공감대가 있을지 걱정했죠. 호주는 영국 식민지였어요. 영국 때문에 제1차 세계대전에 참여한 거죠. 한국도 비슷한 이유로 제2차 세계대전에 많은 피해를 입었잖아요. 한국은 가족 가치를 중요시하는데 영화를 보면 전쟁으로 인한 상실감 등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크로우는 작품을 시작하면 습관적으로 하는 게 지인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일이란다. ‘워터 디바이너’ 연출을 맡기 전에도 수많은 감독을 만났는데 다들 ‘잘 할 거야’라고 할 뿐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됐다고 했다. 그에게 도움이 되는 조언을 해준 감독은 벤 스틸러가 유일했다.
“스틸러가 너는 감독이지만 주연이기 때문에 ‘너의 연기에 신경을 써라’고 조언했다”며 “실제 도움이 많이 됐다”고 귀띔했다. 실제로 자신보다 다른 배우들의 연기 디렉팅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내 연기는 빨리 찍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다”며 “스틸러가 아버지의 심정으로 연기하라고 했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 각자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도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상반기 영화계 가장 뜨거운 키워드로 떠오른 부성애. 러셀 크로우가 그린 아버지와 아들 이야기는 어떻게 다를지 관심이 모아진다. 그는 특히 “한국 관객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하다”며 “워터 디바이너는 진정성이 있는 영화다. 관객들에게 진심이 잘 전달되길 바란다”고 했다.
최지윤 기자 jyc8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