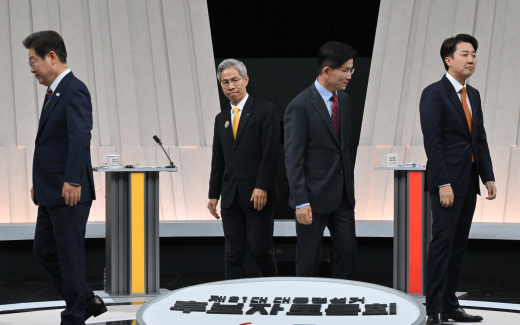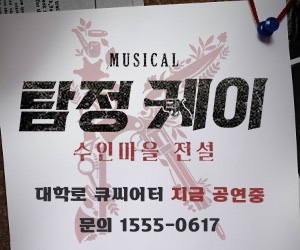김종술. 그의 이름은 하나지만, 그는 여러 다른 이름으로 불린다. ‘금강요정’, ‘시민기자’, ‘사대강 탐사기자’ 등. 하나같이 강과 환경에 대한 그의 집념을 담은 것들뿐이다. ‘돈 안 되는’ 취재와 보도 행위를 높이 사는 것과 반대로 그의 일상은 고난의 연속이다. 일용직 잡부로 공사장을 전전하거나 밤 농장에서는 인부로, 대리운전기사 등으로 번 돈은 오롯이 그는 취재비용에 쓰인다.
오랜 세월 사대강의 비리와 처참한 오염 문제를 기사로 고발해온 김종술 기자는 최근 그의 글을 모아 ‘위대한 강의 삶과 죽음(한겨레출판사)’을 펴냈다. 책을 쓴 이유에 대해 김종술 기자는 “좀 더 (취재를)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라고 말했다.

◇ 사대강은 울부짖는다
- 왜 사대강은 여전히 이 지경일까.
“문재인 대통령은 사대강의 수질개선 방법을 찾으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환경부는 수문을 개방했다. 나는 현장에서 환경부와 수공 직원들을 오래 만나왔다. 사견이지만 환경부 내에 사대강에 참여한 이들의 세력이 강한 것 같다. 환경부의 한 과장은 사대강 찬동인사로 분류되어 있을 정도다.”
- 지난 1년여 동안 사대강에 유의미한 변화는 없었나.
“가령, 백제보는 수문이 전혀 안 열리고 있다. 처음에는 열었다가 지하수 문제가 발생해 다시 닫혔다. 그 이후에는 여전히 닫혀있다. 정부는 (사대강 문제 해결에) 전혀 의지가 없는 것 같다. 주민들이 ‘제발 열라, 우리 핑계를 대지 말라’고 해도 정부는 농민들이 (수문 개방을) 반대한다고 말한다. 난 초기만 해도 환경부 장관을 지지했지만, 최근 들어 많이 비판하고 있다. 일을 너무 못한다. 사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사대강 인사들이 조직 내부 승진을 했다고 하더라. 이런 점이 사대강 해결의 걸림돌이 아닌가 싶다.”
- 자전거 도로가 자주 침수된다고 들었다.
“금강 도로 옆에 자전거 도로가 있었다. 농민들이 농사짓던 곳에는 공원도 조성됐고 자전거 도로도 만들어졌다. 공주쪽 서너 곳의 자전거도로는 비만 오면 침수됐다. 이번에는 비가 다소 많이 내렸지만, 경험상 40~50mm만 내려도 침수되곤 하더라. 침수된 자전거도로는 특히 밤에 위험하다. 밤에는 물인지 도로인지 구분이 어렵다. 그래서 사고가 종종 있다. 결국 올해 봄에도 보강 공사를 했지만, 비가오니 다시 무너졌다.”
- 왜 자전거 도로조차 정리가 안 될까.
“문제제기를 여러 번 했다. 한 곳 정도는 우회도로를 만들더라. 나머지는 우회도로 조성이 어렵다고 해서 비가 오면 출입통제 펜스와 알림표지판을 세우는 게 전부였다. 이마저도 부족했다. 그래서 현재는 아예 펜스와 표지판을 세워서 묶어 놨다.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비가 올 때마다 이렇다. 오늘 오전에 물이 빠졌는데 아마 또 사고가 나지 않을까 싶다.”
- 사대강은 정상으로 돌아올 수 없을까.
“문재인 정부 초기 수문 개방을 한다고 했다. 반가웠지만 한편으로 아쉬웠다. 이명박 정권은 사대강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밀어붙였다. 중앙 권력이 힘으로 해버린거다. 현 정부의 수문 개방은 주민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대통령 지시였을 뿐이다. 오는 12월 보 존치문제를 결정한다고 한다. 중앙정부가 일방적인 지시를 내리면 백제보의 경우처럼 지역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민주적으로 지역 공청회와 주민설명회를 통해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
- 수문 개방 소식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여겼다.
“전면개방은 3곳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부분개방일 뿐이다. 보가 7미터인데, 고작 20~30센티미터 열어놓은 것이다. 이정도론 티도 안 난다. 이건 속임수다.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더 투명하게 소통해야 한다. 잘못되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있다고 밝히고, 여러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차에 기름이 남아있으면 강으로 간다”
- 생계는 여전히 어려운가.
“(취재비 등으로) 한 달에 300만 원 이상 사용한다. 전부 강에 쓴다. 난 일 년에 340일을 강에 나와 있다. 최근에는 강의를 좀 나간다. 강의료는 한 달에 50~60만 원 정도다. 공사장에서 일도 하고, 밤농장에서 밤도 줍는다. 대리운전도 한다. 그렇지만, 차에 기름이 남아 있으면 (일하러) 가지 않는다.”
- 건강은 어떤가, 두통이 심하다고 들었다.
“물고기 떼죽음 목격 후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요즘도 종종 치료는 받는다. 다른 건 괜찮은데 두통이 힘들다. 이끼벌레 때문인지 그때부터 두통이 심해 거의 날마다 두통약을 달고 산다.”
- 몇 해 전 스토리펀딩으로 모인 후원금도 전부 빚을 갚는데 썼다고 들었다.
“7000만 원가량의 후원금이 모였는데, 솔직히 10원도 만져보지 못했다. 그래도 그 후원금 덕분에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서 빚을 갚을 수 있었다. 현재 하고 있는 스토리펀딩은 함께 하는 분들에게 나눠줄 것이다. 나눠야 한다.”
- 최근 책을 썼다.
“책을 쓰면 여러 이유를 댈 것이다. 난 단 한 가지 이유다. (취재를) 좀 더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책을 썼다.”

언론계와 환경계에서 김종술 기자를 모르는 사람은 없다. 여러 언론이 그를 비중 있게 다뤘지만, 기자는 다음처럼 그를 있는 그대로 표현한 구절은 없다고 생각한다.
‘그는 저널리즘을 모른다. 책 펴들고 배운 적 없다. 고집이 세서 잘 배우려고도 않는다. 강물에 젖은 옷, 눈물로 빤 손수건, 강변 흙 묻은 신발, 무릎에 날마다 붙이는 파스, 그리고 그가 쓴 900여 개 기사. 그것들만이 그를 증거한다. 그는 리얼리즘이다.’ (<한겨레21> ‘흘러야, 흘러야 '강'이다 강은 흘러 흘러야 한다’ 중에서)
김종술. 그는 오늘도 눅눅한 악취를 내뿜는 강으로 향한다. 아마 내일도 그는 해 뜰 무렵 강변에 서 있을 것이다. 악취와 녹조가 없던, 아름다운 강물을 스친 가을바람이 불어오던 시절을 추억하며 그는 그렇게 홀로 강을 지킬 것이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