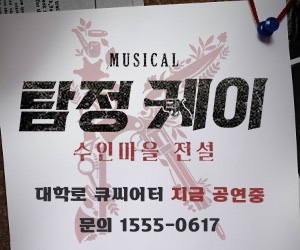‘맴~맴~맴’ ‘매에에에에~~’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여름더위가 시작되자 한동안 잠잠했던 매미울음 소리가 또다시 힘차게 들린다. 특히 덩치도 크고 목청 좋은 말매미의 울림이 크다. 암컷매미에게 전하는 사랑의 세레나데다. 아니 며칠 남지 않은 자신의 생 동안에 번식을 하려는 수컷들의 진한 울부짖음이기도하다. 암컷은 발성 기관이 없어 소리를 내지 못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 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갑자기 성경(시편 27:7)의 한 구절이 떠올랐다.
매미 애벌레들은 종에 따라 대략 땅속에서 3~6년 살다가 세상으로 나와 탈피를 하고 겨우 열흘에서 길게는 한 달 만에 자신의 생을 마감한다. 본능적으로 알을 낳고 돌봐야하는 암컷 매미는 조금 더 생명을 유지한다. 그래봤자 며칠 더 사는게 고작이다.

장맛비가 잠시 멈췄던 지난 20일 저녁 뚝섬로에 위치한 서울숲을 찾았다. 땅거미가 지자 한낮 매미전문사냥꾼 직박구리 등 천적을 피해 나무뿌리에서 땅표면까지 올라와있던 매미 애벌레들이 여기저기서 날카롭고 단단한 앞발로 수년간의 어둠을 헤치고 땅위로 올라오기 시작한다. 길게는 10년 넘게 땅속에서 유충으로 사는 종도 있단다. 매미는 번데기 단계 없이 알, 애벌레 2단계만을 거쳐 성충이 된다. 우리나라에서 번식하는 매미의 종은 녹색 바탕에 검정 무늬를 가진 참매미를 비롯해 말매미·애매미·털매미·소요산매미 등 13종으로 알려져 있지만 현재 확인이 가능한 종은 10종이 넘지 않는다고 동아시아환경생물연구소 김성수(63) 소장은 말한다.

이날 우화(羽化‧곤충이 유충 또는 약충이나 번데기에서 탈피하여 성충이 되는 일)를 위해 땅 밖으로 나온 매미는 대부분 말매미였다. 이들은 자신이 탈피를 해서 날개를 성공적으로 피고 잘 말릴수 있는 나무나 관목을 찾아 힘차게 이동을 시작했다. 이들의 장도에 개미들과 억센 풀들이 훼방을 놓지만 거침없이 단단하고 날카로운 앞발로 헤쳐나가며 등정을 시작한다.
 얼마나 올랐을까 매미들은 탈피에 적당한 장소를 찾으면 다시한번 강한 앞발톱과 뒷발톱들로 단단히 고정한 후 몸을 좌우로 흔들어 우화하기에 안전한 장소인지를 확인한다. 20~30분 휴식을 취한 후 드디어 탈피를 시작한다. 기자가 컴컴한 나무 앞에서 삼각대에 카메라를 받쳐놓고 무언가를 찍고 있자 산책하던 시민들이 기자 옆으로 다가와 질문한다. “어두운 밤에 무얼 찍으세요. 나무에 뭐가 있나요?” “지금 막 매미가 허물을 벗으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하자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다며 호기심어린 표정으로 함께 지켜본다.
얼마나 올랐을까 매미들은 탈피에 적당한 장소를 찾으면 다시한번 강한 앞발톱과 뒷발톱들로 단단히 고정한 후 몸을 좌우로 흔들어 우화하기에 안전한 장소인지를 확인한다. 20~30분 휴식을 취한 후 드디어 탈피를 시작한다. 기자가 컴컴한 나무 앞에서 삼각대에 카메라를 받쳐놓고 무언가를 찍고 있자 산책하던 시민들이 기자 옆으로 다가와 질문한다. “어두운 밤에 무얼 찍으세요. 나무에 뭐가 있나요?” “지금 막 매미가 허물을 벗으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하자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다며 호기심어린 표정으로 함께 지켜본다.
김성수 소장은 “자연 속 생태환경은 수학공식과는 틀리다. 특히 매미들이 땅속과 땅위에서 얼마나 사는지 우리나라에 몇 종이 분포하는지도 정확히 조사된 데이터가 아직 없다.”면서 “울음소리가 가장 요란한 말매미는 원래 남방계열이어서 제주도를 비롯해 남쪽지역에 주로 분포했으나 온난화로 인해 남한 전역으로 확산되어 있다.”고 말했다.
 20여분이 흘렀을까. 나무 표피에 달라붙어 정중동 하던 매미의 등이 굽은 새우처럼 점점 부풀어 오르더니 천천히 탈피 각이 머리 쪽부터 세로로 갈라지기 시작했다. 매미의 눈이 먼저 보였다. 매미의 눈은 두 개의 커다란 겹눈과 머리 한가운데 홑눈 세 개를 포함 총 5개의 눈을 가지고 있다. 꼬리부분만 빼고 머리와 몸이 서서히 껍질에서 빠져나온다. 한동안 껍질에서 빠져나온 몸을 일으켰다 눕혔다 하는 동작을 여러 차례 되풀이했다.
20여분이 흘렀을까. 나무 표피에 달라붙어 정중동 하던 매미의 등이 굽은 새우처럼 점점 부풀어 오르더니 천천히 탈피 각이 머리 쪽부터 세로로 갈라지기 시작했다. 매미의 눈이 먼저 보였다. 매미의 눈은 두 개의 커다란 겹눈과 머리 한가운데 홑눈 세 개를 포함 총 5개의 눈을 가지고 있다. 꼬리부분만 빼고 머리와 몸이 서서히 껍질에서 빠져나온다. 한동안 껍질에서 빠져나온 몸을 일으켰다 눕혔다 하는 동작을 여러 차례 되풀이했다.


허물을 벗는 단계마다 힘에 부친 듯 중간 중간 동작을 멈추고 숨고르는 시간을 가졌다. 그 후 한참이나 껍질과 거의 일직선으로 누워 접혀 있던 날개가 3분의 1쯤 펼쳐지자 이내 몸을 세워 앞다리로 나무와 붙어있는 껍질 머리를 잡고 마지막 남은 꼬리부분을 껍질 밖으로 빼냈다.


수년간의 유충 생활에 마침표를 찍는 경건한 순간이다. 이후 나머지 날개도 서서히 펼친다. 대략 땅에서 올라와 2~3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우화과정이다.


나무에서는 우화 도중 개미들의 공격으로 안타깝게 그들의 먹잇감이 되거나 날개돋이를 하는 도중 외부 자극이나 선천적인 이유로 고만 중도 탈락하는 유충들도 눈에 띄었다. 이같이 모든 시련과 고통의 과정을 통과한 매미들만이 날개를 말리고 몸을 단단히 굳히면서 떠오르는 아침 해를 맞이했다.





글‧사진=곽경근 대기자 kkkwak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