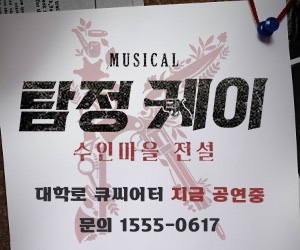어릴 때까지만 하더라도 쉽게 들을 수 있는 말이 ‘죽을 힘이 있으면, 그 힘으로 살아라’였다. 물론 지금도 쉽게 접할 수 있는 말이기도 하다.
어릴 때까지만 하더라도 쉽게 들을 수 있는 말이 ‘죽을 힘이 있으면, 그 힘으로 살아라’였다. 물론 지금도 쉽게 접할 수 있는 말이기도 하다.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 본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 가족, 친구 등 모두에게 영향을 줄 수 있으니 그런 생각 자체를 해선 안 된다고 배웠는데,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 한정해 치료 효과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치료는 중단할 수 있게 됐다.
‘연명의료결정법’이 지난해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환자 개인이 스스로 ‘존엄한 죽음’을 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1년이 조금 넘는 기간동안 5만3000명이 넘는 사람이 연명의료 중단·유보를 결정했다.
다만, 환자 본인이 의식을 갖고 스스로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한 비율은 31.5%였다. 환자의 의지가 아닌 가족의 의지로 연명의료가 중단된 경우가 67% 이상이었다. 환자가 연명의료의 중단을 진정으로 바라던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든다.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취약계층의 연명의료 결정과 웰다잉 정책방향’이라는 토론회에서 한 청중이 던진 질문이 기억에 남았다. 그는 “올해 초 남편을 잃었다”라며 “연명의료결정법으로 인해 남편이 연명의료를 중단했다. 남편이 정말 죽고 싶었는지 묻고 싶다. 스스로 죽으려는 사람은 없다. 이 법은 ‘존엄한 죽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을 위한 법’인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대 고령사회연구단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연명의료를 중단하고자 하는 이유로 ‘가족의 피해 끼치고 싶지 않아서’, ‘막대한 경제적 부담 때문에’ 순으로 꼽았다. 아직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으로 내걸었던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지 못했다. 연명의료의 중단 이유는 ‘치료 효과가 없어서’나 ‘정서적으로 편안한 가운데 삶을 마무리할 수 있어서’ 등의 이유여야 한다. 이것이 ‘존엄한 죽음’이고 ‘웰다잉(Well-dying)’이다.
특히나, 사회적·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은 삶에 대한 의지가 아무리 있다고 한들 그 의지 표명을 할 수 없다. 개인보다 집단, 사회를 중시하는 동아시아권 문화 탓도 있겠지만, ‘존엄한 죽음’을 바라며 만들어진 ‘연명의료결정법’이 죽은 사람의 만족보다 살아있는 사람들의 행복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같아 아쉬운 마음이 든다.
모든 제도가 처음부터 완벽할 수 없듯이 시행해가며 평가·보완을 거쳐야 한다. 이 제도가 ‘존엄한 죽음’, 환자 개인이 삶의 마무리를 선택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