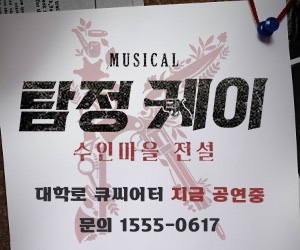지난해 말 환자 진료 중 불의의 사고로 숨진 강북삼성병원의 고 임세원 교수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의사자 지정을 거절,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말 환자 진료 중 불의의 사고로 숨진 강북삼성병원의 고 임세원 교수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의사자 지정을 거절, 논란이 일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장에서도 이 문제가 나왔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복지부가 너무 행정 편의적으로 사안을 다룬 게 아니냐고 질책하자,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위원회에서 해당 사안을 다시 심의할 예정이라며 난감해했다.
그러나 바로 앞서 기자가 확인한 복지부 실무자의 반응은 좀 다르다. 복지부 측은 고인에 대한 의사자 지정 심사 당시 경찰 조사나 CCTV 동영상을 검토했지만 “적극적·직접적 구조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강경하게 밝혔다. 국민적 감정을 고려하더라도 제도의 틀을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인 것이다.
이러한 설명에 대해 일견 동감한다. 법과 제도로 규정된 사항의 엄정한 집행에 예외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점, 십분 이해한다. 다만, 유족의 감정을 지키고자 복지부가 언론보도에 대한 설명자료(해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거듭 언론에 다시금 흘리는 것은 불편하다. 현재 유가족들은 의사자 지정 취소 결정을 제고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묻는다. 애당초 유족의 마음을 다치게 한 것은 언론인가, 복지부인가.
복지부는 사안의 중차대함을 고려해 결정에 만전을 다했다고 주장한다. 지난 4월 한번 결정을 보류했다거나 고인에 대해 정부가 훈장을 수여한 것을 들어 정부 차원의 예우는 할 만큼 했다고 말한다. 정리하면 고인에게 정부는 할 만큼 했다는 이야기다.
반문한다. 유족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이유가 비단 의사자 지정에 따른 각종 ‘혜택’을 포기할 수 없어서인가, 고인의 명예를 회복코자 인가. 복지부는 행정소송에 대해 절차대로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환자 진료 중 환자의 칼에 목숨을 잃은 의사. 아버지이자 남편을 잃은 유족과 정부가 법정 다툼을 해야 하는 기막힌 상황이 곧 벌어지게 된다.
“한명 다 (의사자 지정을) 해주면 문제가 생긴다”는 복지부 관계자의 말은 법과 제도 집행의 관점에서 볼 때 충분히 이해되지만, 상처 입은 유족과 이를 지켜보는 의료진, 그리고 고인의 사망에 안타까워했던 국민들의 마음에 또 다른 생채기를 남겼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생채기를 남긴들 엄정한 제도 시행을 고수하기로 했다면 모를까, 국감장에서 국회의원의 질책에 다시 심의를 하겠다는 장관의 말은 또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일단 재심의로 ‘소나기’는 피해보자는 속셈이 아닐지.
죽은 자는 말이 없다. 남은 자의 슬픔을 누가 달래줄 것인가. 유족과 정부가 재판을 벌여야 하는 이 얄궂은 상황을 초래한 것은 일부 언론의 무분별한 보도 때문인가, 정부가 일사천리로 내린 차가운 결정 때문인가. 다음의 복지부 관계자의 말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고인은) 훌륭한 분이지만 그렇다고 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는 없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