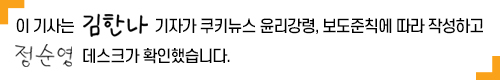‘유통 빅3’ 중 신세계와 현대가 정기 임원 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마지막 타자인 롯데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르면 11월 말, 늦어도 다음달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되면서 인사 개편 향방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롯데그룹은 막바지 계열사 임원 평가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실적 부진으로 비상경영 체재에 돌입한 만큼 안정보다 쇄신에 무게가 실리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앞서 신세계그룹과 현대백화점그룹이 일부 계열사에 ‘신상필벌’에 원칙을 둔 인사 기조를 이어가면서, 롯데도 이를 반영한 대규모 인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롯데의 경우 내년 3월 임기만료를 앞둔 계열사 대표들의 전격적인 교체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이동우 롯데지주 대표를 비롯해 강성현 롯데쇼핑 대표, 박윤기 롯데칠성 대표, 김주남 롯데면세점 대표, 이영구 롯데웰푸드 대표, 남창희 롯데하이마트 대표 등이 대상자다.
특히 롯데가 3세인 신유열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 전무의 승진도 관심사다. 재계는 지난 6월 신 전무가 일본 롯데홀딩스의 사내이사로 선임된 것을 기점으로 롯데그룹의 승계 후계자로 공식화했다고 보고 있다. 롯데의 지배구조는 광윤사→롯데홀딩스→호텔롯데→롯데지주로 이어져 있다. 신 전무가 그룹 최상단에 위치한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진으로 합류한 것은 그룹 주요 의사 결정에 참여한다는 의미다. 결국 본격적인 3세 경영의 시작을 알렸다고 봐도 무방한 셈이다.
그는 국내에서 첫 등기 임원에 올라 한국 롯데 경영 전면에 나서면서 그룹의 중장기 비전과 미래 먹거리 발굴이란 중책을 맡게 됐다.
현 상황에서 롯데의 혁신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실상 비상경영체제에 나서고 있는 롯데는 계열사 전반의 실적이 악화되며 인적 쇄신이나 체질 개선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문제의 핵심으로 꼽히는 기업 지배구조 등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중론이다.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경제개혁연구소 부소장)는 롯데 내 지배구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제대로 된 혁신은 어렵다고 내다봤다. 이 교수는 “재벌 그룹의 인사 권한이 개별 계열사에 있지 않은 게 문제다. 인사권을 다 총수가 행사하는 구조”라며 “결국 기업가치 극대화가 목적이 아닌 인사권자 니즈에 맞춘 고질적인 문제가 크다. 임기나 지배구조 체계를 바꾸지 않는 상황에서 경영인의 물갈이 자체는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도 “재벌 오너들은 실적으로 혁신을 보여줘야 하는데 롯데의 경우 그동안 가시적인 성과가 없었다”면서 “옛날부터 이어져 온 가업 승계 구도가 아닌 과감히 쇄신하는 방향의 인사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롯데는 지난 8월부터 비상경영 체제에 들어가며 위기를 맞고 있다. 롯데 유통 부문의 경우도 전반적인 실적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 롯데쇼핑의 올해 상반기 매출은 6조941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 줄었고 순이익은 적자 전환했다. 이커머스 부문인 롯데온의 올해 상반기 매출은 57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1% 감소했다. 영업손실은 11억원으로 나타났다. 롯데면세점은 유커 감소의 영향으로 올해 상반기 매출은 1조6480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10% 늘었지만 463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지배구조 개선 노력 없이 이뤄지는 경영권 승계는 결국 국가 경제 구조를 허무는 문제를 초래한다. 대기업의 지배구조 문제를 제쳐놓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 중 하나가 후진적 지배구조인데, 재벌 대기업에서 이같은 문제가 고스란히 반복되는게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이사회 존재 이유가 전문성이 없는 경영인의 영향력 행사를 견제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지만 결국 기업 총수 앞에서는 무력화되는 셈”이라며 “후진적인 지배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