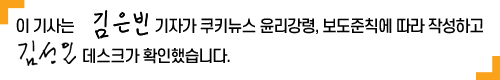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급물살을 탔지만, 여야가 소득대체율 수준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진통을 겪고 있다. 국정협의체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모두 열리는 이번주가 연금개혁 논의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17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은 오는 20일 ‘4자회담’ 형식의 첫 국정협의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 조정 등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같은 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제2법안소위원회를 열고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지난 14일 전체회의에서 여당을 향해 모수개혁이 담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20일 제2법안소위에서 심사해줄 것을 요청하고, 소위에서 심사가 안 될 경우 21일 전체회의에 상정해 심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금개혁 논의가 급물살을 탄 건 여야가 모수개혁을 먼저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뤘기 때문이다. 연금 제도의 틀 자체를 뜯어고치는 구조개혁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에서 모수개혁 이후 논의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여야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에 대해서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방안에 뜻을 같이 했다. 26년만의 성과다. 보험료율은 1998년 9%로 정해진 뒤 27년 동안 제자리걸음이었다.
관건은 소득대체율이다. 가장 어려운 보험료율 인상까지 합의한 상태에서 소득대체율로 인해 연금개혁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소득대체율에 대한 정부안(42%), 여당안(43%), 야당안(45%)이 모두 상이한 상태라, 협상이 결렬되고 있다.
심지어 소득대체율을 둘러싼 논의가 진전되지 않자, 여당에서는 우선 합의된 보험료율 인상부터 처리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보험료율 13% 인상을 먼저 처리하고, 소득대체율과 구조개혁은 연금특위에서 논의하자”고 밝혔다.

소득대체율 42~45% 이견…재정안정이냐 소득보장이냐
소득대체율은 연금 가입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말한다. 현재 국민연금은 월 소득의 9%를 내고, 노후에 40%(2028년)를 받도록 설계돼 있다. 현 소득대체율 40%로 단순 계산한다면, 월 평균 소득이 100만원인 가입자가 40년을 가입할 경우 노후엔 월 40만원을 받게 된다.
소득대체율을 높이면 가입자들이 향후 받게 되는 수령액이 많아져 극심한 노인빈곤율을 다소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현행 제도 아래 2056년이면 기금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전망돼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다. 지속가능성과 노후소득보장성 사이 절충안을 찾는 것이 과제다.
소득대체율을 둘러싼 정부, 여당, 야당의 해법은 상이하다. 보험료율 13% 인상 시 △정부는 소득대체율을 42%로 유지하자는 입장이다. 보험료율 13% 아래 소득대체율을 42%로 조정한다면, 기금 소진 시점을 2072년까지 16년 늦출 수 있다. △국민의힘 주장대로 소득대체율을 43%로 상향 조정하면 기금 소진 시점이 2064년까지 8년 늦어지는 효과가 있다. △민주당안대로 소득대체율을 44~45%까지 상향 조정한다면, 기금 고갈 시점은 2063년으로 7년 늦출 수 있다.
전문가들 역시 소득대체율 수준을 두고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재정안정론 측에서는 소득대체율을 급격히 높이면 향후 연금 곳간이 바닥나 미래세대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며 소득대체율 인상을 반대하고 있다. 연금연구회는 지난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득대체율 44%안은 올해 경제성장률 2% 달성도 어려운 상황에서 연금을 10%나 더 올려주겠다는 것”이라며 “소득대체율은 40%를 유지하면서 보험료율을 13%로 조속히 인상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반면 노후소득보장강화론 측에서는 낮은 소득대체율을 유지할 경우 노인빈곤율을 해소하기 어렵다며 소득대체율을 인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재 한국의 국민연금 실질소득대체율은 31.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50.7%보다 낮아 노후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연금 평균 수령액(2024년 9월 기준 월 65만4471원)이 노후 최저 생활비(136만원)는 넘어야 빈곤율을 낮출 수 있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보건복지부는 연금개혁과 관련해 ‘국회의 시간’이라며 말을 아끼고 있다. 다만 노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연금 기금 소진 시점도 빨라지는 만큼 조속히 국회 논의가 진행되길 기대하는 모습이다. 정부는 모수개혁을 우선 처리한 뒤 연금특위를 구성해 재정당국과 함께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포함한 구조개혁을 논의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